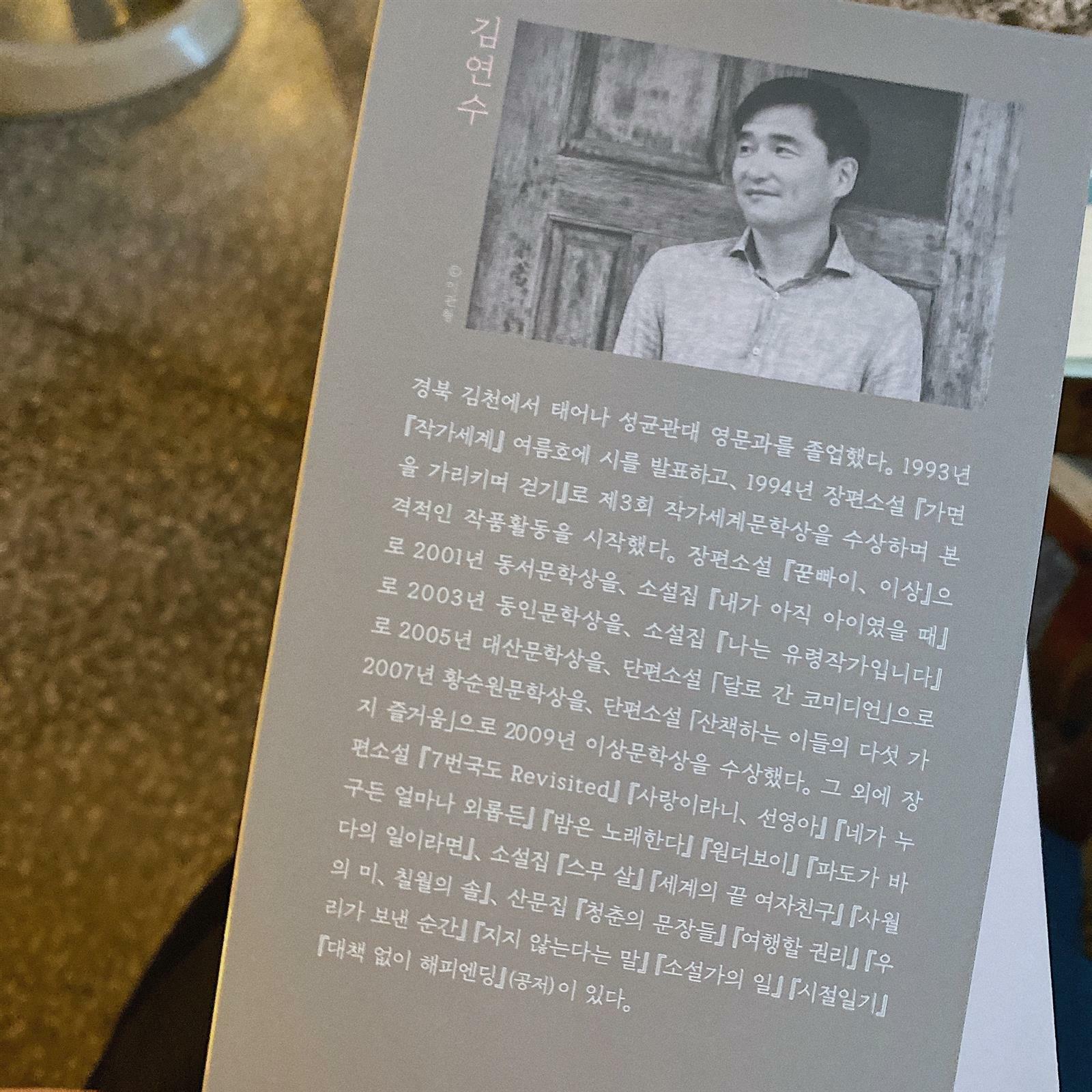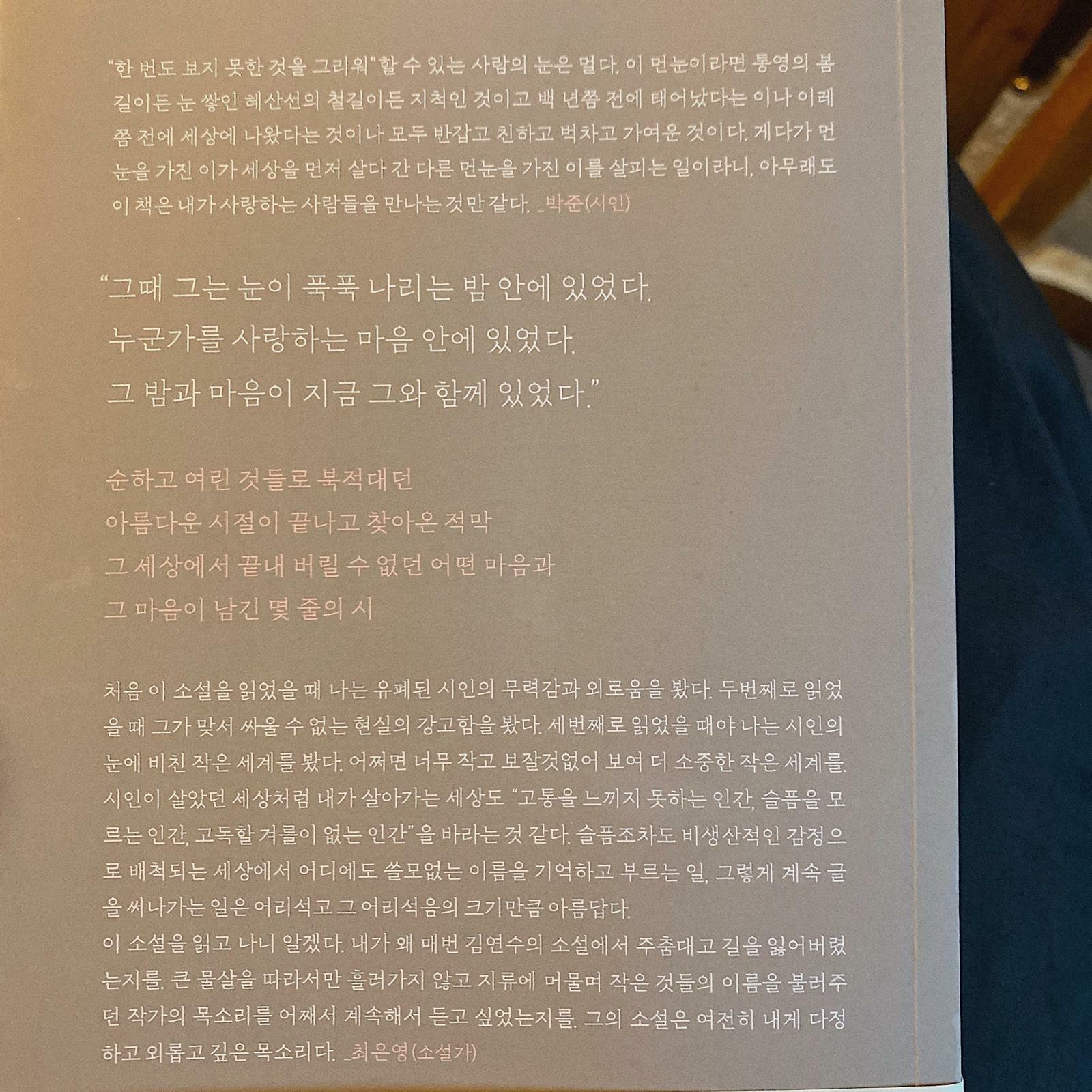-

-
일곱 해의 마지막
김연수 지음 / 문학동네 / 2020년 7월
평점 : 


어쩌다보니 출간하자마자 구매해서 읽게된 김연수 작가의 신작 <일곱 해의 마지막>. 지난 주에 서점을 쓱 둘러보고는 이 책이 제일 실패 확률이 적을 것 같아 골랐다. 언제든 읽게 되겠지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읽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다. 하지만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8년 전에 출간된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도 출간하자마자 읽고 꽤 좋아했었다. 아무튼, 골자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김연수 신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읽었다는 말이다.
시인들의 시인이라 불리는 백석. <일곱 해의 마지막>은 바로 그 시인 백석을 모델로 한 소설이다. 또한 1950년대 후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시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 김연수 특유의 방식으로 풀어낸 소설이기도 하다. 꿈, 청춘, 문학(시), 사랑. 그동안 김연수 소설을 이뤄왔던 주제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등장한다. 저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을 다시 호명하며 삶의 후반부에 그가 겪었을 고뇌를 꺼내놓는다. 당연히 그 기저에는 백석을 향한, 시인을 향한, 문학(시)을 향한 애정이 깃들어 있다.
물론 이 소설을 어떻게 읽느냐는 독자 마음이다. 알려지지 않은 백석 말년의 이야기로, 혹은 그와 닮은 어떤 이의 이야기 그 어떤 방식으로 읽어도 무리는 없으리라. 내게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은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의 삶하고는 별개로서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읽혔다. 예술가와 예술 작품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이 책도 자연스럽게 비슷한시각으로 읽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 속 벨라와 기행이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곱씹는 문장이 특히 좋았다. ‘자신의 불행과 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214p)거나, ‘그래도 꿈이 있어 우리의 혹독한 인생은 간신히 버틸만 하지. 이따금 자작나무 사이를 거닐며 내 소박한 꿈들을 생각해. 입김을 불면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작고 가볍고 하얀 꿈들이지.‘(223p)와 같은 표현들 말이다. 어쩌면 이 소설은 우리에게 ‘작고 가볍고 하얀 꿈‘만은 꿀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다.
www.instagram.com/vivian_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