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이지 않는
폴 오스터 지음, 이종인 옮김 / 열린책들 / 2011년 1월
평점 :

절판

"폴 오스터를 읽어야지. 역시 또 새 책을 내주셨어."
"요즘, 누가 폴 오스터를 읽냐. 촌스럽게."
친구가 확실히 '촌스럽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구식이라는 느낌의 단어를 말하긴 했는데..
사실은, 내심 속으로 동의하긴 했었다.
기록실로의 여행- 에서부턴 '의리' 혹은 '끝까지' 라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생각은 여전하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관계의 사람이건 이 작가를 소개하곤 했었는데, 매번 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
'공중곡예사' 인지 '뉴욕 3부작' 인지를.
'스토리텔링이란 이런 것이다' 인지 '네가 누군지 너는 알겠니' 인지를.
내 경우엔, 처음엔 전자에 끌리고 이후 후자에 반한 경우라서, 대부분 공중곡예사나 달의 궁전을 첫선물로.
'신탁의 밤' 부턴가 헷갈리기 시작했었다. 흐음..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읽는 재미야 보증수표랄 만 한데,
작가님이 나이가 드시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잘 못 읽어서 알아채지 못하는가 싶어지는 것이.
물론 독서력의 결핍이 주된 이유였을 건데, 그래도 조금은 작가님 탓으로 돌리고 싶은 뭔가 개운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인지, 이번 책은 '내가 처음으로 빌려 읽은 폴 오스터의 소설' 이 되었고, 다 읽고 난 후에 후회했다.
이야기의 힘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질문을 던지는 힘이 완전 합체가 된 것 같은 느낌. 사야지.
콜럼비아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대학 2년생 Adam 에게 그의 청춘시절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으로 인한 죄의식, 자기 경멸에서 벗어나려는 종적을 따라 이야기는 흘러가지만 사실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된다. 그 과정에 있었던 세 명의 여성, 마고와 세실과 그윈. Gwyn 과 Adam. 책을 덮고 난 뒤에 마음속에 남는 건 그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건, 그것에 대한 두 사람의 기억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없을 거고 그럴 필요도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의 역사가 알려주는 거라면, 그럼에도 내가 기억하는 나의 역사가 어느 순간 흐릿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와 누군가만 알고 있는 일에 대해 십년 쯤 지난 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십년 동안 내가 되새기고 되새겼던 것을 그 누군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 확신에 찬 이야기에 꽤 당황했었고, 아직도 당황스럽다. 그 당황스러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 소설 덕분에.
이 소설이 나에게 말하는 Invisible 이란 그런 것이었다. 뿌옇고 모호한 기억. 너는 어떤 이였고 나는 어떤 이였는지.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믿고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소설에게 물음표를 달 이유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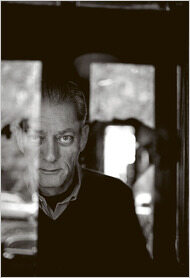
뉴욕타임즈 서평에 실린 사진. 마음에 들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