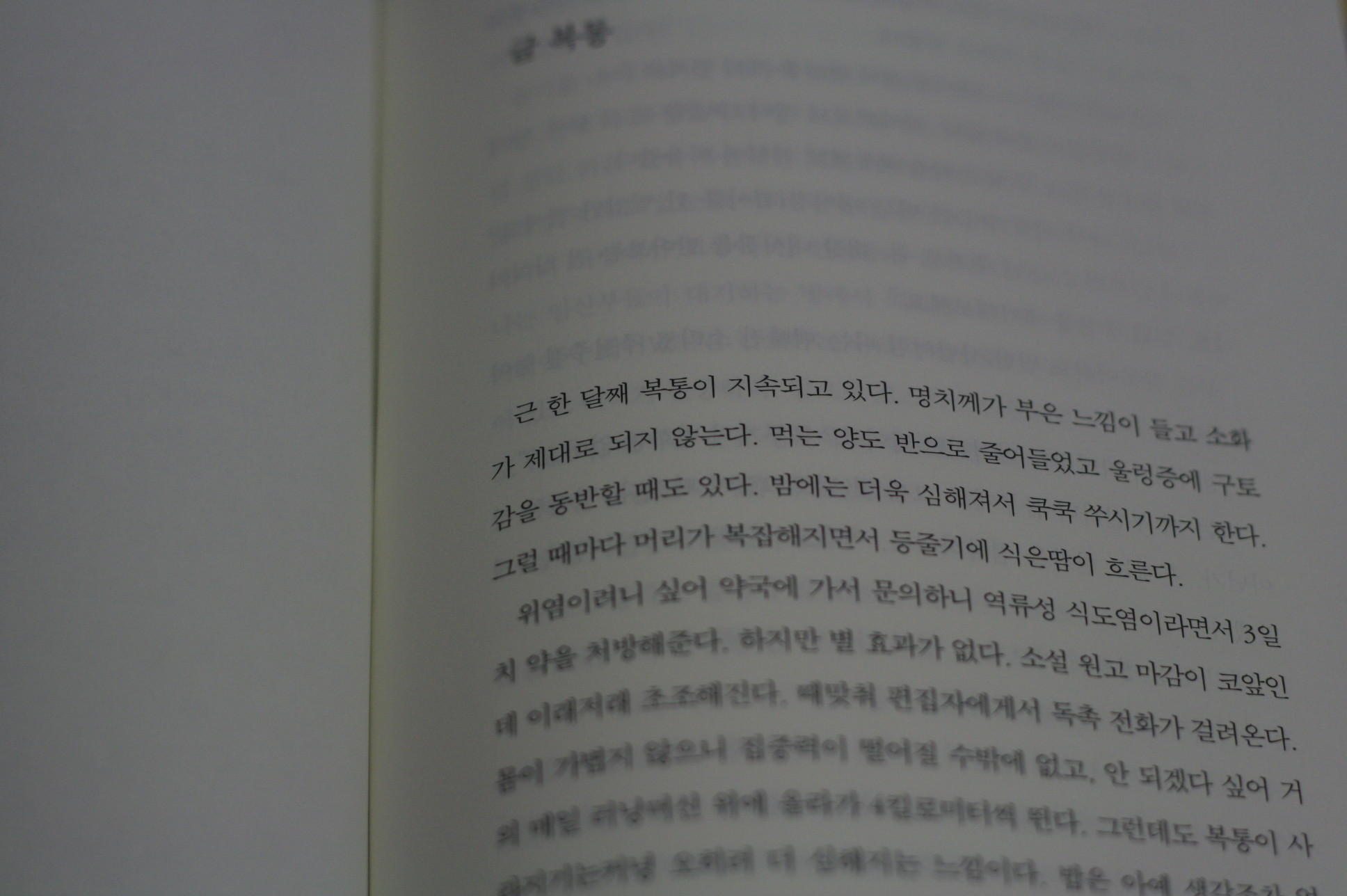-

-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 윤대녕 산문집
윤대녕 지음 / 푸르메 / 2010년 9월
평점 :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을 때 산문집만한 것이 없다. 그 중 윤대녕의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이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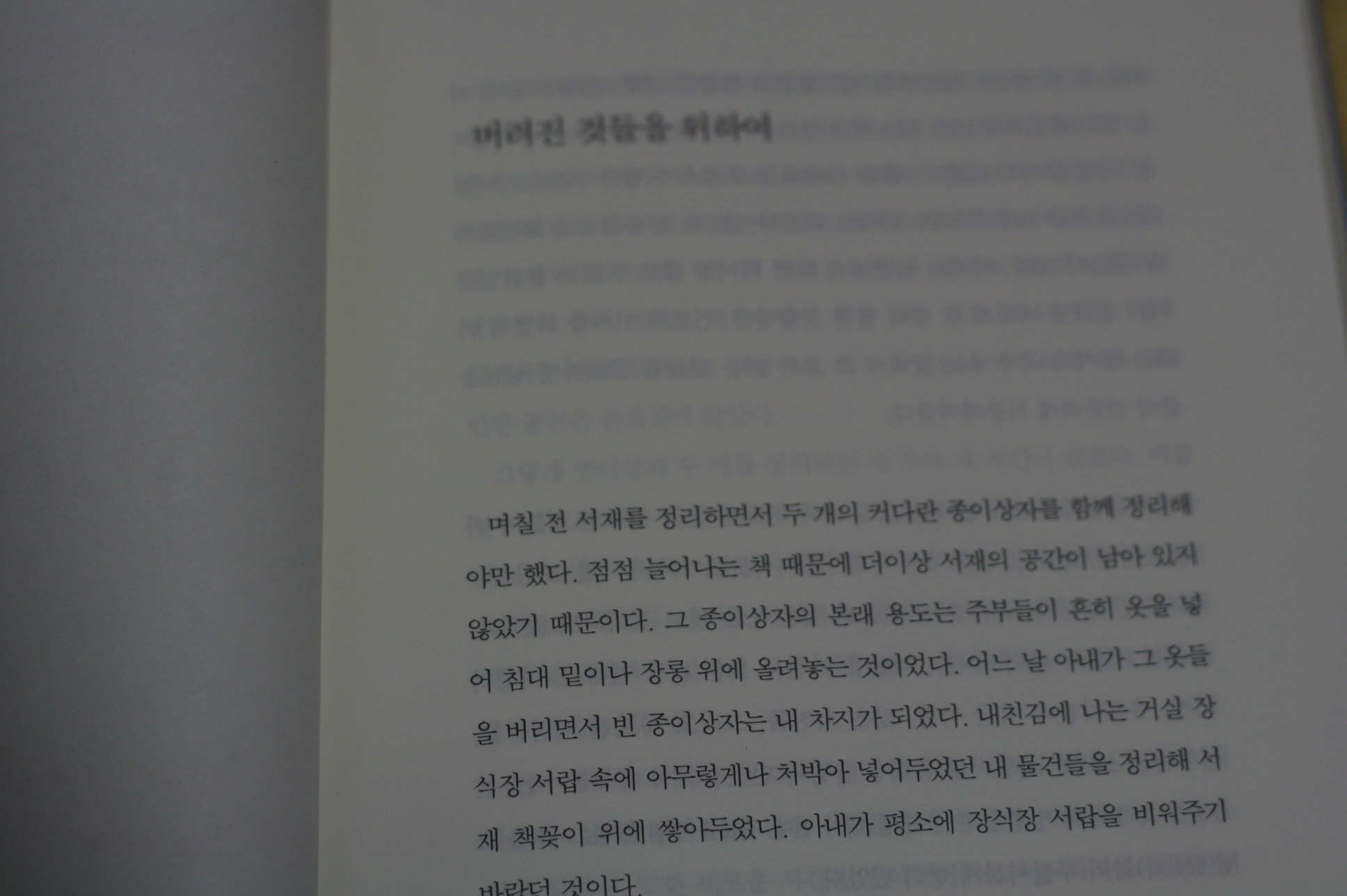
산문집에는 윤대녕 소설가가 타고난 소설가로서의 기질 외에는 달리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상에 마음이 가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생활의 기본이 되는 돈을 의식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특히 문학을 하고 있으니 그는 얼마나 가난한 부자였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걸인이 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오로지 소설 쓰는 일임을 통감하여야 했을 때, 행복한 슬픔에 가슴이 요동쳤으리라. 물론 요즘에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이 문학의 길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것을 보기도 한다. 가난한 사람은 문학의 길에 들어섰다가, 먹고사는 일에 지쳐서 문학을(먼 훗날을 기약하며) 가슴앓이로 간직하기도 한다. 그의 빛에 대한 단상을 읽을 때는 나도 따스한 빛에 쌓였던 시절로 돌아갔다. 한 겨울, 빛이 드는 마루에 앉아서 빛의 보에 감싸인 채 잠이 들기도 했었다. 작가는 여러 번 이사를 다녔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그 집에 빛이 얼마나 잘 드는가 였다고 한다. '집이 어둡고 습하면 사람의 성격도 차츰 그렇게 변하게 마련이다'이라며 모든 만물은 빛에 민감하다는 말은 읽고 또 읽어도 눈길을 잡아 끄는 부분이다. 작가는 문화에 대해서도 "나 역시 재밌는 것이 좋고 즐겁게 살고 싶다. 하지만 쇼 오락 프로그램처럼 강요된 웃음 뒤엔 늘 거대한 공허함이 도사리고 있다. 사람에겐 저마다 저울의 눈금으로 잴 수 없는 존재의 무게가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며 재미에만 치우쳐 있는 대중의 가벼움에 반성을 던져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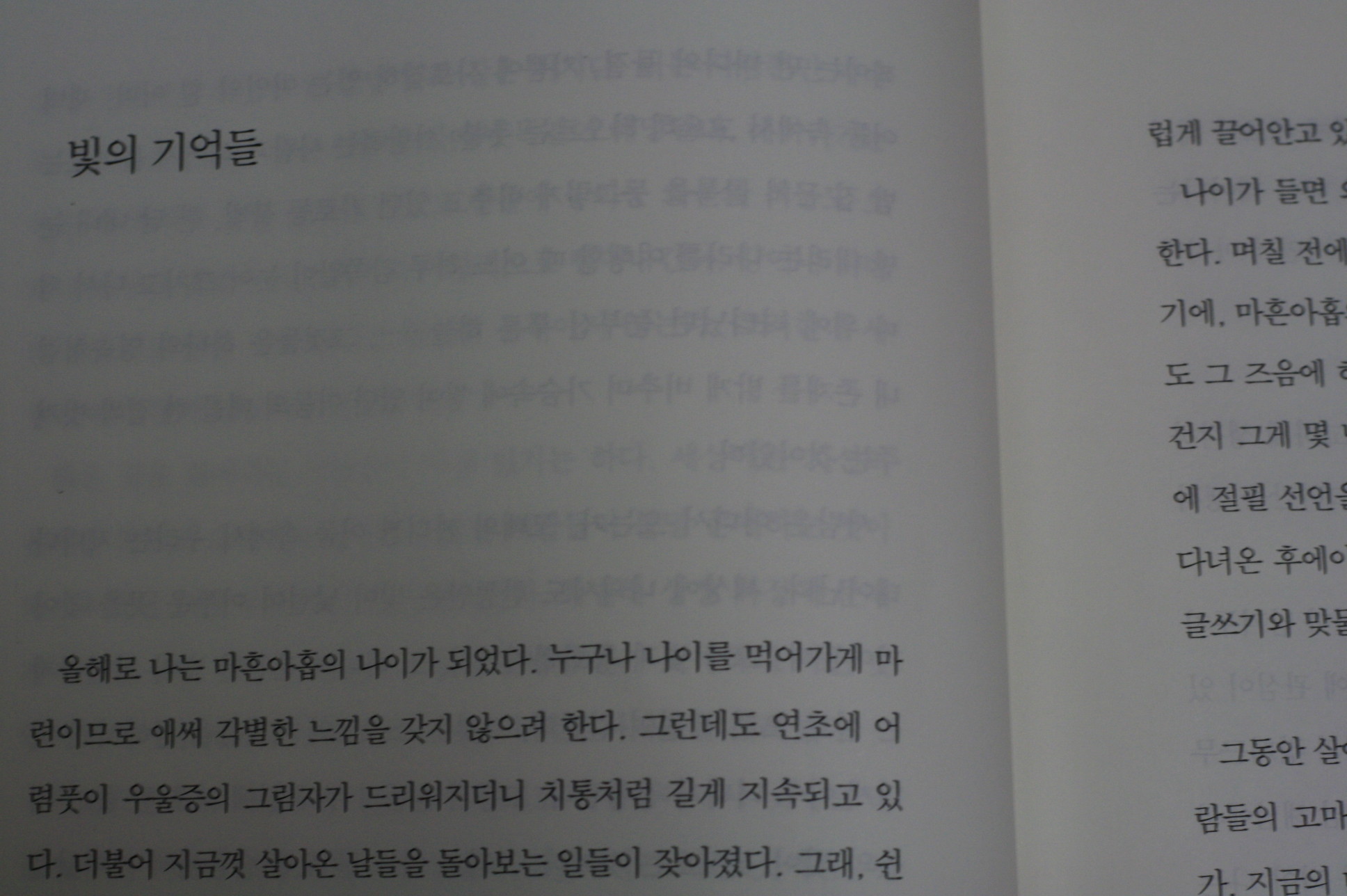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혹은 이웃과 자신의 이야기가 잔잔한 강물처럼 쓰여 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만나게 되었던 시인이야기며, 소설가로서 글 복통에 시달렸던 이야기며,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담고 있다. 차 한 잔과 깊이 있는 수다처럼 누군가의 생활 속에 방문하고 싶다면 '이 모든 극적인 순간들' 속에 있는 것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