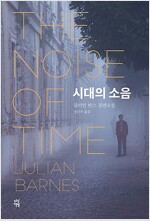아침에 일어나 북플을 보다가 녹턴을 당일배송할까 어쩔까 망설이다가 ebook으로 구매했다. 어제 웹서핑을 하다 가즈오이시구로 책 중에 녹턴이 젤 좋았다는 글을 읽었다. 흔히 남아있는 나날과 나를 보내지마를 꼽는데, 이시구로는 참 고루 사랑받는 작품을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장은 읽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또 주섬주섬 챙기고야 말았다.
녹턴은 아마도 유일한 단편집인데 음악에 대한 소재들이 주를 이룬 것 같다. 데모테이프를 만들어 열심히 음반사의 문을 노크했고, 미국으로 건너가 록스피릿으로 히피여행을 한 20대의 이시구로의 열정이 또 그렇게 ‘뜨겁지 않게‘ 녹아 있을 것 같다.
음악을 소재로 다루었다고하니 쇼스타코비치가 주인공인 소설 시대의 소음도 자연적으로 연상됐다.
뭣 모르고 줄리언 반스에 대한 애정만으로 탐독했었는데,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을 오페라로 만들었고 작품속에 스탈린을 비판하는 코드를 넣었고 그걸 용케 스탈린이 알아챘었다고 하니 시대의 소음도 한 번 더 읽고싶어졌다. 시대의 소음에서도 주인공은 애매한 정체성의 소유자였는데 어쩌면, 확실한, 분명한 정체성이란 것은 애초부터 없을지도 모르겠다.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의 정체성 또한 일본인이지만 영국에서 자랐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일텐데 왠지 그것 외에 뭔가 더 있는데 일부러 감추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독자들을 안개 속의 풍경 앞에 앉혀 놓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풍경을 드러내는 여우같은 명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