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음사 쏜살문고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걸어도 걸어도와 태풍이 지나가고가 소설화되어 나왔다. 원작 소설이 있고 영화화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원작영화가 있고 소설화 되었다는 건 히로카즈가 소설을 썼다는 이야기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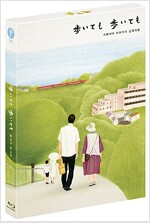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는 두어편을 제외하곤 다 봐버렸다. 추구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레 다가와서 피할 길 없이 마주한 사랑? 첫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였다. 나중에야 영화 비평들을 보고 내가 반대로 해석해서 본건가? 갸우뚱 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클라이막스가 없는 그의 영화들에게서 늘 특별한 감동을 받아 왔다.
<걸어도 걸어도>는 히로카즈 감독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인지도 면에서는. 본 지가 꽤되어 디테일한 줄거리가 생각나진 않지만 어머니 역할의 키키 기린이 수십년이 지난 남편의 과거를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코믹하면서도 애환이 묻어나는 명장면이었다.
히로카즈 영화의 테마는 가족이다. 완전한 가족이 아니라 구멍 뚫린 가족. 그 구멍은 메워야 하는 모자람이나 부실함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의 거기 있음이다. 부족함 마저 끌어안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뻔한 진부함으로 관객들을 교화시키려는 몸짓이 히로카즈의 영화에는 없다. 한결같은 분위기의 히로카즈 영화들이 개별적으로 사랑받는 건 이런 이유일거라고 짐작해본다.


<태풍이 지나가고>에 나오는 무능력한 아버지상 조차도 인간적인 이해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힘은 히로카즈가 거창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한다가 아니라, 어른이 무엇일까? 어른은, 부모는 꼭 책임감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걸까? 그래야만 부모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한다.
히로카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경계가 모호해서가 아니라 마인드가 유동적인 사람. 그래서 히로카즈가 만든 영화는 따듯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유함과 위로를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 열심히 보지 않아도, 잠깐 잠깐 졸 수 밖에 없는 잔잔한 흐름 속에서도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의 한 장면이 몇 년이 지나도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영화의 소설버전은 어떤 느낌일까...(문득 든 생각인데, 잠깐 졸 수 밖에 없는 설정은 히로카즈의 고도의 전략인건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들고 다시 보면 볼수록 디테일을 찾아 내고 탄복하게 만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