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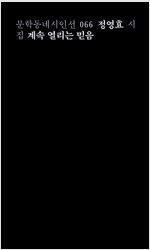
얼마 전 태백 여행길에서 선물 받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부르면 내가 돌아보았다>.
신.용.목?
어디서 들어 본 이름인걸...하고 기억을 곱씹으니
정시인님이 추천해 준 시인들 중의 한 명이었다.
창비시선 411번이다. 신용목 시집.
나비
내 왼쪽 어깻죽지에는 가을 새벽에 산을 오르는 호랑이 한마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낙엽이 겨울 바닥에서 차갑게 죽어가는 화요일.
꿈에서 덮었던 끝없이 펼쳐진 모포,
눈이 내리고
난로 위에서 주전자가 돼지감자 소리로 끓고 있을 떄,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의 중력이 체험되는 것이다.
메모까지 하고
골몰한다. 무슨뜻일까?
눈이 내리고
중략
대합실
나는 그가 오는 모든 시간을 세시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세시가 그를 데려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행성에 내리기 위해 멀리서부터....
누군가 흔들어 깨보면 늘 그랬습니다. 세시에 도착하기 위해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잃고
그림자를 껴안고 누워 울었습니다. 그림자는 어느날 절벽으로 뛰어내린 자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 행성으로 떠나는 꿈으로부터....
누군가 그를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스스 일어나 차창처럼 절벽을 열고 바라볼 텐데,
세시는 얼마나 높은 곳을 지나갑니까?
중략
절반만 말해진 거짓
이제 놀라지 않는다
새가 실수로 하늘의 푸른 살을 찢고 들어간다해도
그것은 나무들의 짓이라고
오래전 내가 청춘의 주인인 슬픔에게 빌린 손으로 연못에 돌을 던졌던 것처럼
공원 새들을 모조리 내던지는
나무들,
서서 잠든 물의 무덤들
중략
다 읽고 좋은 시를 고른 것이 아니라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읽는데 고르게 좋다, 왜 정시인님이 그렇게 좋다고 말했는지 알겠다. 집나간 슬픈 마음이 돌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