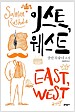





<한밤의 아이들>을 읽으려고 진즉부터 시루느라, 그 사이 <조지프 앤턴>을 읽고, 이제 <이스트,웨스트>까지 읽었다. 보통은 두꺼운 책은 멀리하고, 외면하고, 밀어 놓건만, 이상하게 <조지프 앤턴>은 손을 내밀어 가져 오게 하는 마력을 발휘하는 책이었다. 이제는 발화의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느낌 밖에 안남았지만. 숨어 사느라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경호원들과 우정이 생기고 정도의 어렴풋한 기억과 함께. 아, 그 와중에 연애도..
<이스트, 웨스트>는 단편집이다. 이번은 말하자면 재독인데, 역시 재독을 하면 더 정이 간다. 안 읽히던 부분도 잘 읽혔다. 소설을 읽었다기 보다 작가를 더 알아졌다는 느낌. 이러구러 <한밤의 아이들>읽을 일만 남았다.
이기호의 <웬만해선 아무렇지도 않다>를 유쾌하게 읽은 이후로 단편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었는데, 그 이전의 앨리스 먼로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과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들이 좋았던 기억 때문이기도. 그리고 시쓰기 수업이 좋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다. 이유인 즉슨 쓰기 수업의 매력에 눈 떴다고나 할까. 시도 썼으니(이렇게 말해도 되려나) 소설도 한 번 써보지 뭐.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어서 <이스트, 웨스트>도 그런 관점에서 봐졌다. 취향으로 보자면 글쎄, 썩 딱히 이거다 싶은 책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잡다한 지식과 흘러넘치는 끼와 재기는 천명관이나 이기호와 닿아 있는 듯도 하다. 그리고 작가 본인은 이스트, 웨스트 중간 지점의 쉼표가 자기라고 했다지만, 읽기에는 이스트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 같았다. 이스트가 훨씬 재밌다고 느낀 건 독자의 정체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흥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력감에서 벗어나려고 도서관 글쓰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땐 참 느기적 느기적 최소한의 숙제만 겨우 해내며 그냥 시니컬한 학생으로 앉아만 있었던. 지나고 보니 그 때가 참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읽고 어쨌든 꾸준히 쓰기를 시도했었군. 매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매여야만 뭔가라도 한다는 존재의 아이러니라니. 어디다 내놓아도 쓰잘데기 없는 감정만 흘러 넘치는. 그리하여 덜컥 또 보이는대로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수업에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