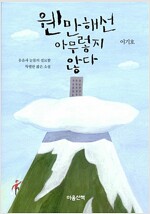‘살만 루슈디와 오에겐자부로, 배수아는 원래 있던것이었고 시마자키 도손과 헤르타 뮐러는 내게 없는 책이었다.‘
이런 문맥이 나왔으므로 ‘최미진은 어디로‘가 무조건 좋았다. ‘최미진은 어디로‘는 이기호 5년만의 신작소설집의 첫번째 단편이고 여기엔 모두 일곱 편의 단편이 실려있다. 이 중 ‘권순찬과 착한 사람들‘은 기존의 소설집이거나, 문학상 모음집에서 읽었던 작품이고 ‘한정희와 나‘도 다른 소설집에 실려있는 단편이다.
이기호를 떠올리면 거침없는 시원함, 유머, 구수한 입담이 연상된다. 어딘가 성석제와 새끼 손가락 정도 걸고 있고 천명관 옆동네 쯤 살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이기호는 이기호다. 그에게 생긴 믿음은 ‘차남들의 세계사‘가 연원이었는데 불행히도 나는 ‘차남들의 세계사‘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 필립 로스의 책들을 다시 읽기하는 것처럼 이기호도 발표순서대로 다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이기호인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납득될만한 말로서 정리하고 싶다.
‘한정희와 나‘의 내용은 사회적 현실과 나를 보여주는데, 제목에서 한정희와 나를 대등하게 병치함으로서 내용이 현실을 약하게 그린 것을 보완하고 끌어올렸다. 제목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래서 멋있는 소설이 되어버렸다. 초기의 소설들이 사회비판적인 골계미가 돋보였다면, 지금의 한기호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기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교회오빠 강민호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역시 이기호는 인간탐구보다 사회탐구에 더 재능이 있구나 생각한 순간, ‘최미진은 어디로‘를 보면 그것도 아니다.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최미진은 어디로‘의 마지막 문구인데, 그는 종일 허허실실 웃으며 전개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예전의 그의 소설들에서는 작중화자인 작가가 거의 안보였는데 이번 소설집은 화자의 무게감이 크게 다가온다.
그것이 소설적 기법인지, 로스 소설들에서 네이선 주커먼,
이기호 소설들에 등장하는 시간강사 ‘나‘의 비중들이 소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염두에 두고 다시 읽고 싶다.
이야기를 기억하고 구분하려고 <전락>과 <죽어가는 짐승>을 다시 읽었는데
그 때 뿐이고 또 가물가물하다. 옆에 두고 정리하고 자주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은 망각되기 마련이다. 늙어가는 이유라고 너무 자괴감을 갖지 않기로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