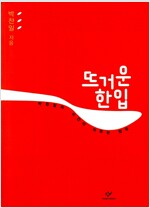어찌나 습한 바람이 마구 부는지, 샤워를 두 번이나 했다.
어제 빌린 책을 반납하러 가는 길에 그새 나온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돌아와서 냉장고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니 진땀이 삐질삐질. 시간도 금세 갔다. 여기서라도 쓰레기 안나오는 생활을 해보자 맘먹었는데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쓰레기와 설거지거리가 생기니 숨이 붙어 있는 한 인간은 지구에 유해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하루 종일 비를 즐기며 마지막 날을 장식하리라 했건만 어쩌면 내일까지도 비는 못 보고 가겠다. 이후의 일주일은 계속 비예보던데 왠지 억울한 느낌.
뒹굴뒹굴 읽을거리가 뭐 없나하고 서가를 보다가 박찬일의 <뜨거운 한입>을 빼들었다. 수년 전에 읽은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끝으로 그의 책을 안읽은지가 꽤 되었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북토크에서 치킨스톡을 쓰지 않고 아침에 장을 봐서 제대로 국물을 내서 장사를 하려면 임대료 인건비에 값하느라 늘 적자고 적자를 메우기위해 새벽까지 글을 쓴다던 그.
주말에 왔던 친구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하라고 했을 때, 생각난 건 파스타다. 알리오 올리오를 가장 선호했는데 요즘은 해물이 들어간 매콤한 토마토소스 스파게티가 좋아졌다. <어쨌든 잇태리>, <보통날의 파스타>에서 이태리 유학시절이야기, 파스타와 재료들에 대한 구수한 입담 가득한 글들을 읽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 그간 책이 꽤 나왔다.
아직도 글을 써서 식당을 운영 중인건지, 어쨌든 <뜨거운 한입>에서도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와 식재료에 대한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한가득이다.
가을엔 여수에 가서 삼치회를 먹어야겠고, 제주토속음식 중엔 애저회라는 것도 있으며 이태리에선 토끼고기와 흰염소를 먹는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 감자 얘기엔 신경숙의 <감자>, 김동인의 <감자>,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에 까지 이야기가 끝도 없다.
˝먹는 일을 글로 써서 책을 펴내는 일이 벌써 여러권째다. 부끄럽다. 나는 순수하게 먹이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것은 소매를 걷어 붙이고 밥을 해본 이만이 아는 기쁨이다. 그러나 돈을 받고 밥을 팔게 되면서 그 기쁨을 잃었다. 거기에다 그 밥 파는 이야기를 글로 써서 두번씩 남우세스럽게 되었다.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글로 밥을 지어 바친다. 맑은 술 한 잔을 반주로 맛있게 드시길 바란다.˝ - 후기 중
그가 만들어내는 요리 못지않게 그의 글 또한 맛깔난 밥상이다.
글밥을 파는 일이 부끄럽다는 것은 그의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내보일만한 글을 쓰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