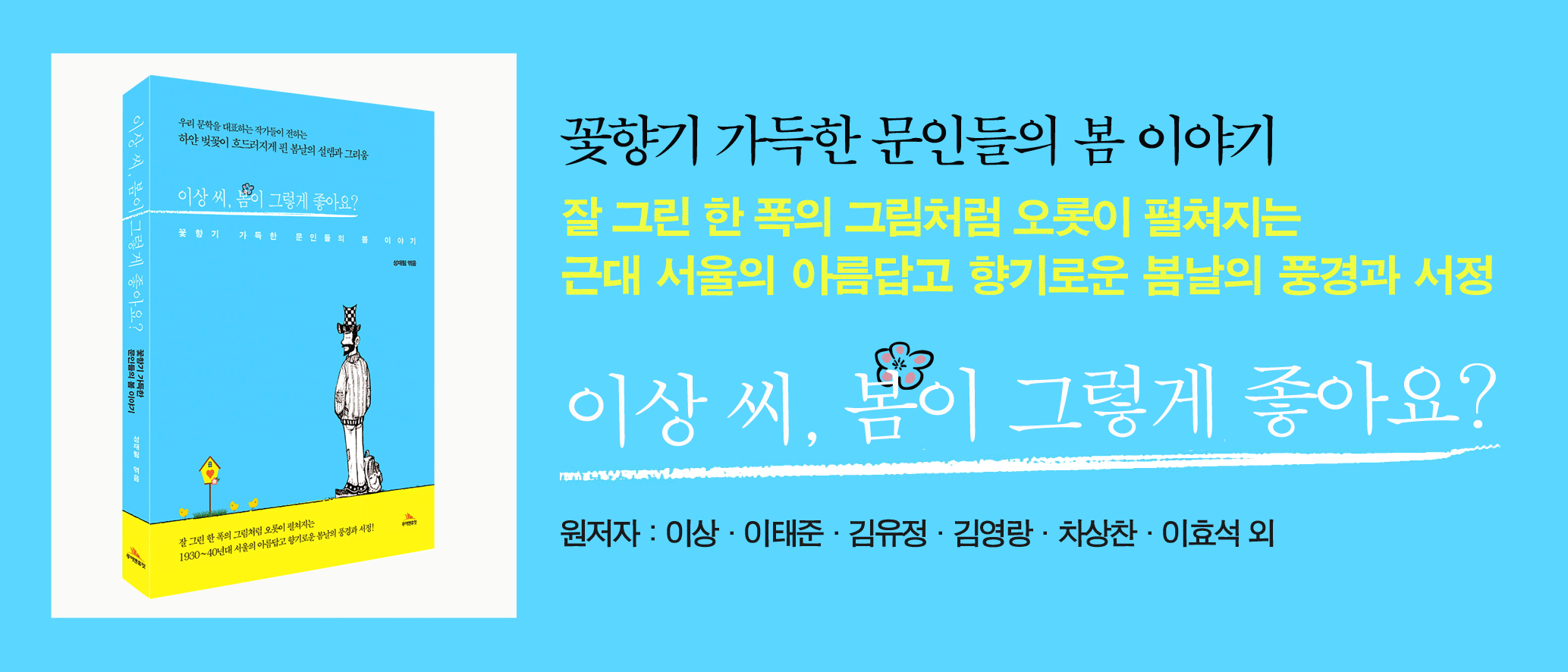
잘 그린 한 폭의 그림처럼 오롯이 펼쳐지는
1930~40년대 서울의 아름다운 봄날 풍경과 서정!
"밤섬이 싹을 틔우려나 보다.
걸핏하면 뺨 얻어맞는 눈에 강 건너 일판(한 지역 모두)이
그냥 노랗게 헝클어져서는 흐늑흐늑(나뭇가지나 머리카락 따위의 얇고 긴 물체가 자꾸 느리고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양)해 보인다."
이상의 <서망율도>라는 글의 일부분으로, 지금의 여의도 근처에 있던 밤섬을 바라보며 봄이 오는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얼큰한 달래 나물에 한 잔 술을 마시며 밤섬을 지켜보던 그는 다시 봄을 이렇게 묘사한다.
"강으로나 가볼까.
울면서 수채화를 그리던 바위 위에서 나는 도(도수) 없는 안경알을 닦았다.
바위 아래 갈피를 잡지 못하는 3월 강물이 충충하다(맑거나 산뜻하지 못하고 흐림). 시원찮은 볕이 들었다 놨다 하는 밤섬을 서에 두고 역청(흑갈색)을
풀어 놓은 것 같은 물결을 나는 몇 번이나 몇 번이나 내려다보았다."
다시, 봄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봄 향기가 물씬 느껴진다. 노란 꽃이며 연둣빛 나무, 푸른 하늘까지. 모두 봄을 맞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그래서일까. 봄이 되면 누구나 시인이 되고, 에세이스트가 된다. 새롭게 약동하는 봄의 매력에 흠뻑 빠진 나머지 글을 통해 그것을 묘사하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이는 글쓰기를 직업으로 삼는 문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다. 그들 역시 봄꽃처럼 따뜻하고 화사한 언어를 통해 봄을 맞는 기쁨과 설렘, 그리움을 수많은 작품 속에 담았다.
이상, 이태준, 김유정, 김영랑, 이효석 등
근대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스무 명의 작가가 전하는
봄 햇살처럼 생기발랄하고, 꽃향기 가득한 봄 이야기!
《이상 씨, 봄이 그렇게 좋아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상을 필두로 이태준, 김유정, 김영랑, 이효석 등 근대 우리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스무 명이 쓴 봄에 관한 산문집이다.
책 여기저기에 1930~40년대 서울의 봄 풍경과 서정이 잘 그린 한 폭의 그림처럼 오롯이 펼쳐진다. 이를테면, 이른 봄을 맞아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한 것을 그림처럼 표현한 <조춘점묘>는 이상이 1936년 3월 3일부터 26일까지 《매일신보》에 총 7회에 걸쳐 연재한 것으로 당시 서울의 이른 봄 풍경과 작가의 서정을 엿볼 수 있다.
"얼음이 아직 풀리기 전 어느 날, 덕수궁 마당에 혼자 서 있었다.
마른 잔디 위에 날이 따뜻하면 여기저기 쌍쌍이 벌려 놓일 사람 더미가
이날은 그림자도 안 보인다. 이렇게 넓은 마당을 텅 비워두는 뜻을 알 길이
없다. 땅이 심심할 것 같다. 땅도 인제는 초목(草木)이 우거지고,
기암괴석이 배치되는 데만 만족해하지 않을 것이다. … (중략) …
그러나 역시 잔디밭 위에는 아무도 없고, 지난가을에 해뜨리고(버리고) 간
캐러멜 싸개가 바람에 이리 날고 저리 날고 할 뿐이다."
책은 그야말로 봄 햇살처럼 생기발랄하고 따뜻하다.
작가 특유의 재치와 발랄함을 통해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관한 진한 향수와 그리움을 담은 이야기 및 간략하고 압축된 언어를 통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봄을 맞는 기쁨과 설렘을 표현한 글도 여러 편 있다. 이에 책을 읽다 보면 그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치와 발랄함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진한 여운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없어,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적지 않은 감동에 빠지게 된다.
시대적 상황과 글쓴이만의 글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실었으나, 내용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괄호 속에 현대어를 함께 풀어서 사용해 가독성을 높인 것 역시 이 책의 특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