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연애소설은 오랜만이다. 사실, 연애소설(순수하게 '연애'만 다룬 소설말이다) 읽은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동안 추리소설에 빠져 살아서,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책들이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다. 가슴 두근거리는 느낌, 킥킥대며 웃게 하는 그 감정들이 참 그리워서, 더 좋았는지도 모르겠다. 이메일을 통한 그들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보다는 그 뒷 이야기 <일곱번째 파도>가 감흥은 덜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말이 이루어져서 그냥 좋았다. <일곱번째 파도>가 번역되기 전에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를 읽은 사람들은 그 뒷 이야기를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을까.


<퍼디도 스트리트 정거장>의 이미지를 넣어야 하는데;; 알라딘에 없는 상품이라고 나온다. 이런일이(오륜가?). 나중에 수정해서 넣기로 하고ㅜ <퍼디도 스트리트 정거장>은 정말 끝내주게(?)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판타지의 느낌이 상당히 강한 내용인데, 원래 상상력이 부족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는 내가 어찌나 생생하게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던지, 읽는 내내 오싹오싹 했더랬다(근데 주인공은 왜 계속 늘씬한 공부벌레로 각인되던지 모르겠다. 2권에 넘어가서야 그의 몸집을 겨우 인지했다). 물론 우리와 상당히 다른 종족들이 많이 등장해서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여타 소설과 달리 가볍게 끝나지 않고 상당히 여운을 남기는 결말을 맺어서 가슴 한 구석이 찡하게 아파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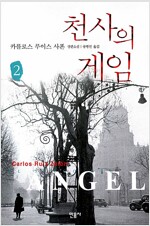
<피플 오브 더 북> 역시, 견줄 수야 없지만 나름 괜찮았던 작품. 원래 팩션이란 장르 자체를 싫어하는데 유대인의 경전에 얽힌 '팩션'이라는 사실을 구입 후 깨닫고 경악했지만, 이야기를 풀어가는 작가의 능력은 있는 듯해서 심하게 거부반응이 들지는 않았다. 다만, 책에 남겨진 하나의 얼룩 등으로 인해 과거의 사실들이 논리적인 고증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술술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아쉬웠다. <천사의 게임>은 나름 많이 기대를 했던 작품이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전작 <바람의 그림자>에 조금도 미치지 못한 느낌이었다. 환상적인 느낌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개연성이 없고 이야기가 뚝뚝 끊어지는 느낌도 강했고. 적어도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이라면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조금은 실망이었다.




<고백>은 알사탕 1000개에 혹해서 구입한 작품으로 얇은 분량이라 쉽게 읽혔고, 어려운 내용도 없어서 가독성이 좋다. 각각 다른 사람의 시점을 취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성이라 지루함이 덜한 것도 있었다(일반적으로는 싫어하는 구성이지만). 이 작품이 다른 소년범죄를 다룬 작품과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의 가족이 스스로 복수(?)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랄까. 사실 법이 보장해줄 수 없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 통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다. 복수의 방식도 꽤 신선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가슴이나 머리를 강타하는 뭔가가 없어서, 그냥 재미있게는 읽었지만, 남들에게 강력추천!까지는 못하겠다.
제프리 디버는 <본콜렉터>와 <열두번째 카드>의 링컨라임시리즈 말고는 접한 적이 없는데, 리뷰들이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길래 읽은 책. 사실 얼마나 띄엄띄엄 읽었는지 거의 10월 한 달 내내 집에서는 이 책을 부여잡고 있었는데(진도가 안 나가서가 아니라, 할 일이 많아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박진감 넘치게 읽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장면을 교차 서술하고 있는데, 흥미가 반감되기는 커녕 점점 더해가는 이상한(?) 소설이다. 반전은 그닥 충격적이지 않았지만, 요즘 읽은 스릴러 소설(생각해보니 요즘 스릴러는 안 읽었던 것 같기도;;) 중에서는 최고!

드디어,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었다! 끝없는 자유와 진정한 인생을 갈구하는 조르바를 만났다. 나는 책을 읽는 내내 화자인 '나'에 감정이입되어 경탄하고, 부러워하고, 애쓰면서 조르바를 바라보았다. 삶에 얽매이고, 책에 얼굴을 쳐박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등한시하던 '나'는 어쩌면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생각했다. 동화되어가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고만 것은 그는 '조르바'이고, 나는 '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그리스는 사람을 '조르바'처럼 살게 하는 곳일까?




<피츠버그의 마지막 여름>은, 사실 내 취향이 아니다. 젊은 시절, 어느 여름, 젊음에 취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는 마약이나 동성애나 난잡한 성생활이나 폭음이나, 이런 일 말고도 발산할 기회가 많은 데 말이다(아, 나 왠지 할머니가 되어가는 느낌;;). 가독성은 좋고, 사실 읽을 때에도 지루하거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결말로 향할 수록 내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는 것도 그렇고. 읽고 난 뒤에 남는 게 없다는 점도 좀 걸린다. 마이클 셰이본은 <유대인 경찰연합>을 읽어볼까 해서 관심을 가졌던 작가인데, 이 작품으로 급하락하고 있다는.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김연수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길래(출간만 하면 베스트셀러에, 모두들 찬양(?)하고 있으니), 뭔가 있어보이는(?) 제목의 책을 입문용(?)으로 골랐다. 오늘 물음표가 많군. 원래 사회적인 소재에 관심이 많은 터라 이 책을 읽고 <밤은 노래한다>도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무한 보류. 내 머리가 정말 굳어버린 것인지, 읽을 때에는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읽고 나니 거미줄처럼 엉켜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가? 소제목 하나하나는 참 마음에 든다. 지인에게 읽고 설명해달라고 책을 넘겼는데, 그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단어 하나하나를 내게 묻는다. 으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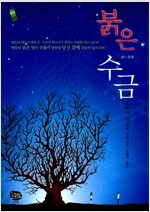

<붉은 수금>과 <그 여자의 살인법>도 넣기가 안되는군. <붉은 수금>은 미도리의 책장 시리즈라 믿고 샀는데 지뢰를 밟은 듯. <그 여자의 살인법>은 읽는 내내 불편해서 그렇지 썩 나쁘지는 않았다. 나름 반전도 있고, 누구나 예상하는 결말로 귀착되지도 않고 말이다. 근데 표지가 좀,, 성의없이 만든 티가 역력해서 소장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