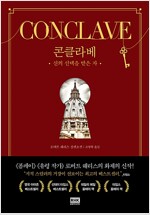📚책과 열쇠. 미스터리의 계절
— 책과 열쇠의 계절
고교 2학년 도서위원인 호리카와 지로와 마쓰쿠라 시몬이 활약하는 일상 추리+학원물이랄까. 시시껄렁한 일로 심각해하고 투닥투닥하는 게 귀엽다. 파슬리 콜라를 서로 먹이려고 하는데 아, 저 때는 저렇지, 저런 거 없어도 만들어서라도 (골려) 먹일 때지, 하며 술술 읽어가다,
왠지 모를 울컥함에 마지막 페이지를 한참이나 보았다.
— 거꾸로 소크라테스
단편집이다. 표제작이자 첫 작품 ≪거꾸로 소크라테스≫가 <책과 열쇠의 계절>과 묘하게 맞닿는 부분이 있다. 마쓰쿠라 프리퀄(+시퀄)인가 싶을 정도로. 아직 읽는 중인데 첫 번째 이후로 이상하게 잘 안 읽힌다. 거꾸로 책인가.
— 내가 죽인 사람 나를 죽인 사람
청춘의 비분강개를 담은 특유의 문체와 페이소스가 돋보인다. 전작 <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만큼 빛과 어둠의 서사가 더욱 강렬하다. 작가의 이력이 배어나는 경계인의 정체성도 여전하다. 사건이 아닌 정서의 환기에 집중하는, 대만의 끈적한 여름밤이 떠오르는 소설.
— 일곱 명의 술래잡기
미쓰다 신조는 한 권 정도는 읽어야지, 하면서 내내 안 읽고 있었다. 미스터리는 좋은데 호러는 싫다. 특히 일본 작품.
너무 더워 짜증 나던 어느 날, <일곱 명의 술래잡기>를 읽어 버렸다. 더위를 잊어야 한다! 궁금해서 빨리 읽고 싶었지만 마지막 전개가 두려워 되도록 낮에 읽었다.... 다행히 귀신 이야기(?)는 아니었다. 서사는 사실 슴슴하고 공포 요소도 클리셰에 가까운데 종장을 향해가는 으스스한 기운만큼은 흥미진진. 노파와 고이치의 대화는 묘하게 코믹하기도. 이 정도 공포라면 나도 읽을만하다. 근데 며칠 전 한밤중에 깼는데 갑자기 소설 속 술래잡기 — 정확히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 가 떠올랐다. 😑 어우. 술래가 아이들 세는 장면을 생각하다 잠들어버렸지만. 그만큼 재밌게 읽은 것이라 생각해야지.
다음은 뭘 골라야 적당한 스릴로 이 계절을 즐길 수 있으려나. 모 독서플랫폼에 의하면 취향 일치도에서 <마가>, <노조키메> 순으로 높던데 믿어도 되는 건지.
— 점성술 살인사건
2년쯤 전인가? 전면 개정판이 나왔을 때부터 읽고 싶었다. 엄청난 트릭이 대체 뭘까. 하지만 소재에 걸맞게 토막 살인+오컬트의 무시무시한 내용이라고 해서 마음을 다지는 데 어언...
다행히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생각보다 참혹하진 않다. 명성대로 트릭 설계가 세심하고 이를 위한 점성술 서사도 탄탄하다. 하지만 40년 간의 난제까지는... 드러나는 전모와 범죄 동기, 트릭의 실마리가 얼렁뚱땅 개연성이 떨어져 아쉽지만, 1980년 본격의 부활을 알리고 작가가 최근 전면 개정을 낸 만큼 공들인 작품이다. 여기에 독자로서 지적 유희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다.
— 미스터리 세계사
TTS로 오며 가며, 이일 저일 사이 듣는 킬링타임용으로 골랐다. 대기근 때 아일랜드인이 이주한 비영어권 국가 중 최대 규모가 아르헨티나라는 사실은 처음 알았다. 세계에서도 아일랜드인이 이주한 나라로 다섯 손가락에 든다고 한다.
— 콘클라베
가톨릭 신앙에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적당히 어우러져 술술 읽힌다. 얼개는 단순하다. 콘클라베를 구성하고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것. 세계 각지에서 모인 118명의 추기경이 기도하고 아침 먹고 투표하고 개표하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먹고 투표하고 개표하고를 반복하는 사이사이 감찰과 고발, 시치미, 반목, 모략이 펼쳐진다. 염탐과 술수라고 해봤자 노구의 성직자들이라 별 거 없다. 대화와 간구, 그리고 기도하기. 이게 스릴러인가 싶지만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콘클라베는 온갖 이슈로 부글댄다. 급기야 테러까지 발생. 지상 교회의 최고 자리는 누구에게 갈 것인가.
인노켄티우스(인노첸시오)는 십자군 때 이런 교황이 있었지, 정도밖에 모른다. 오랜 세월 이 이름의 교황이 없기도 하고, (우리말 기준으로) 어감 때문인지 켄타우로스가 떠오르면서 왠지 모를 이방의 기운이 느껴진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