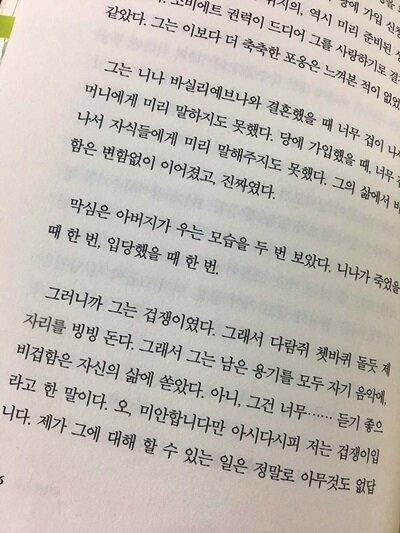-

-
시대의 소음
줄리언 반스 지음, 송은주 옮김 / 다산책방 / 2017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시대의 소음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방 안의 모든 것을 삼킬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문학, 음악, 미술... 하다 못해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 마저도 시대의 소음에 빠져 침몰했을 때, 개인은 무엇으로 숨 쉴 수 있을까?
쇼스타코비치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가 어떤 음악을 만들었고, 어떤 생을 살다 갔는지는 하나도 몰랐다. 나는 [시대의 소음]이 한 음악가의 생애에 대한 소설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공산주의의 최극단이었던 소련의 정치권력은 집요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이러니라는 무대를 그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라는 인간은 사람과 예술을 모두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죽음’을 감수했다. 이 책은 개인의 의식 속에서 끊어질 듯 말 듯 팽팽히 이어져온 생존과 죽음, 시대와 개인, 정치와 예술, 정의와 도리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세밀하게 그렸다.
인간이 타인의 의식 속을 이렇게까지 끈질기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기억의 밑바닥에 남겨진 오래된 흔적까지도 추적하여 그것이 어떤 얼룩인지, 누가 흘렸고, 왜 거기 흔적이 남겨졌는지까지 낱낱이 묘사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소설이기에 가능한 일.
소설은 끝났지만, 아직도 소설의 주인공이 온 생애를 걸고 애통해 했던 아이러니는 끝나지 않았다. 소설의 주인공은 때로 냉소하고, 때로 부끄러워하고, 때로 울었다가 결국은 노인이 되었다. 모든 것을 그저 관망하는, 죽어가듯이 바라보고만 있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끝에서, 이 음악가는 그리고 작가는 묻는다. 음악은, 예술은 나아가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소설은 끝났지만, 아직도 물음은 계속된다. 우리 삶의 무대에는 여전히 시대의 소음을 깔고 아이러니가 주연으로 서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