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식주의자
한강 지음 / 창비 / 2007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한다.
이 말... 누가 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굳이 찾아봐야 할 필요를 못 느껴서 출처는 미상으로 두기로 한다. 어느 영화의 유행어처럼, 뭣이 중헌디. 저 말이 중하고 저 말을 한 이가 누구인지는 (지금 이순간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한다. 자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린다라....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자기 자신이 되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한다.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투쟁하거나, 못마땅한 현재를 견디거나.
돌연 채식을 하다 완전히 섭식을 끊기로 한 영혜는 투쟁하는 편을 택했다. (택했다기 보다는 사실, 그에겐 그 길밖에 없었다)
이 현재는 많은 것을 포함한다. 이제까지 고수해온 취향, 식성, 습관, 성격, 가치관. 내가 몸 담아아온 세계와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의 질서, 그 사이에서 공유했던 정서와 규칙들. 그래서 현재에 투쟁한다는 건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세상의 질서와 어쩌면 온 우주와 싸우게 되는 걸지도 모른다.
누군가 당신 옆에서 현재에 투쟁하고 있을 때 당신은 그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의 싸움을 지지할 것인가, 저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방관할 것인가.
이 소설은 묻는다. 이 물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폭력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영혜의 각성은 어느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녀의 명치에 대롱대롱 작은 목숨 하나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일이었다. 현재에 투쟁할 힘이 없어 견디기만 했던 그녀에게 꿈이 불을 당긴 것 뿐이었다.
[소년이 온다]에서도 느꼈지만 한강은 인간의 폭력성을 서글프게 전달하는 특이한 작가다. 처참하게 피를 흘리는 살덩이를 그려 폭력이 나쁘다고 알리는 법이 없다. 다만 슬퍼하고 애끓는 어떤 목소리로 해치면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치 혀도, 시선 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43쪽
아마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상대를 해칠 수 있는 존재는 인간 밖에 없을 것이다. 말 한마디조차도 필요없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하나로도, 아무 감정을 담지 않은 눈빛 하나로도 인간은 상대의 다리를 꺾어 다시는 못 일어서게 만들수도 있다. 애정을 가장한 간섭이나 예의를 가장한 경멸 같은 것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해한다는 위로를 잠자코 들어야 하는 굴욕처럼 살면서 얼마든지 겪어야 하는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픈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아픔을 달래주는 것들도, 치료해 새 살이 돋게 하는 것들도 분명 있다.
영혜의 언니가 생각한 것처럼, 그래서 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죽일듯 미웠던 사람에게 아주 오랜 뒤에쓸쓸한 연민이 들기도 하고, 끔찍한 일들을 겪은 뒤에도 소리내어 웃기까지 하고.
어쩌면 이런 인간의 아이러니가 이 민감한 폭력의 바다에서도 인간이 미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신이 배려한 유일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영혜보다는 영혜의 언니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현실을 허물고 꿈으로 건너가기 위해 미쳐버리는 대신, 현실에 투쟁하지만 미칠수는 없어서 굴욕과 경멸을 꾸역꾸역 삼키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고보니, 영혜는 이름이 있지만 그녀의 언니는 이름이 없다.
왜 영혜는 영혜라는 고유의 이름으로 특정되었지만 그녀의 언니는 그러지 못했나.
어떤 인물로 특정되지 않아 내가 되기도 하고 내 지인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도록, 그래서인가보다.
영혜처럼 살지 못하여 그녀의 언니처럼 살아가는 많은 우리를 위해 이름 없이 두었나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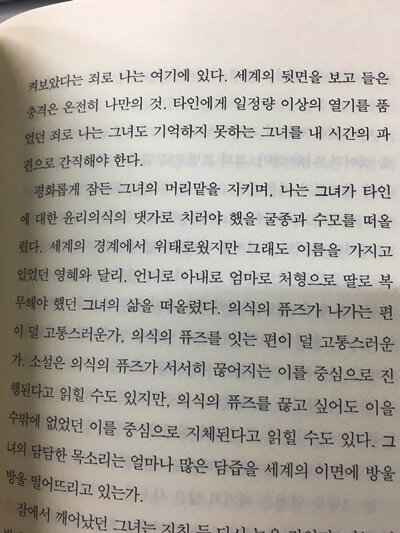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젖가슴이 좋아. 젖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치 혀도, 시선 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4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