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가 되기 싫은 개 - 한 소년과 특별한 개 이야기
팔리 모왓 지음, 공경희 옮김 / 소소의책 / 2020년 1월
평점 :



크크크. 만약에 내가 캐나다의 어느 산골짜기에서 멀리 서 있는 머트를 봤다면, 나 역시 “쉿, 아가. 저기 진짜 살아 있는 산염소가 있단다!(책 172쪽)” 라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을 거다. 화자의 말대로 어떤 산염소보다 감동적인 등산기술을 선보인 머트의 매력은 대체 어디까지인가?
팔리 모왓은 이미 고인이 된 작가다. 마흔네 권의 책을 썼고 캐나다 독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연주의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개가 되기 싫은 개]는 작가 팔리 모왓의 자전 소설로 자신이 소년 시절에 직접 겪은 일을 소재로 쓴 작품이다. 캐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거버너 제너럴 어워드’를 받은 작품이기도 하단다.
책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다. 동물이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생김새보다 훨씬 특이한 성격을 가진 이 개는 단돈 4센트에 팔려 화자의 집으로 들어온다. 족보를 알 수 없어 지어진 ‘머트(잡종견)’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머트는 처음부터 특이한 존재감으로 개도 아닌, 사람도 아닌 그냥 머트로 이 집의 구성원이 되었다. 한국식으로 이름을 말하면 똥개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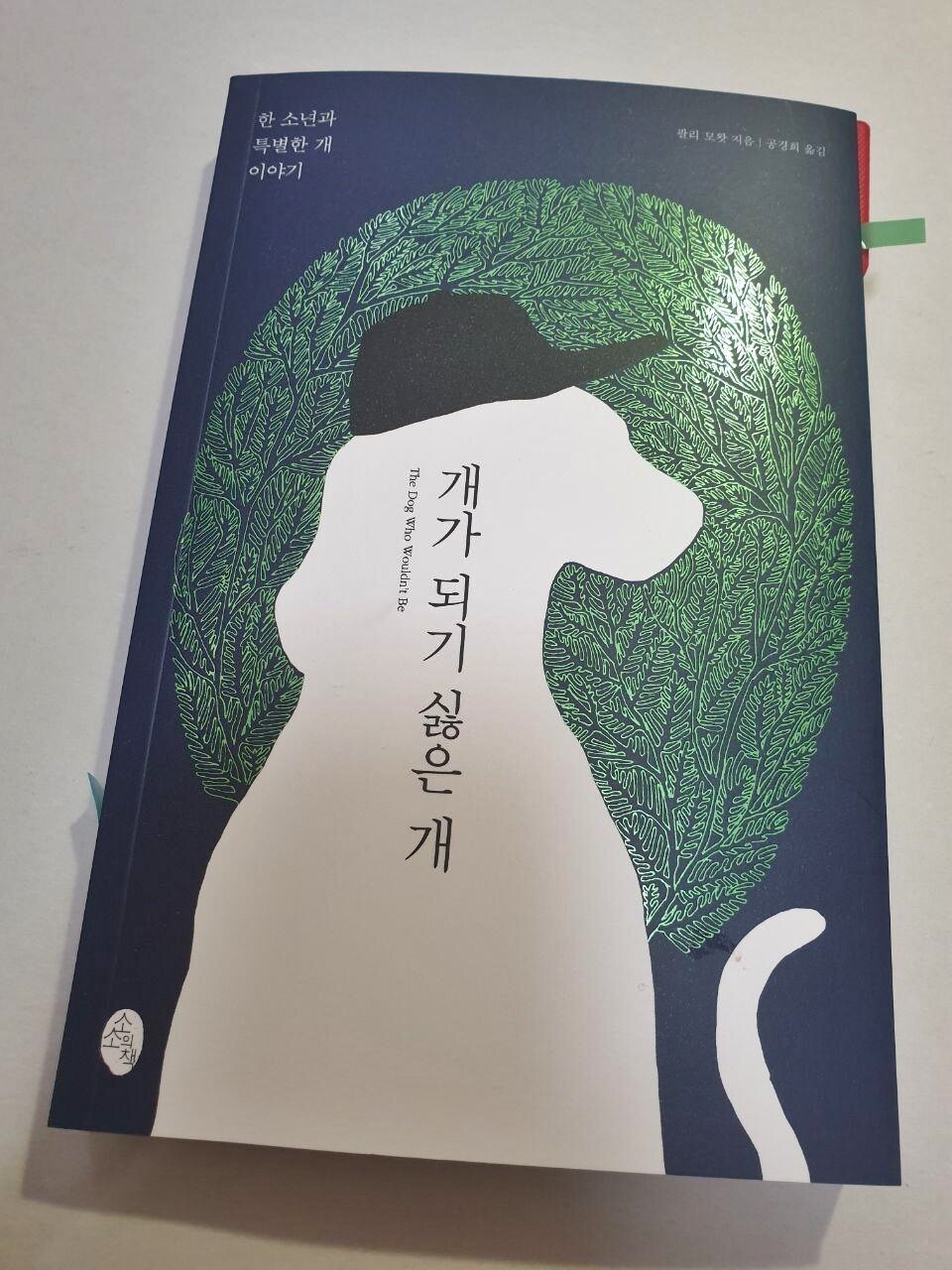

[개가 되기 싫은 개]에서 그려지는 머트의 활약상은 참 특이하고 기이하다. [창문 밖으로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이 ‘왜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소리를 지르지?’라는 독백을 하는데, 머트도 이런 독백을 틀림없이 스스로 여러 번 했을 거야. 성질을 좀만 죽였어도 머트의 삶은 편안하고 순탄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트는 수치심도 알고, 도도하게 자존심을 지키는 법도 아는 평화주의자다.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머트의 매력이 진하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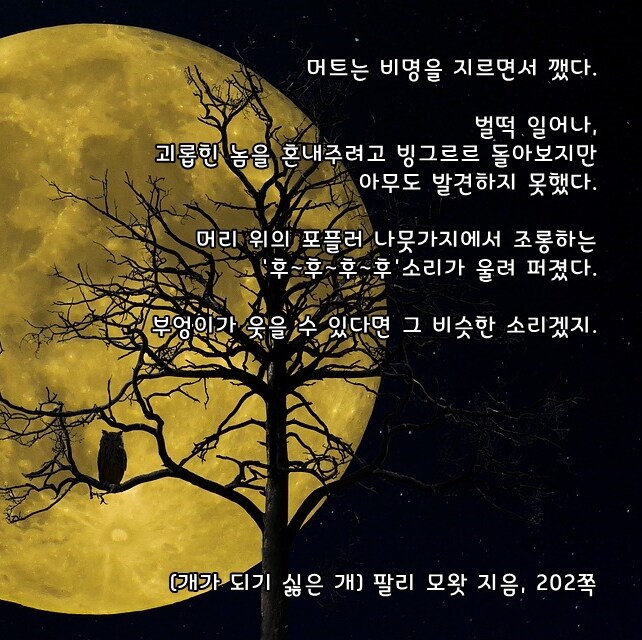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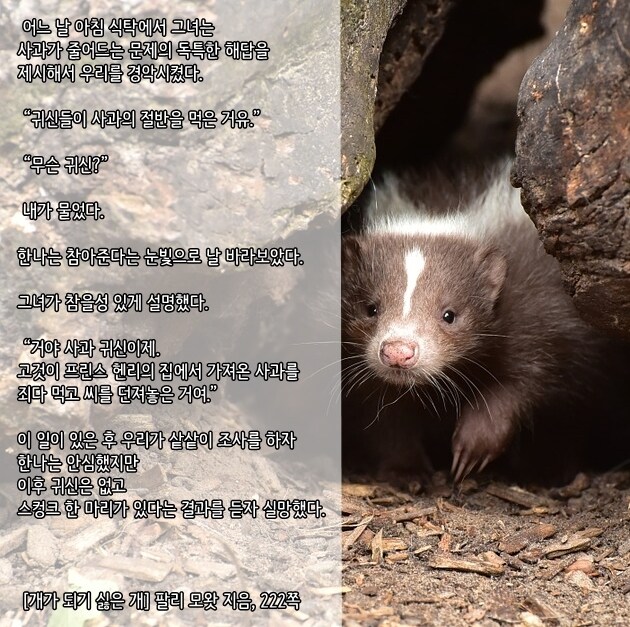
이 소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존재들은 머트를 비롯하여 모두 인간이 아니다. 장을 보러 가는 엄마의 뒤를 걸어서 따라가는 부엉이, 사과귀신을 자처하며 지하실에 전세 든 스컹크 등등 사람과 교감하는 캐나다의 동물들이 이 책에서 아주 따듯하고 정감 넘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말도 안 통하는 동물들이지만 마치 어린 동생들처럼 사랑스럽다. 자연과 교감하며 동물들과 따듯한 유대를 만끽했던 저자만의 시선이 독자 역시 이 책의 이야기를 따라 동물과 교감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온난한 교감을 주고 받았던 동물들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대해서, 저자는 인간적인 연민으로 갈무리 짓지 않아 더욱 담백하고 깔끔하다. 부엉이 올의 마지막, 머트의 마지막. 저자는 그때 느꼈던 슬픔과 아픔을 확대하거나 포장하는 대신, 그저 생의 한 맥이 거기서 끝나고 다시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담담하게 서술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비극을 지켜보면서도, 때로 그 비극 속에 휩쓸려 상처를 입으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담담히 여기 서 있는 자연이란 아마 저런 자세로 있는 게 아닐까 싶다. 마음이 순해지고 아이처럼 천진한 시선을 선물해주는 소설이다.
갑자기 상황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린 웃기 시작했다. 머트는 같이 비웃음을 사는 건 즐기지만 혼자 비웃음을 당하는 건 참지 못했다. 그래서 등을 쌩 돌리고 늪지 끝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순간 우린 머트가 오리들을 버리고 밖으로 나올 거라고 짐작했다. 예상이 틀렸다.
머트는 우리 쪽은 다시 눈길도 주지 않고 늪지의 저쪽 끝으로 헤엄쳐 가서 몸을 돌렸다. 그러더니 총 맞은 오리들 전부를 물가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8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