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첫번째 풍크툼(punctum) : 낭만적 나르시시즘의 세계가 파열되다
이 선생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의 밀회는 더없이 스릴 넘치는 두뇌 게임처럼 급박하게 진행된다. 막 부인이 이 선생을 옷가게로 유인하여 두 사람이 첫번째 밀회를 갖게 되는 날. 그녀가 자신의 사이즈에 맞게 고친 옷을 갈아입고 커튼을 살짝 밀며 이 선생 앞에 나타나는 순간. 관객들은 짧고 덧없는 한숨을 쉰다. “고치니까 너무 붙네요. 숨이 막힐 지경이예요.” 그녀가 딱 달라붙는 옷에 숨 막혀 하는 동안, 관객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숨이 막힌다. 장 지아즈가 아닌 막부인의 매력에 사로잡힌 관객의 시선은 정확히 이 선생의 것이기도 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금방이라도 어둡고 깊은 밀실로 그녀를 유인할 듯이 탐욕스럽고 색정적이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으려 하자, 그는 명령하듯 쏘아붙인다. “그냥 입고 가시오!” 막 부인과 함께 마작을 하며 친분을 쌓던 상류층 부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자마자, 이 선생의 노골적이고 격정적인 눈빛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이 위태로운 연극이 끝난 후 돌아와 쉴 수 있는 백스테이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위민이 이끄는 암살단이 성공적인 조직이었다면, 그녀가 무대 뒤편으로 돌아와 ‘장 치아즈’가 되어 쉬는 동안 그녀는 신뢰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조직원들은, 그녀를 동지가 아닌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그녀에게서 멀어진다. 그녀가 ‘적과의 동침’을 해야 할 임무를 맡았기에 그녀의 연극은 연극으로만 비춰지지 않는 걸까. 처음부터 그녀는 너무 많은 것을 걸어야 했다. 이 선생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그녀는 불안해한다. 그에게서 또 한 번 전화가 온다면, 그녀는 그의 불륜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녀는 ‘첫 경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이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질문한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남녀간의…… 그거…….” 그런데 친구들, 아니 조직원들의 표정이 이상하다. 그들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인 것 같다. “경험자는 량룬셩 뿐이야.” “창녀하고?” 그녀는 암살대상과 섹스를 나누기 위해 자신의 순결을 턱없이 엉뚱한 남자에게 넘겨주고 만다. 이제 그녀는 이 선생을 유혹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 철부지 암살단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한다. 분명히 여섯 사람 모두 동의한 임무 수행을 위해 그녀는 몸을 던졌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이 왠지 불편하게 서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즈음 이선생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온다. 내일 상하이로 떠난다고. 청천벽력이다. 이제 이 선생을 유혹하여 곧 암살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모두들 사색이 된다. 다급한 목소리로, 내일 공항으로 배웅을 나가겠다는 ‘막 부인’의 애원도 소 없다. 그들은 이 엄청난 연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엔, 너무도 철없는 풋내기 배우 지망생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풍크툼’은 이것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강하지 못했기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 이 선생의 측근, 조덕희가 그들의 음모를 눈치채버린 것이다. 그들은 조덕희가 원하는 ‘막 부인의 목숨 값’을 흥정하는 데 실패한다. 어떤 돌발 상황에도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명백한 불청객의 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매뉴얼조차 없다. 그들은 창졸간에, 정말 얼떨결에, 조덕희를 살해하고 만다. 이 모든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유리문 밖에서 목격하고 있던 막 부인, 아니 장 치아즈는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입고 만다. 그녀는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에 제대로 울부짖지도 못한 채 휘청거리며 사라져버린다. 아무도 그녀를 잡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위급한 상황에서 서로의 동선을 체크할 만할 비상 대책은 물론, 이탈하는 동지를 붙잡을 최소한의 용기나 우정도 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첫번째 풍크툼은 이렇게 잔혹하게 그녀의 삶에 예리한 메스를 긋는다. 그녀가 한때 믿었던 신념과 조직, 우정과 열정은 모두 찰나의 헛것이었음을 그제야 깨닫는다. 그러나 그녀는 한동안 이 맹렬한 고통의 진원지조차 알지 못했다. 조직의 실패가, 그녀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뼈아픈 상실감에 어떤 이름도 붙이지 못한다. 롤랑 바르트라면 이것이 바로 풍크툼이라 말하지 않을까. 그녀의 첫번째 풍크툼, 그것은 그녀와 그 친구들의 찬란한 나르시시즘이 철저히 찢겨나가며 생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매끈한 나르시시즘적 정열에 사로잡혀 날것의 세상이 자아내는 울퉁불퉁한 진면목을 꿰뚫어 보지 못한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이 상처에 대해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풍크툼의 특징은 ‘소통불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쉽게 소통될 수 있는 아픔이라면 그것은 관습화된 상징, 즉 스투디움이니까. 바르트는 필생의 역작 <카메라 루시다>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내가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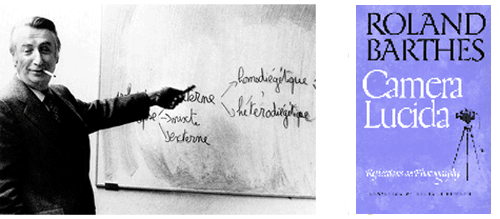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