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와 모더니티 - 영화는 어떻게 가장 독특한 예술이 되었는가
자크 오몽 지음, 이정하 옮김 / 열화당 / 2010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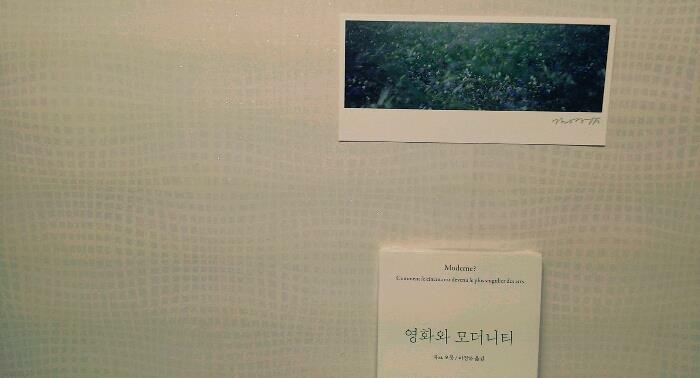
"모던?: 영화는 어떻게 가장 독특한 예술이 되었는가"
영화와 모더니티
(자크 오몽 지음, 열화당 펴냄)
‘모던’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복잡하다. 우리에게 ‘모던’은 시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의식화되기 전에 총칼과 외교적 톱날 사이에 끼여 상처의 질곡과 무너진 기억의 연장선 안에서 영영 비완결될 것 같은 ‘모던’의 지끄러기를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몸의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크 오몽이 영화와 모더니티의 문제 선상에서 모던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말할 때 토로하는 모호함은 우리 앞에서 한 번 더 꼬인다. “‘모던’이란 개념보다 더 불명료하고 성가신 것은 없는 것 같다.” 저자는 모던의 이 속좁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던의 문제와 함께 탄생한 것과 진배없는(시간적으로 그렇단 말이다) 이 독특한 기계-예술에 있어 그것(영화)이 성사될 수 있었던 근본 고지를 탈환하려면 모던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불명료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참 많은 일을 겪어 이제는 “예술처럼” 되어버린 영화가 가진 흐릿한 정체성에 선연하게 부합하는 지도 모른다.
‘예술’부터가 기만적이다. “예술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분명한 개념이자, 아주 빠르게 진화한 개념이다. 예술의 개념은 일관되고 확고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은 정의, 즉 19세기 부르주아 시대가 만들어낸 정의를 채택함으로써만 오로지 분명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유연하게 살아 온 진실을 포획하여 산출해 낸 어휘의 집합장에 살고 있는 ‘예술’의 끝머리에 잔뜩 곯아있는 고상함의 몸짓은 투정과 고집으로 “당신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힘, 혹은 당신의 영혼을 강탈할 수 있는 힘이 있기에 위험스러운 어리석음. 이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은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는 것에 저항했던 것이다.” 영화는 예술이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예술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영화 초창기의 주변부의 반응과는 달리 또한 영화는 예술적이었다. 예술이 될 필요는 없었지만 예술적일 수 있는 자유, 나는 그것을 오몽의 책에서 채색한 모더니티의 풍경의 저의라고 읽는다.
“시네마토그래프는 모던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면, 당시에 모더니티는 학자나 예술가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이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언제나 새롭고 현재에 와 닿는다. 어떤 일(바디우식으로 말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이 우리 사이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의 내부에서 누구도 모르는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구성체를 이루어 간다. “영화는 바로 모더니티와 합류하면서 자신의 모더니티를 발견한 것이다.” 영화는 모더니티를 취함으로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이 되었다. 이것이 완결성으로 일단락되지는 않는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모던으로 서기 시작한 영화의 시간에서 오몽은 두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민 케인>의 오손 웰즈(그가 초기 영화의 종말을 알리고 “형식적 해답의 창안과 이데올로기적 질문의 해소”를 가능케 한 선두주자였다)와 로셀리니(모던을 의식하지 않고도 자크 리베트의 강력한 선언을 통해 모던의 기수로 서게 된 ‘반고전주의자’). “웰스의 영화와 로셀리니의 영화. 그리고 이 영화들이 낳은 것들은 앞선 것들, 특히 양차 세계대전 동안 모더니티를 사유하려 한 노력들과 단절한다. 이런 의미에서 위 영화들은 모던한 시도들로 볼 수 있다.”
이 책이 모던의 계보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던에는 계보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 책의 분량으로도 그것은 과하다. 단순하게 말해 이 책은 모더니티의 질문은 아직 미완성이고(그래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완성을 꿈꾸는 미완성이라고 말한다. 단순하게 말해(적은 분량의 이 책은 결코 단순하지 않지만) 제 2의 모더니티에의 열림으로 개안하자는 것이다. 동의하면서 공감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가 이렇게(“‘모던 영화’에 대해 재차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독실한 신앙의 맹세 뒤의 희미한 뒷맛을 풍길 뿐이다.”) 말하거나 저렇게(“우리는 영화가 사라질 것이라는 데 설복됐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의 영화, 우리가 사랑했던 그대로의 영화가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데 설복됐다. 디지털 이미지가 도래하고 있었고, 질주하는 테크놀로지를 논하는 카산드라들의 예언이 경청되고 있었다. 영화는 계속되었지만, 은밀히 변해 버리지 않았는가.”)말할 때는 동의도 되고 공감도 된다. 그 씁쓸한 뒷맛 때문에 그의 어려운 낙관을 경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