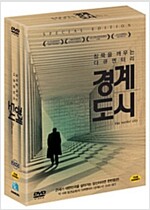어제 작성한 페이퍼의 연장이다. 어제 읽은 <예레미야 애가>의 도입부에는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유다는 욕보면서 살아오다가 끝내 잡혀가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얹혀살자면 어디인들 마음 붙일 곳이 있으랴. 이리저리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었구나."(1:3, 공동번역)
<예레미야>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도 당대 국제 정세와 역학관계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그 와중에 힘의 논리나 민족주의적 사고를 깨려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레미야라는 개인에게 수렴해 지배계층과 계속 투쟁한다. <예레미야 애가>는 결국 예레미야와 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남 유다가 바빌론의 손에 멸망한 후 무너진 성터와 참혹한 삶의 현장을 목도하여 망국의 한으로 부르는 슬픔의 노래다. 알다시피 '이산(이산)'으로 번역되는 디아스포라의 어원은 바빌론 유수 때 유대인들에 뿌리 내리고 있다.
망국의 한은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포개진다. 문익환 목사의 <히브리 민중사>를 보면 내게 각별한 대목이 있다.
“사내 아이가 나면 목을 졸라 죽이라고 했으니,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했으니, 그 어머니들의 한이 오뉴월의 서리로 에집트 위에 안 내릴 수 있겠어?”
이건 70년대 민족수난사 속을 뚫고 나오시면서 출애급기를 읽으시다가 내뱉으신 나의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님의 두 아들은 다 무사히 감옥에서 살아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가엾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억울하게 죽어 나온 그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님들의 심정으로 성서를 읽으셨던 것입니다.
(중략)
아침 식탁에서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 기도에 ‘아-멘’하면서, 나는 어머님의 하느님도 나의 하느님도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의 하느님도 다름 아닌 히브리인들의 하느님 야훼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 24p


거대한 시간 사이에 끼인 헛헛한 존재들은 가슴에 박힌 송곳으로 책을 읽는다. 선지서가 매력적인 건 거대한 시간 사이에 끼인 개인들을 조명하며 역사의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대문자 D(유대 디아스포라)가 소문자 d(일반명사 '난민')으로 바뀐 저간의 사정은 망국과 난민이 국지적인 문제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1차 세계 대전 막바지부터 대규모 현상으로 출현한 난민은 "국민국가의 쇠퇴와 전통적인 법적-정치적 범주의 전반적인 해체 속에서, 어쩌면 오늘날 생각할 수 있는 인민의 유일한 형상"[아감벤, <<목적 없는 수단>>,<인권을 넘어서>(이하 <인권>)]이다. 중요한 것은 난민이 개별적인 사례에서 대규모 현상을 띨 때마다, 여러 조직(난센사무국, 독일난민고등판무관, 정부간 난민위원회 등)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적합하게 처리할 수도 없었음이 입증됐다."(<인권>)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국가 안에서 '인권'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 사실은 "인권 개념이 '인간이라는 순수한 사실(벌거벗은 생명으로서의 인간)'을 제외한 여타의 모든 성질과 특정한 관계를 상실한 사람들과 처음 대면하자마자 파산"(한나 아렌트)했다는 것이다. 시민권의 상실이 인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아이러니.
경계를 거니는 이 낯선 존재들: "확실한 비국가성에 대한 대가"(<인권>)
아감벤은 "난민 개념을 인권 개념으로부터 과감하게 해방시켜야 하며...있는 그대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난민은 국민국가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위기에 빠드리는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범주상의 혁신을 위한 터를 닦아주는 한계 개념이나 마찬가지"(<인권>)라고 말한다. 내가 이쯤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읽기: 슬픔으로 읽기: 상처로 마주치기의 연쇄과정이다. 여기서 다시, 2003년 송두율 교수 사건(<경계도시2> 참조)을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