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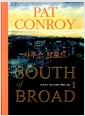
-
사우스 브로드 1
팻 콘로이 지음, 안진환 외 옮김 / 생각의나무 / 2009년 10월
평점 : 
품절

주일은 기다려야겠거니 별기대를 하지 않던 차라 바로 그 주에 배달된 책을 보고는 얼마나 행복하던지...
거기에다가 박스를 푸는 순간... 허거걱... 이게 뭐냐...
이렇게 두꺼운 책은 근자에 읽은 적이 없는지라 그것도 2권씩이나 다 읽고 리뷰를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니
가슴부터 터억 막히는 듯 하더라.
물론, 촌철살인의 짧은 단편들도 충분히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겠으나,
역시 복잡다단한 인생살이를 풀어내기에는 장편소설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2권의 있어보이는 양장본을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겨보기 시작했다.
낯설은 작가의 낯설은 도시설명이 프롤로그에 제시되고 있구나.
찰스턴이라... 왠지 남북전쟁 필이 난다.
과연 이 소설의 장르가 무엇일지 슬쩍 궁금증이 인다.
도저히 감을 잡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 느낌... 평범한 소설들을 읽을 때랑은 뭔가 다른 듯 한데...
1. 1인칭 시점의 성장소설
레오폴드 블룸 킹.. 그의 이름이다. 이 소설을 이끌어가는 주동인물이랄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숭배하여 그에 대한 논문으로 학위를 받은 엄마의 영향으로
아들의 이름까지 율리시스의 주인공 이름으로 짓고 말았다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블룸스 데이(6.16)에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하지만, 오히려 블룸은 두꺼운 안경을 쓴 탓에 '두꺼비'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려진다.
그는 참 평범한 아이이다.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너무나도 완벽한 형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러던 어느 날 욕조에서 자살한 형과 마주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뒤죽박죽 암흑으로 치닫게 된다.
연이은 마약소지 사건으로 결국 레오는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고 어마어마한 사회봉사시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어찌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악의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도 못 경험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힘든 순간을 잘 이겨냈기에 그는 또 그에 응당하는 행복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이 소설은 그런 그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로 1969년 6월 16일부터 1990년까지 이어지는 성장소설의 외형을 표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쓴맛을 알 만한 30대 후반의 나이까지를 다루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루기에 쌉싸름하고 달짝지근한 다른 성장소설보다 조금더 숙성된 맛이 난다고나 할까.
스스로는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을 하지만, 레오.. '두꺼비'.. 그는 참 매력적인 인물같다.
그가 없었으면 친구들과의 교류 또한 가능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년은커녕 1년도 이어지지 못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레오의 인간됨을 나는 고개숙여가며 긍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그의 친구들
1969년 6월 16일, 레오는 옆집에 이사온 쌍둥이 남매 트레버와 시바, 도망치다가 이 곳 고아원까지 오게 된 남매 나일즈와 스탈라, 마약 소지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레오의 고등학교로 전학 온 상류층 채드워스와 몰리, 채드워스의 여동생 프레이져, 새로 온 흑인 코치 제퍼슨의 아들 아이크까지 7명을 만나게 된다. 그 하루의 만남이 앞으로의 레오의 인생을 그다지도 복잡하게 혹은 다채롭게 만들 줄이야. 아마 그 때 그는 몰랐을 것이다.
이들은 정말 성격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동성연애자로 결국엔 에이즈에 걸려버리고 만 트레버, 여배우로서 명성은 날리지만 공허한 세계에서 연기만 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시바, 경계성 인격장애로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들다가 임신한 채 죽어간 스탈라, 신분의 벽을 넘어서 결혼한 프레이져와 나일즈, 인종편견의 벽과 싸우며 찰스턴 최초의 경찰서장이 된 아이크와 그의 부인 베티,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너저분한 상류층의 전형을 보여주는 채드워스와 불쌍한 그의 아내 몰리 등...
그들이 던지는 말 한 마디 한 마디.. 아마 내가 미문화권에서 사는 자였으면 배꼽을 잡았을 텐데,
난 멀디먼 한국땅에 사는 평범한 아낙네이기에 지나치게 성적인 농담에 읽는 내내 '헐.. 얘네들은 이런 농담을 하고 사나. --;' 그러면서 갸우뚱거렸다.
물론, 뭐.. 그것도 꽤나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만... ^^;;
어쨌거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내내 경이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리고, 가족 이상으로 아껴주는 애정은 정말 질투가 날 정도로 부러웠다.
한국에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들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데 말이다.
3. 여러 사건들...
9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긴장감있게 전개하는 능력이 아마도 필수일 것이다.
한 자리에 앉아서 이만한 책을 소화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소설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일 뿐더러
엄청난 인내심의 소유자일테니...
그러나, 평범한 우리네들은 그럴 만한 여유도 그럴 만한 성격도 지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래서일까?
끝까지 책을 놓지 않게끔 긴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소설은 단순히 성장소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때로는 스릴러, 인종갈등, 계층갈등, 로맨스가 첨가되고
그리고 마지막엔 놀랄 만한 반전까지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주축된 사건은,
- 형의 자살<--주교놈,
- 수녀였던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새로운 삶
- 불뚝 성질 캐논아저씨의 위대한 유산
- 에이즈에 걸린 트레버 찾기 소동
- 스탈라와의 관계 정리
- 시바의 죽음, 그리고 그 미친놈의 추격과 결말
- 허리케인
등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들의 성격, 인종갈등, 계층갈등이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결국엔 하나로 녹아내리듯 잘 버무러져 있다.
아.. 그리고 그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또 다른 등장인물인 찰스턴의 역할 또한 쉽게 볼 수는 없을터...
만약 이런 일이 마이애미나 뉴욕에서 일어났다고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안개에 싸인 찰스턴과 레오,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 또한 찰스턴에 대한 애정이 샘솟음을 느꼈다.
세상은 사실 엿같다.
레오가 겪은 일(미친 주교새끼..--;)이나 쌍둥이 남매의 또라이 아빠,
그리고 6,70년대 흑인들이 겪었을 편견,
민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듯 보여도 결국엔 계층간의 갈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요즘 사회적인 모습들만 보더라도
침을 뱉고 싶듯.. 엿같은 세상 속 인간들이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세상을 또 살만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습게도 돈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니지 않은가.
결국엔 인간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끼는 게 아닐런지..
"인생에선 말이야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어"
그렇지. 꿈도 못 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불현듯 생길 수도 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국엔 레오가 그 모든 힘겨운 일들을 이겨냈듯이
그리고 그 힘겨운 일들이 결국엔 또 다른 행복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었듯이
끝까지 친구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듯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세상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할터...
물론... 세상이 다소 엿맛이 나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