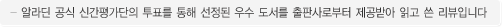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

-
사이언스 이즈 컬처 - 인문학과 과학의 새로운 르네상스
노엄 촘스키 & 에드워드 윌슨 & 스티븐 핑커 외 지음, 이창희 옮김 / 동아시아 / 2012년 12월
평점 :

절판

사이언스 VS 컬쳐
인문학과 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철학의 역사를 아는 것이 곤충학자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음악이 주는 감동을 과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까. 컴퓨터는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인간과 과학은 도무지 만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마이클 생크스는 인류는 새벽부터 ‘사이보그’였다고 말한다. 인간은 12만년 전부터 사물을 능숙하게 다루었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인류는 그 옛날 벌서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문화가 없었을 것이다. 문명은 인류를 무지 몽매하고 마법적인 세계에서 구제했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동시에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것들에 강하게 매혹당했다.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심지어 종교는 나름의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어쩌면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 사진이 발명되었을 때 인류는 가장 맹목적이 되었다. 사진을 보면서 인간은 그 대상이 그 자리에 ‘없어도’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간은 가상 세계에 살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사물의 이미지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가상 세계에서는 더 이상 실제 인간 관계도 중요치 않다.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채 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스스로 부른 재앙이었다.
대니얼 레비틴은 예술은 어쩌면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통합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음악 속에서 우리는 에고를 상실한다.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이런 의미에서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현대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술이 아닐까 싶다. 윤리를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예술이 정말 이러한 작용을 한다면 윤리의식을 상실하고 야만으로 치닫는 오늘날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이다. 우리가 실제로 합리적이라면 비합리적인 것(예술)과 이렇게 함께 해야 하는지 모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합리적일까. 신자유주의는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주입하면서 경쟁을 부추기는 등 야만적인 행보(비합리적)를 계속하고 있다.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고립된 주체들은 자신이 다른 주체들과 관계 맺음 안에서 타자화 된 채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단히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결정된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 지금 이 방안에 물리학자와 예술가가 있다고 해 보자. 이 둘은 이 방안의 사물을 분명 다르게 볼 것이다. 이 방 안에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아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경제 시스템이 지속할 수 있는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인지 확신도 없고 확신할 필요도 없다. 나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정 불변의 진리란 도대체가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해 아름다움도 객관적 합리성도 없는 것일까. 진리는 합의에 불과한 것일까. 변기는 화장실에 있을 때와 미술관에 있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것은 우리가 미술관에 놓인 변기를 예술 작품이라고 하자는 합의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 전부인지 모른다. 진리는 결함이다.
이성애가 진실이고 진리일까. 동성애를 배제하는 한에서만 그것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반쪽자리 진실일 수 밖에 없다. 객관적 진실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영웅적 행동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우리는 객관 세계를 쉽게 부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것은 픽션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객관 세계를 파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 이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볼 수도 있게 된다. (문학)예술은 여기서도 일종의 윤리적 기술로서 가치가 있다. 스토리텔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눈 뜨고 그들의 삶에 뛰어들고 공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다.
이처럼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한 세계가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예술이다. 과학 기술 만능 시대에 예술은 비합리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했지만 말이다.
과학 기술과 예술이 만나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은 또 많은 점에서 닮았다. 예술가들은 사물을 거꾸로 보거나 새롭게 보려는 사람들이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은 빛을 정지시켜 보려고 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만 이런 엉뚱한 발상이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과학과 예술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예술은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예를 들면 연주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것은 멈춰있는 것이다. 과학 기술은 시간을 잴 수 있지만 말이다. 반대로 아픈 사람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예술도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이 둘은 상보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설 수 없는 것 같다.
과학과 기술이 날로 발전해가는 오늘날 왜 인문학적 사유가 요청되는지 이 책은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과학이 무시했던 인간의 감정, 감수성을 과학은 연구하기 시작했다. 과학 기술 문명은 인간을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동시에 재앙도 가져왔기 때문이다. 재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닫이 문이 아닌 자동문은 뒷사람을 돌보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고 그 이래로 우리는 타인을 돌보지 않게 되었다. 윤리를 상실한 것이다.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우리들은 곳곳에서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사태를 안방에서 티비를 통해 이미지로 보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진지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미지의, 가상 세계로서 경험할 뿐인 것이다.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편리하게 했지만 병들게도 했다. 그리고 이제 과학에게 필요한 것은 예술이고 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