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낡아가며 새로워지는 것들에 대하여
원철 지음 / 불광출판사 / 2021년 6월
평점 :



여름이 되면 바다보다 계곡으로 가는 것이 더 좋고 시원하다. 계곡으로 가면 계곡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할 때가 있다. 이런 물소리는 도심에서 듣기 힘들다. 인공 폭포나 인공 분수가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소리와는 또 다르다. 서울 수성동은 물소리라는 뜻으로 지명으로 삼을 정도로 제대로 된 물소리를 내는 곳이다. 추사 김정희도 수성동 계곡에서 폭포를 보았다는 시를 남기기도 했다. 추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 구경을 하기 위해 수성동을 찾은 것이다. 폭우가 내린 뒷날 수성동 물소리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 계곡을 찾았다. 계곡은 수평으로 넓게 흐르는 물이 좋았고 절벽은 수직으로 떨어지는 폭포수가 좋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시간과 돈을 들여 가야 한다. 그렇다보니 가까운 곳이라면 수시로 갈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풍광을 겸재 정선은 작품 '수성동'으로 남겼다. 폭포에 인위적인 장치지만 통나무처럼 걸친 긴 통돌다리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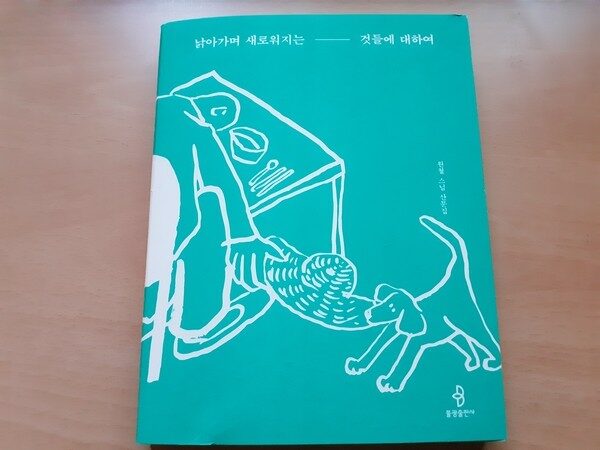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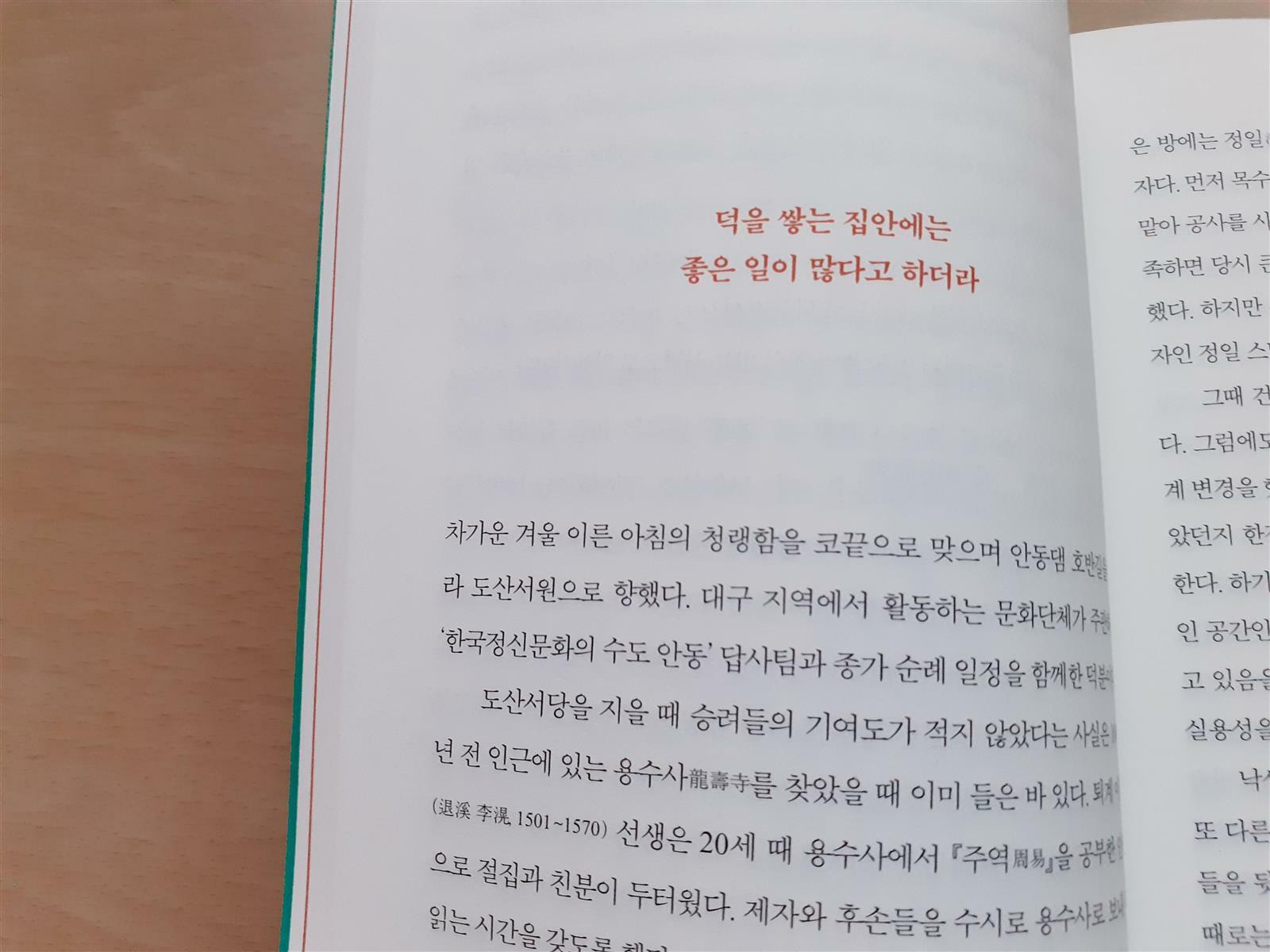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글씨'도 남긴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가면 절벽에 새겨진 최치원 선생의 글씨가 있다. 그 글씨를 탁본했던 기억도 있는데 가야산 입구 계곡 암반과 석변에는 많은 시문과 글씨, 다녀간 이들의 성명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돌로 만든 명함이 얼마나 많은지 조선 인물의 절반을 모아 두었다고 할 정도였다. 최치원 선생은 가야산 계곡에 머물면서 그 심경을 4행시로 바위에 새겼다. 영원히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에 바위에 시를 새겼지만 몇백 년 물과 바람에 시다리다 보면 글자 판독에 애로가 생길만큼 파손되기도 한다. 요즘에 '불멍'이라는 말이 있다. 불을 멍하게 바라보며 아무 생각을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쉬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노력이 보인다. '불멍'에 이어 물멍, 달멍, 숲멍, 산멍, 바람멍 등 다양한 멍때리기 방법이 있다. 우리 조상들도 이런 자연을 보며 멍때리기를 했다. 조선 시대 화가 강희안이 그린 '고사관수도'의 주인공은 가만히 물을 바라보고 있다. 물은 삶의 근원이고 인간은 물 속에 살 수는 없지만 물 없이도 살 수 없다. 그런 물은 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오랫동안 남아 있는 지명에서도 찾을 수 있다. 많은 지명이 저수지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니 물을 좋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