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 마음 - 정채봉 산문집
정채봉 지음 / 샘터사 / 2020년 12월
평점 :



'오세암'의 작가 정채봉.
정채봉 시인의 20주기를 맞아 샘터 출판사에서 시인의 산문집을 출간했습니다.
장님인 누나를 따라 절에 몸을 의탁한 5살 꼬마 길손이가 폭설에 갖힌 암자에서 탱화 속 관세음보살에 안겨 죽은 이야기.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를 쓰신 정채봉 시인.
책을 펼치자 마자 시인은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 가운데 하나를 말해 보라면 나는 '마음'을 들겠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마음으로 울기도 하지 않는가.
(중략)
그중에서도 나는 우리 집에서 아래 영구네 집까지의
1백 미터 남짓 되는 골목길이 별나게도 그립다.
여름과 가을이면 양쪽 언덕 위의 나무들로 하여 잎새들의 터널이던 골목,
봄이면 민들레꽃이 아늘의 금 단추인 양 다문다문 피어나던 흙길,
때로는 쇠똥이 펑퍼짐하게 뉘어져 있기도 하고
간혹 화사한 능구렁이가 쉬엄쉬엄 들고 나던 돌담이며...
장에 가신 할머니를 목을 빼서 기다렸고,
선창의 그 가시내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숨이 가빠서 어쩔 줄 몰라했고,
해 질 무렵 살구나무 위에 올라사가서 노을을 바라보면
왠지 슬퍼져서 눈물을 글썽이며 내다보던 골목길.
고향의 그 골목길이야말로
기다림의 씨앗을,
그리움의 씨앗을,
아득함의 씨앗을
내 여백의 마음에 파종시켰던 첫 작물 밭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

책을 받아들고는 '참 예쁜 책이네.'라고 생각들었어요.
필사노트와 함께 비닐 테이핑된 책은 흡사 향기롭게 익어갈 풋과일 같았습니다.
펼칠 때마다 안쪽에서 은은하게 비추이는 연둣빛이며, 다소곳한 글씨체 하며,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샘터사의 정채봉 시인에 대한 애정이 정성들여 표현된 편집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리고 책의 외양보다 더 아름다운 내용으로 가득찬 책입니다.
어떤 글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내밀한 고백이기도 하고,
어떤 글은 오랜 벗과의 조근조근한 대화이기도 한 이야기들.
한 문장을 읽고 또 읽느라 얇은 에세이인데도 꽤 오랜 시간 읽었더랬습니다.
산문이지만 한 문장씩 떼어 읽으면 또 운문이 되네요.
이게 바로 시인의 마음이구나.
고개를 주억거리게 만드는 시인의 감성과
맑고 투명한 언어!
그러나 유려한 이 단어들은 섬세하게 선택된 것이 아니고
시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책은 총 4장에 걸친 시인의 에세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픔 없는 마음 없듯
별빛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다면
흰 구름 보듯 너를 보며
초록 속에 가득 서 있고 싶다.
이 네 줄의 아름다운 문장이 각 장의 제목입니다.
첫 장은
시인의 마음자리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글로 엮여 있습니다.고향집, 때때로 찾는 절, 그리운 사람들과의 동행.
둘 째장은
1988년 간암 발병 후 투병하는 동안에 적어 내려간 삶과 사랑에 대한 생각.
행간에 홀대한 몸에 대한 미안함, 생에 대한 간절함 등이 배어 있네요.
셋 째장은
시인을 가슴으로 키워내신 할머니와 벗들과의 만남 속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
유유상종이라고, 시인의 벗들은 김수환 추기경님,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님, 장기려 선생님, 그리고 말씀이나 태도로 보아 맑기 그지없는 분들과 교우하셨네요.
넷 째장은
풀꽃,물,땅,구름 같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담백한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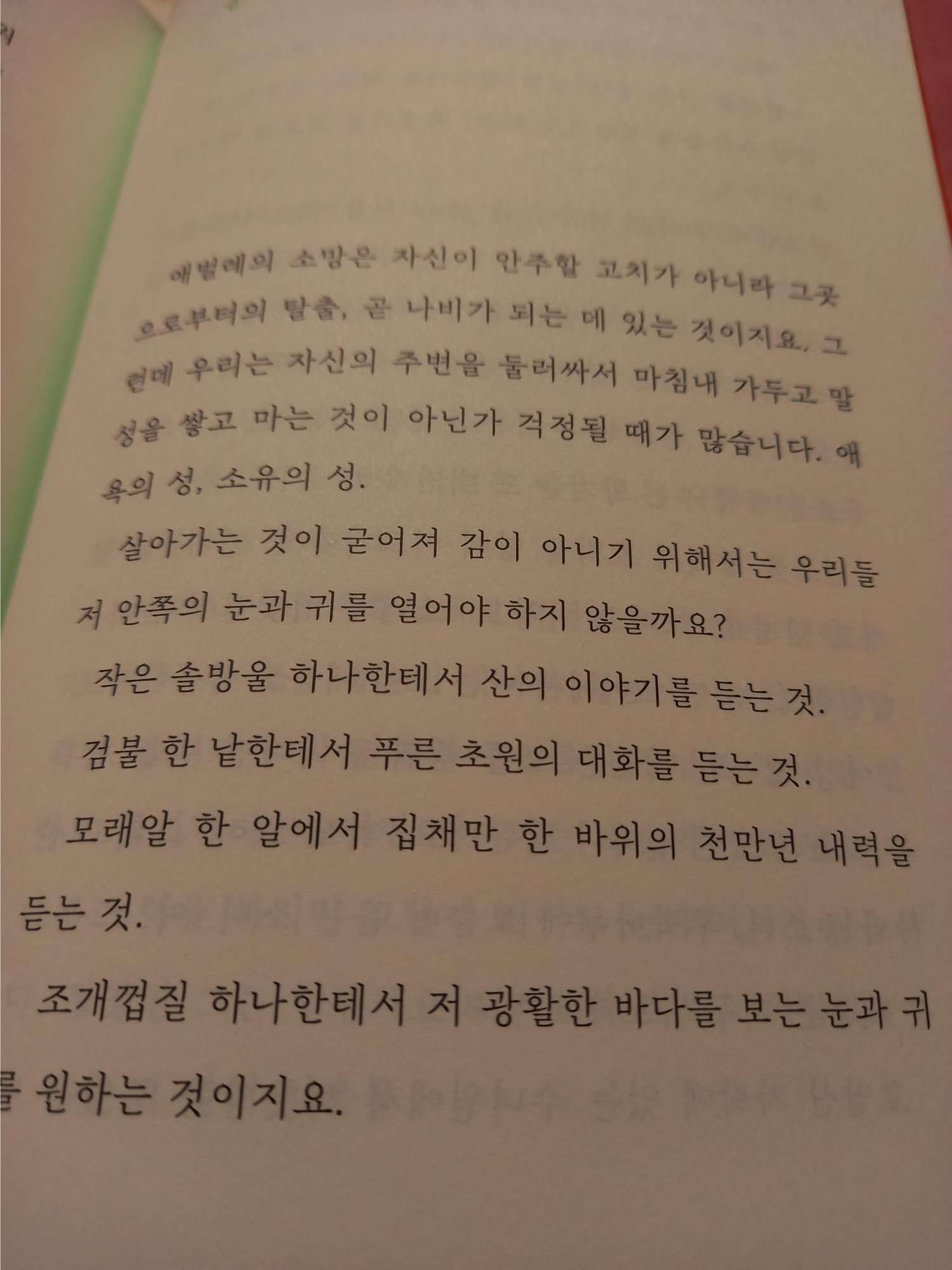
펼치는 장장이 아름답고 포근한 마음의 잔치인데,
특히 제 마음에 와닿던 구절 소개해 봅니다.
(p. 103)
썩어 가는 것에서는 악취가 난다. 특히 숨을 멈춘 동물은 이내 부패하게 마련인데 어찌나 심한지 코를 막고 싶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식물은 다르다. 산풀을 베어 와서 마당가에 널어 본 사람은 기억할 것이다. 산풀의 그 향긋한 향기를.
나무를 잘라도 그렇다...(중략)..루오는 '향나무는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남긴다'는 명언을 남겼지. (중략)
아니, 썩어 가면서 악취 아닌 향내를 풍기는 것들이 있다. 과일이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유자나 탱자, 그리고 모과와 사과가 서서히 썩어 가면서 나는 냄새는 가을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
우리 사람 또한 동물의 몸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들면 악취를 내게 된다.
우리 사람 속의 영혼은 식물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이 세상을 다녀간 분들 중 성인은 스러질 줄 모르는 향기를 남겼지 않은가 말이다.
아아, 아름다운 향기를 지닌 사람이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며 시인을 만나며,
맑은 물에 목욕하는 듯 깨끗해짐을 느낍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에세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