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독일사
제임스 호즈 지음, 박상진 옮김 / 진성북스 / 2023년 1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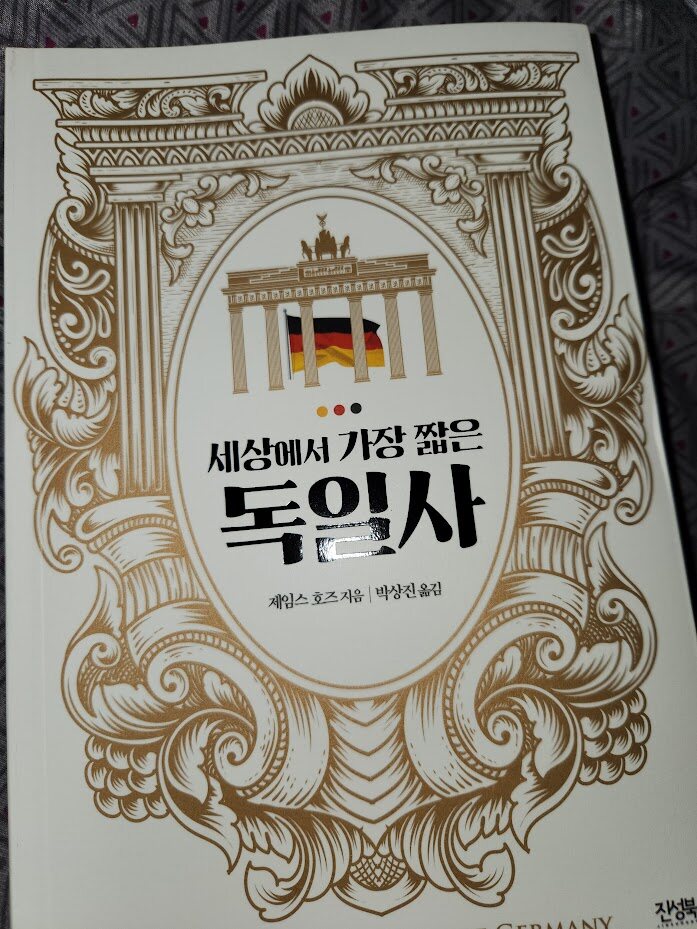
세상에서 가장 짧은 독일사 : 복잡한 독일사를 한 권으로 꿰뚫는 기회
“도이칠란드”의 우리 발음인 “독일”은 닮았고 어감이 거세다.
과거 로마의 역사 속에 게르만족이 등장했을 때의 느낌이 먼 동방의 나라에서 불리는 국가명에도 반영되는 인연은 우연치고는 흥미롭다.
근현대사를 훑어보면 독일과 유사한 느낌의 나라는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다.
비록 1차 세계대전이 결과는 서로 반대의 길을 겪었지만 2차 대전은 같은 전범국으로 패배하였고, 이후 서구열강에 의해 찢기고 탄압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국가의 위기를 현명한 대처로 극복하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5위권 안에서 서로 등위를 다투는 강대국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둘의 가장 큰 차이점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거사에 대해 현재의 국민들이 느끼는 죄책감과 반성은 그들의 유사한 역사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무엇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항상 이방인 취급을 받던 민족과 지리적 특성으로 외세의 침입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국가의 자만심 차이라고 볼 수 있을까?
책 한 권으로 한 국가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학창시절처럼 눈 앞의 시험을 두고 책과의 씨름을 할 수 없으니 역사를 이해하는데 성인들에게는 적합한 방법일 수도 있다.
독일 이전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용병 또는 오랑캐 취급받던 게르만족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켜왔던 우리에게는 꽤 낯선 풍경이다.
특히 독일의 서막을 알리는 토이토부르크 숲 전투는 믿음을 배신한 게르만의 야비함이라는 우리네 정서로 비난도 가능한 역사의 이면이다.
볼모처럼 로마에 보내져 철저하게 그들의 교육방식을 따랐던 아르미니우스가 커다란 패배를 안겨주었을 때 로마인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수준이었다.
역사의 흥미로운 부분은 누구에게는 재앙이었던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승리의 역사로 자랑스러운 국가의 탄생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교회와 국가보다 앞선 왕위혈통의 복잡한 전개와 그들 사이의 암투는 사실 학창시절에도 재미없고 복잡하기만 하다.
독일이라는 나라 하나만 똑 떼서 역사를 살펴볼 수 없는 연계성인 동시에 잠시나마 각 국가의 이합집산을 살펴볼 기회기도 하다.
항상 유럽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러시아가 상황에 따라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되기도 하는 상황은 인접국인 독일의 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1800년대 유럽의 자유를 외치던 혁명이 코 앞까지 닥쳤음에도 러시아의 관계가 꼬이면서 미완의 실패로 남게 되었다. 그 시기 국가에 실망한 마르크스가 자신의 고집스러운 사상을 정리하게 되면서 그 이후 새로운 갈등의 불쏘시개가 되어 지구를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는 결과는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2차 대전 후 분리된 동독과 서독이 사실 분단 이전부터도 생판 다른 성격으로 인해 사이가 썩 좋지 못했다는 점은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프랑스, 영국에 비해 공국들의 난립과 통일 같은 이합집산이 오랫동안 독일이라는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했던 영향이 꽤 오랫동안 지역감정 같은 갈등이 고리로 작용해왔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에서 히어로처럼 등장한 히틀러에 열광하던 당시의 독일인들은 옳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변함없지만 열강의 혹독한 패전책임을 온 국민이 실생활에서 엎어 쓰는 비극에서 탈출하려는 욕망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광기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대의가 되는 프로파간다가 가능했던 이유도 잃어버린 패배감의 정체성을 보상받으려는 심리였다.
냉정의 갈등 속에서 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두 국가에 쏟아 부은 미국과 소련의 원조는 오히려 피폐해진 독일에게는 행운이었다.
항상 두려움을 품에 안고 살게 만드는 국가의 정체성은 악의 촉감을 느끼게 할 지 몰라도 지금 EU에서 -더군다나 브랙시트 상황에서-그들이 리더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은 친분을 유지하고 공동의 목표 속에 독일을 앞장세워야 하는 현실과 역사의 아이러니한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는 사실 그들의 문화만큼 딱딱하다.
의외로 계층 사회가 왕래를 불허했던 폐쇄적인 사회가 우리가 칭송하는 철학이나 문화적 폭발의 이유가 되는 촉발점이 된다는 흐름은 많은 생각을 낳게 한다.
한 번 읽어서는 다소 난해한 역사의 맥락이기에 몇 군데 포스트잇을 붙여 놓고 추가 독서가 있어야 그들의 역사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