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 - 히틀러와 제3제국의 종말》은 1945년 4월 16일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 공격하였을 때부터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지하벙커에서 자살하기까지의 2주 동안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 2주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미쳐가고 있었는지, 파국 앞에서 그들이 보인 광란을 매우 냉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훈의 《남한산성》은 청(靑)에 포위당했던 1636년 12월 14일부터 1637년 2월 2일까지 거의 두 달 간의 기록을 소설로 변형해내고 있다. 그 두 달은 나치의 마지막 두 주보다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가혹하다. 그런데 왜 이들은 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김훈의 소설은 이에 대한 답이기도 할 것이다.
비록 국가의 말들이 허위와 위선 속에서 무력해지더라도 그 국가를 이루는 규준들을 지켜내는 삶, 그런 삶은 진실로 가능한 것일까. 김훈은 남한산성에 갇힌 위정자들의 논쟁의 무력함과 그 공허함이 끝끝내 완전한 공허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신(大臣)들의 논쟁이 그토록 지난했던 것은 이들이 직면한 지금의 시간만을 유일한 문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은 과거라는 긴 시간을 지금의 삶에 연결했고, 이들이 죽어도 남을 긴 미래까지를 지금의 삶 속으로 끌어와 고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때로 비겁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저 전화의 와중에도 ‘쪽박’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실 그들의 논쟁은 비루한 ‘쪽박’을 지켜내려는 일종의 방편이었다. 히틀러와 그 지도부가 파국 앞에서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과거도 미래도 모두 그들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히틀러들은 그들의 모든 정치가 헛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기 때문일 것이다.
…부딪쳐서 싸우거나 피해서 버티거나 맞아들여서 숙이거나 간에 외줄기 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닐 터이고, 그 길들이 모두 뒤섞이면서 세상은 되어지는 대로 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김류는 그 말을 참아내고 있었다.
일은 늘 되는대로 되기 마련임을 알았음에도, 그 삶이 되는대로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밖에 도리는 없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논쟁을 하였는데, 그러한 논쟁을 통해 그들은 되는대로 되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논쟁을 벌였다. 논쟁이 아무리 허위와 허무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논쟁하기는 결국 삶을 놓지 않는 방법임을 김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 삶 전체가 거대한 헛것으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삶을 되는대로 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까지가 이 소설 속에 투영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2002년 전후에 쓰인 〈아들아, 다시는 평발을 내밀지 마라〉는 2007년에 출판된 이 소설의 전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김훈 스스로 세설(世說)이라 부른 이 짧은 글은, 평발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과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무력한 아버지의 내면을 적고 있다. 가장 신성하고 가장 도덕적이라고 일컬어진 병역의 의무가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나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온갖 돈 많고 권세 높은 댁 도련님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허물어졌을 때에도 김훈은 아들에게 군대를 가야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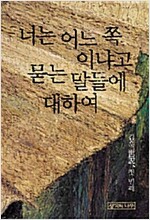
나라를 지키는 일은, 아버지 세대가 늘으면 아들 세대가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 사인(私人)인 아버지가 사인인 아들에게 넘겨주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공적(公的) 아버지와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의 그 울분에 찬 새벽 술자리에 공사간에 어느 아비가 끼어들 수 있겠느냐. 아들아, 나는 겨우 이렇게 말하려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이 못난 나라의 못남 속에서 결국 살아내야 한다는 운명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나라의 쪽박을 깨지 않는 일이라고. 너의 의무는 몇몇 비굴한 이탈자들에 의하여 신성이 모독되었지만, 송두리째 부정단한 것은 아니라고.
너의 어머니에게 다시는 너의 평발을 내밀지 말아라. 아프고 괴롭겠지만, 나라의 더 큰 운명을 긍정하는 사내가 되거라. 네가 긍정해야 할 나라의 운명은 너와 동년배인 동족 청년과 대치하는 전선으로 가야 하는 일이다. 가서, 대통령보다도 국회의원보다도, 그리고 애국을 말하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보다도 더 진실한 병장이 되어라.
그 어떤 아비의 말도 이보다 비굴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아비의 말도 이보다 더 진실되지는 못할 것이다. 김훈은 그 허위, 신성하고 도덕적인 병역의 의무라는 말들의 위선 앞에서, 그것이 비록 허위일지라도 그 허위를 긍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삶이 한낱 '쪽박'일지라도 그 '쪽박'을 부여잡는 일이 삶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김훈의 《칼의 노래》, 《흑산》 등을 비롯한 거개의 소설들은 삶의 끝자락으로 몰린 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칼의 노래》에서 이순신은 왕명 속에 깃든 것들이 헛것임을 알면서도 그 헛것을 놓지 않는다. 삶은 수많은 헛것으로 이뤄졌더라도 그 헛것을 놓지 않는 일이라고, 그 헛것이 끝끝내 헛것으로 스러져 버리더라도 그 헛것을 끝끝내 지켜내는 그 부질없음이 삶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김훈은 그 지독한 허무를, 그토록 담담하게 그려냈던 것이다.
강상, 사직, 종묘 그런 것들 혹은 국가니 의무니 권리니 이 모든 것들이 ‘쪽박’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쪽박’이라고 말하지 않는 일은 그것을 ‘쪽박’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지난하다. ‘쪽박’이라고 말하고 나면 세계는 ‘쪽박’ 이상일 수 없다. 히틀러와 그 지도부의 자살과 광란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모든 가치와 윤리와 도덕이 ‘쪽박’일지라도 ‘쪽박’을 깨지 않는 일, 그리하여 그 ‘쪽박’을 껴안고 살아가는 일, 그것이 삶의 실체이며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살아내는 자의 삶은 무수한 결단과 무수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헛것을 껴안고 헛것의 내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껴안은 헛것이 변함없이 헛것일 수 있도록 지켜내는 자의 삶은 얼마나 가혹한가. 허나 그 가혹함까지도 헛것이라면, 그러한 완고함이 그의 삶을 지탱하여 왔을 것이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면 그 모든 헛것 중의 하나를 부여잡고 사는 일, 그 부여잡음조차도 헛것임을 알고서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은,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신념으로 간직하며 사는 삶보다 더 삶에 밀착된 자세일 것이다. 혁명의 신념이 무력해질 때 혁명가 역시 무력해질 것은 자명하다. 모든 것이 헛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좌절이 발 디딜 틈은 없다. 그러니 그의 허무는 살아가기 위한 허무일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보수도 좌익도 무의미할 것이다.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보수니 좌익이니 따위의 말들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삶은 그 모든 것을 초과하되 삶이라는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단 한 번의 확장도 팽창도 없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저항이며, 복수며, 혁명이다. 그러니 삶은 그냥 삶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