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를 치유하는 부엌 - 삶의 허기를 채우는 평범한 식탁 위 따뜻한 심리학
고명한 지음 / 세이지(世利知) / 2021년 6월
평점 :



나를 치유하는 부엌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저자 : 고명한
어린 시절엔 튀는 것보다 집단 속에 스며들기를 좋아했지만 당연한 것들, 평범한 것들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즐겼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매일 반복하는 먹는 것, 요리하는 것, 일어나고 잠자는 것,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일상의 모든 것들에 의미를 두고 싶었다.
고려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인문학과 음악 심리치료는 학문을 넘어 일상의 의미 부여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삼성물산에서 직장인으로 일할 때도 반복되는 삶에서 ‘다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박사과정 수료 후 숙명여대와 고려대에서 심리학 시간강사로 지내는 동안에는 따스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평생의 직장, 주부로 살아가면서 일상에 의미를 더하고 싶어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렇게 인생의 본질을 궁리하며 블로그에 차곡차곡 적어 넣다 보니 《생활의 미학》과 《어느날 중년이라는 청구서가 날아왔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나를 치유하는 부엌》은 일관성 있게 살아온 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책이다. 자존감, 애착, 긍정, 자기실현 등 따뜻한 집밥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들은 저마다 다르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다. 여전히 새벽 네 시에 눈을 떠 하루를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보낼지 고민하고, 해가 뜨면 부엌으로 가서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차린다. 이 하루가 다채롭고 아름다운 이야깃거리가 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블로그 BLOG.NAVER.COM/BABPOOLK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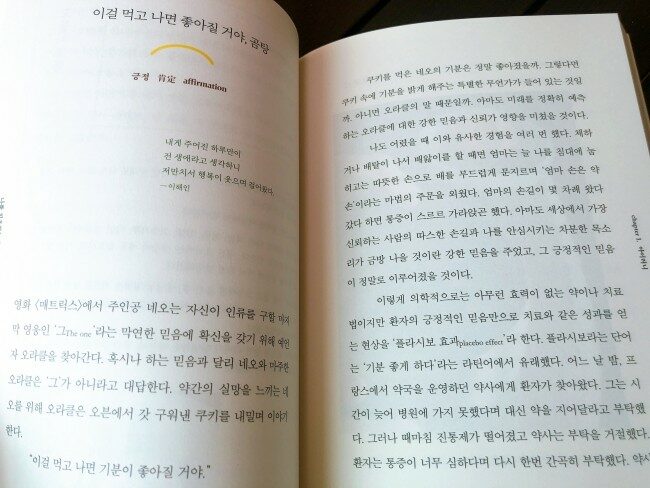

전업주부로 산지 꽤 오랜 시간동안
부엌이란 친근한 공간 안에서 맘껏 유영하며 산다.
칼질도 어설프고 예상치 못한 맛에
인상을 잔뜩 쓰며 먹던 신혼의 어설픈 손맛이
이젠 제법 내 엄마의 손맛을 닮아간다.
이 곳에서 매일 밥을 짓고 산다.
그렇게 부엌에 붙박이처럼 사는 나이지만
많은 위로와 따뜻함이 있는 이 곳이 참 좋다.
그런 사소함이 좋아서 이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평온했다.
이 곳, 이 시간.
내가 있어 더 빛날 수 있는 이 곳이 마냥 좋다.
그 강력함은 엄마의 주문 대로 건강해지겠다는 나의 긍정적인 믿음이 더해진 결과다.
나의 아들 또한 내가 끓인 곰탕과 함께 건강히 자라겠다는 믿음을 먹으며 성장했으리라.
슬며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나는 커다란 들통 가득 곰탕을 끓인다.
그리고 진한 국물을 대접에 담으며 마법의 주문을 걸 듯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한다.
"이 음식을 먹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p95
코로나 사태 이후로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삼시세끼는 집에서 해결하니
아이들도 전보다 더 건강해진 기분이다.
전보다 더 부지런 떨며 도전해보지 못한 숱한 음식들의 레시피를 찾아
좋은 엄마 코스프레에 열심이다.
정수기 물보다 뭐라도 넣어 끓여 먹는 물이 맛있다는 건
아침마다 주전자에 물부터 끓이는 걸 먹다보니
그 심심한 맛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심심한 야식도 뚝딱 만들어 먹고
밤이 되면 조용히 불 꺼진 주방에 앉아
거실에 켜진 조명 아래에서 책을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의 고단함, 내 수고가 참 헛되지 않음을 느낀다.
하루가 다르게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막내의 볼살을 보며
저체중을 걱정하던 때가 아득한 옛 이야기 같다.
그런 뿌듯함이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
음식을 만들고 정성을 쏟은 덕이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울컥해진다.
내가 엄마의 집밥을 항상 그리워하는 것은 허기를 느낀 나의 위장을 달래주려
누구보다 빠르게 부엌으로 달려가던 엄마의 모습에서 더없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오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한다며 귀신처럼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차려내는 눈썰미,
밥숟가락 뜨는 내 모습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무한한 애정,
계절마다 제철 음식을 차려내는 민감함,
모든 것이 엄마의 사랑이었다.
p163
이따금 엄마의 집밥이 그립니다.
친정에 못 가본지가 꽤 오래되다보니
엄마의 손맛이 그리워진다.
내 손으로 분주하게 움직여 차린 음식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지만
정작 냄새 맡고 이리저리 정신없었던 나는 음식을 잘 뜨지 못한다.
편안하게 차려진 정갈한 엄마의 밥상 앞에서
어지러움없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앉아
그저 편히 한 숟갈 뜨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따라 유난히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
엄마의 집밥은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강력한 애착의 연결고리이다.
엄마의 살냄새가 좋아서 매일 밤 엄마 손을 꼭 잡고 자는
작은 아이의 애착처럼
엄마의 손길을 쓰다듬고 싶어하는 내 안의 크지 않은 내가 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밥상이
나에겐 보내는 엄마의 손길이었다는 걸
여러 해 밥을 짓고 살면서 알게 되었다.
그런 강한 유대감이 그릇에 담긴 수북한 밥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교하고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볼 생각에
피곤하지만 좀 더 힘을 내어 본다.
집밥으로 보살펴야 할 내 가족들을 향한
내 무한한 사랑을 오늘도 보여줘야지.
'그거 아니? 너희가 먹는 건 엄마의 사랑이야.'
따뜻한 음식 안에서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이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