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딘가에 두고 온 어느 날의 나에게
최영희 지음 / 채륜서 / 2020년 12월
평점 :



어딘가에 두고 온 어느 날의 나에게

이 책을 살펴보기 전에..
저자 : 최영희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고 베풀며
웃고 웃으며 행복하게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읽고 쓰고 공감하며
무한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묵묵히 용기내어 도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기를
이 모든 것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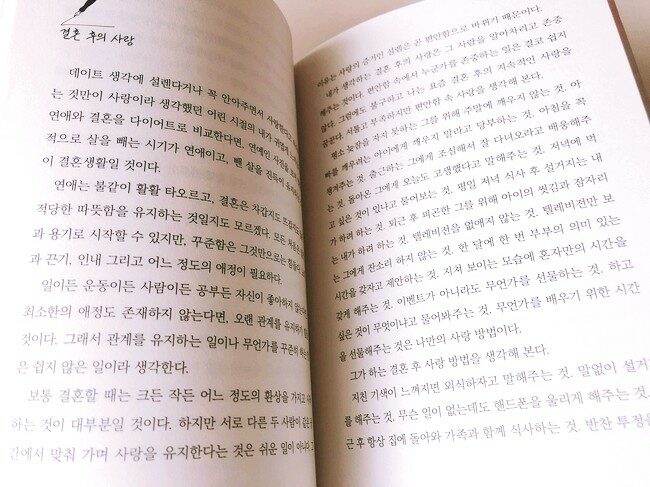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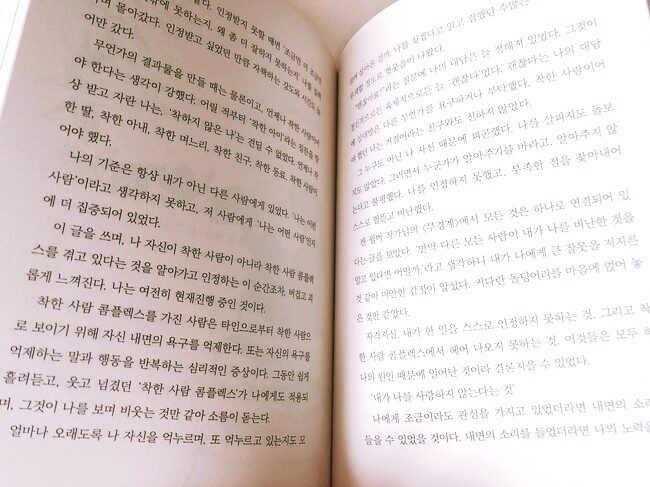
결혼을 하고서 나에게 부여된 역할들이 많아졌다.
그전엔 한 집안의 장녀로 살면서 대단히 그 역할에 큰 비중을 차지할만큼
나에게 주어진 몫이 많진 않아 조금은 내 멋대로 살기도 했던 것 같다.
다만 집안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시점에
뭐라도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좀 더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는 정도로 같이 힘을 내며 살았었다.
결혼하고 두 아이의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면서는
역할적인 부담과 책임 더 늘었다.
그래서 이따금 학창 시절로 돌아가 공부하던 그 때가 맘 편했노라 생각하게 되는 건
몸과 마음이 고단해질 때 생각을 도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
바깥 일로 분주한 남편은 아이 둘을 키우면서
같은 양육자로 책임을 다하지만 집안 일에선 먼 거리에 서 있는 타인처럼 행동했다.
아이가 어릴 땐 그래서 이 문제로 많이 싸웠던 것 같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미련스럽게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혼자 책임지려고 끙끙거리며 열을 올렸기에
가족이란 관계 안에서 혼자 더 스트레스를 끌어올리며 살았던 것 같다.
한마디로 나혼자 여유가 없었고
늘 초짜 티를 내면서 육아에 허덕이며 오랜 시간을 보냈었다.
그럼에도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았던 건
소통할 수 있었던 육아서의 많은 맘들의 이야기 속에서
위로받았던 많은 나날들이 있었기에 천만다행이 아닌가 싶다.
아무리 꼴 보기 싫다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준 사람은 남편뿐이다.
아픈 남편에게 또한 아내인 나뿐이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나 또한 남편의 건강을 찾을 때까지 위하고 또 위해줄 것이다.
마지막까지 곁에 있을 사람은 부모도 아닌, 자식도 아닌 결국은 남편일 테니까.
/p96
잊고 있었다.
남의 편 같으면서도 내 편 같은 남편을.
이따금 생각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금방이라도 토라져버릴 것만 같은 사람이라
내 진심을 다 쏟아내진 못해도 참 고마운 사람이 곁에 있다.
지난 해 반년은 거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일하느라 고생하고 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인 그의 빈자리가
벌써부터 그리워지는 건 아직 의리만큼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재확인하게 된다.
지금은 아이들이 상주하고 있는 이 집 안에서
애들의 비중이 더 커보여 항상 먼저 맘을 쓰고 손을 쓰지만
독립해서 각기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쁠 아이들을 뒤로 하면
내 곁엔 남편만 남게 될 것이다.
또 잊고 있었다.
그렇기에 가장 건강을 챙겨줘야 할 남편이란 걸.
곁에서 오래도록 함께 다투며 살기 위해선
적어도 체력과 건강이 받쳐줘야 하기에 내가 챙겨야 할
남편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만 같다.
남의 편 같아 아주 밉상이 따로 없다며 째려볼 때도 많았지만
결국은 먼저 손을 내밀며 사과하는 사람이었기에
오늘도 넉넉하진 않지만 용서를 허락한다.
마지막까지 함께 할 남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잠깐 잠깐 찾아오긴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란 건 변함없이 마음 안에 있다.
나라는 사람은 혹은 모든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바꿔 쓴다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말이지 않을까.
/p202
어릴 때 글쓰기 대회에 입상하면 받게 되는 주변의 칭찬이 그저 좋아서
매번 욕심을 내기도 했다.
양면의 동전처럼 앞면은 좋은 평가를 받길 바라고 구걸하는 마음과
다른 면에선 완전한 자유함이 없는 마음의 구속이 정말 구역질나게 싫었다.
착한 아이라는 말이 듣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귀를 틀어 막고 싶을 정도로 반항심이 차오르기도 했다.
내 마음에 넘쳐나는 오류의 범위들이 넘쳐나면 통제하기가 겁난다.
그럼에도 비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한 가면 안에 숨기며 살았다.
그렇다 보니 내가 정작 내 모습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며 지내왔다.
나와 가장 친밀해야 할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건 이 때부터였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역할적인 면에서 더 책임져야 할 무게감이 더 커가는 어른이 되면서
내면의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천천히 나를 알아갈 시간을 이제야 조금씩 파악하게 되지만 늦지 않았다라 생각한다.
좀 더 엄마로 나로 살아기 위해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살지만
나와 같은 전우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힘을 얻어
오늘도 책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