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일시집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외 47명 지음, 김정환 옮김 / 자음과모음 / 2019년 8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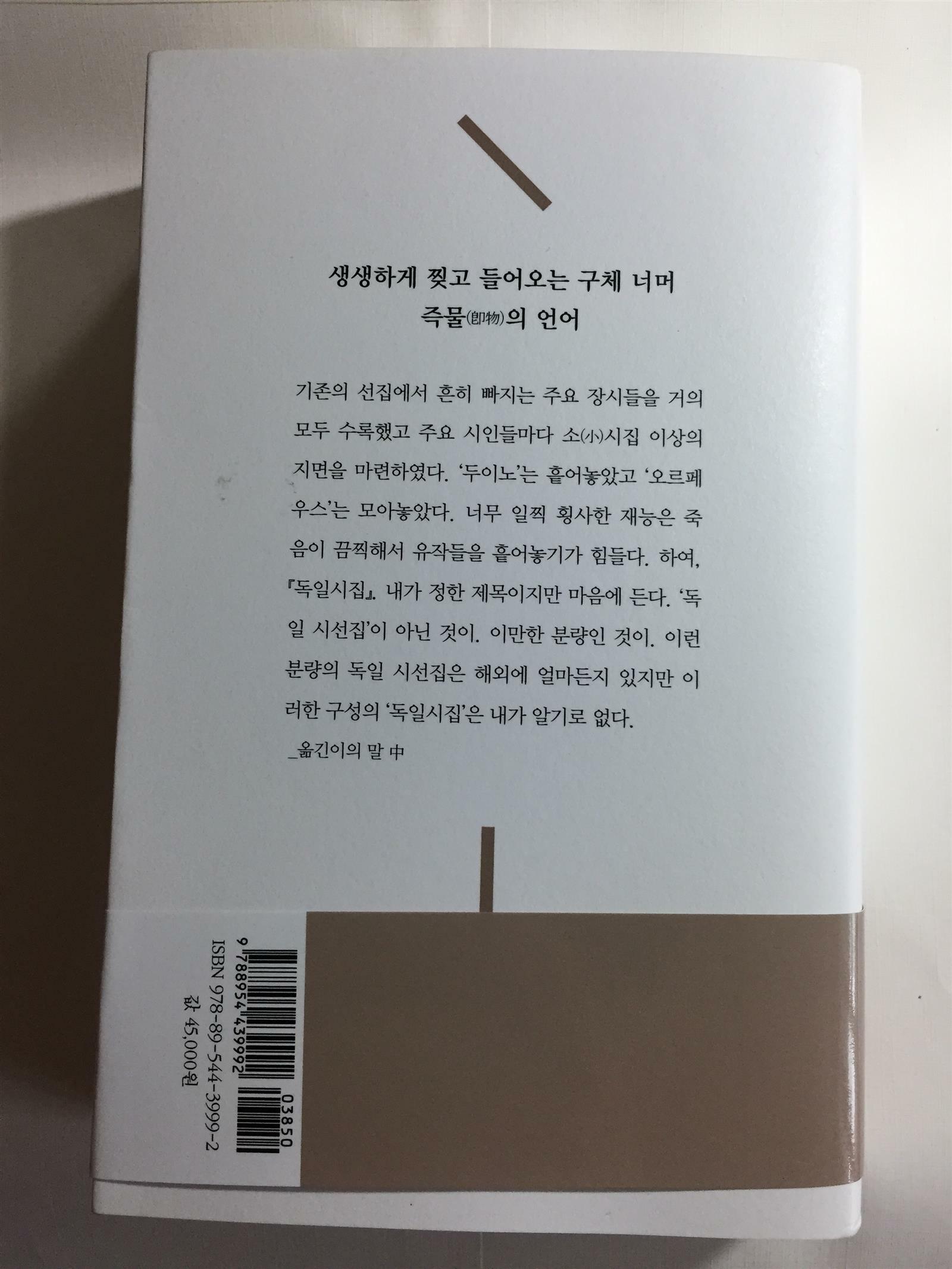
"생생하게 찢고 들어오는 구체 너머 즉물의 언어"
옮긴이의 말
-<독일시집>. 내가 정한 제목이지만 마음에 든다. '독일 시선집'이 아닌 것이, 이만한 분량인 것이. 이런 분량의 독일 시선집은 해외에 얼마든지 있지만 이러한 구성의 '독일시집'은 내가 알기로 없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듣기에, 이 '독일시집'이 지금, 미래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언제나 넘쳐나는 것은 짝퉁이고, 짝퉁 넘쳐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아니고 짝퉁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추신: 색인에서 찾아 읽는 것도 그냥 브라우징도 좋겠으나 고전을 현대적으로 음미하도록(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것만이 고전이다) 후대를 먼저 세웠으니 좋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경험의 다양성의 최대-완료화를 만끽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모든 외국어는 뒤늦게 배울수록 어렴풋한 어떤 느낌을 나잇값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늙어가는 백년대계로 제대로 배울수록 생생하게 찢고 들어오는 구체 너머 즉물의 언어다. 그 점을 살리려 노력했으니 읽는 이들도 그것을 누린다면 번역자로서 그만한 보람이 또 없겠다.
드디어 '자음과모음'에서 아름다운 독일 시 모음 집 <독일시집>이 나왔다.
괴테, 릴테, 트라클, 휠덜린, 게오르게, 호프만슈탈, 모르겐슈테른, 니체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시인이나 그동안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인들까지 한 자리에 모였다.
48명의 시인과 320편의 생생한 시편이라니.
어느 페이지를 펴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독일 시인들의 시가 울림을 준다.
<독일시집>은 시인이자 소설가, 번역가로 활동 중인 김정환 시인이 직접 엮고 옮겨서 더 아름답다.
책의 맨 뒤에 '옮긴이의 말' 있는데 나는 김정환 시인 분이 어떤 느낌과 어떤 사유로 이 책을 엮었는지 궁금해서 시를 읽다가 다시 뒤로 와봤다.
'독일 시선집'이 아니라 이만한 분량의 '독일시집'은 어디에도 없다고 힘 있게 말해주었고 시의 시기별로 후대를 먼저 세워 지금까지 살아남은 고전을 음미할 수 있게 구성해준 것이 고마웠다.
나는 독일어를 잘 모르지만 아마 실린 시들을 읽어보면 독일 원어 느낌도 많이 살릴 수 있게 번역해준 것도 같다.
'즉물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는 독일시집을 차례로 만나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