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빅터 프랭클 - 어느 책에도 쓴 적 없는 삶에 대한 마지막 대답
빅터 프랭클 지음, 박상미 옮김 / 특별한서재 / 202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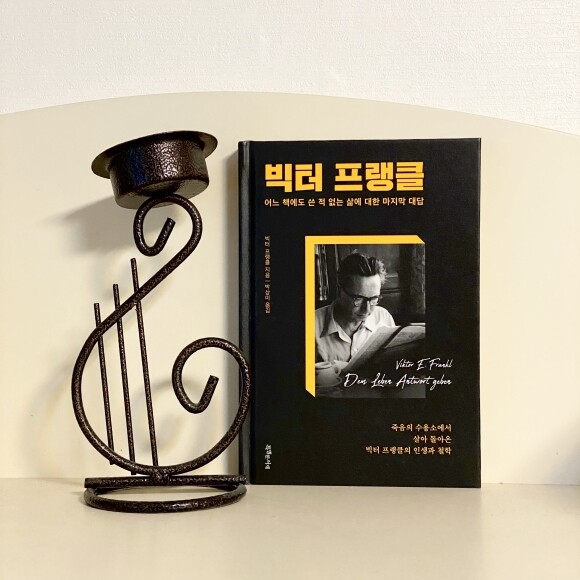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수용소' 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빅터 프랭클이 90세를 맞이해서 쓴 회고록이자 철학 에세이이다.
일반인들조차 90세라는 긴 인생을 한 권의 회고록으로 쓰려면 엄청난 양일텐데, 3년동안 네 군데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내 살아남은 인생에 대한 회고록이라면 아마 몇 권으로 만들어도 모자랄 듯 하다. 그런데 이 책은 페이지수가 200 페이지밖에 안되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평소 나치 시대를 다룬 작품은 영화든, 책이든 항상 관심있는 내용이기에 이번 책도 읽어보게 되었다.
이 책은 아주 큰 테두리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끔찍한 수용소 기간동안 저자 자신의 체험을 통해 창시한 '로고테라피' 라는 심리치료요법이 굉장히 궁금해졌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 자신은 이 요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의미없어 보이고 하찮은 일이라도,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낸다면 극복해낼 수 있다. ' 라는 내용을 담은 이 치료요법은 실제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 한 문장만으로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제로 심리적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큰 힘이 되어질지 정말로 궁금해진 요법이다.
수용소 기간동안 알게 모르게 자신이 살 수 있게끔 도와준(또는 도와주었다고 믿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보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황에서도 살고자 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와 생명력은 상대방에게도 무의식적으로라도 전달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잃지 않는 유머와 긍정적 사고방식이 큰 힘이 되어 준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인간적인 내면, 철학적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는데, 세 살 때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10대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정도로 사고의 깊이가 남달랐던 것을 느낄 수 있다. 부모님과의 유대감도 꽤나 깊었기에 나치 시절 미국으로 망명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부모님 곁에 남는 쪽을 택한다.
책 속에 담긴 이야기들과 인물들을 뒷편에 담긴 사진들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은 참 좋았다. 부모님과 형제들,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첫번째 부인과, 두번째 부인, 저자가 만났던 저명 인사들..이 사진 속 모든 인물들이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항상 이런 역사적인 흑백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지만, 참 아련하고 슬프기도 하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90세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갔던, 사람을 최고로 여기기에 '사람중심'이 아닌 연구를 반대하고, 환자를 정말로 생각하고 아꼈던 '빅터 프랭클' 이라는 인물에 대해 새삼 존경심이 든다.
[ 특별한 서재 출판사에서 제공받아, 자유로운 느낌으로 써 내려간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