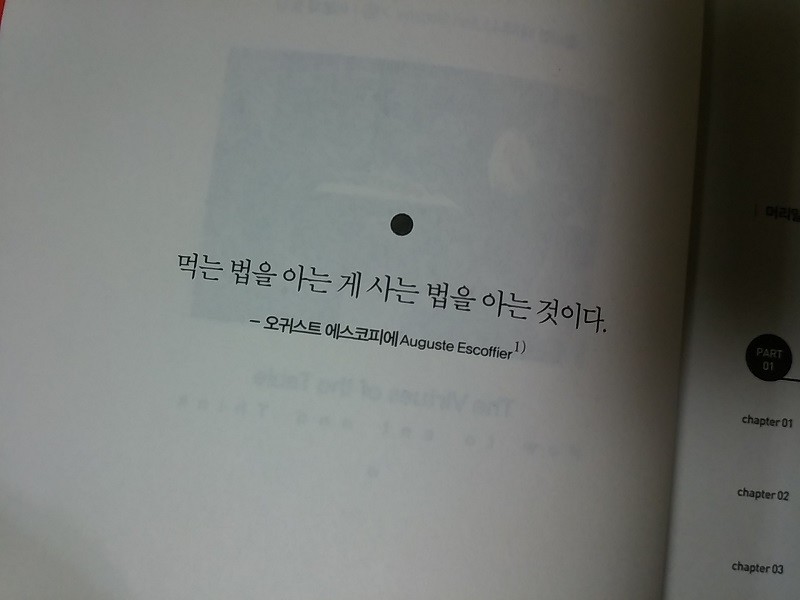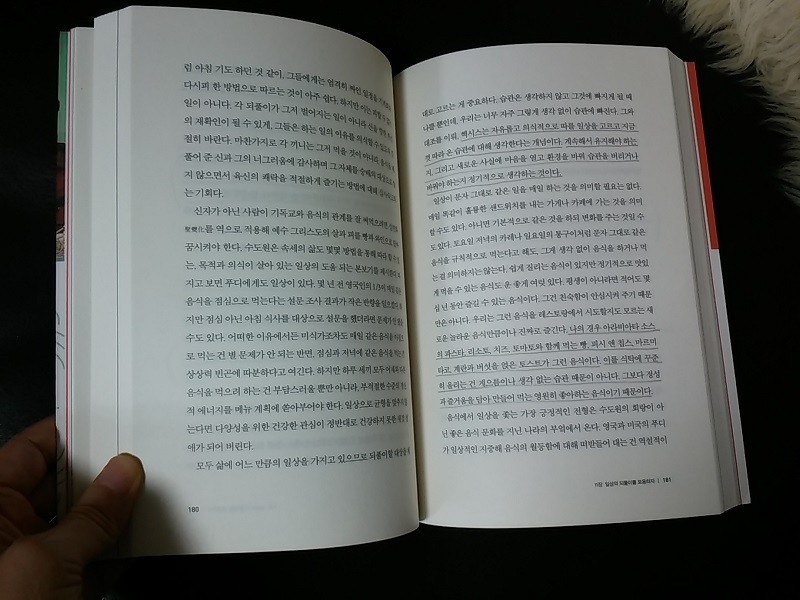
표지도 제목도 마음이 끌리는 책이었다. 식사하는 곳의 안과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배경 풍경을 담은 표지 그림은 그들의 삶과 이야기에 함께하고 싶게 한다. 개인적으로 음식에 대한 책을 좋아한다. 그림책에서부터 교양, 인문 서적, 영화까지도 음식을 다룬 경우에는 일단 열린 마음이 된다. 얼마 전에 아이들과 '식탁위의 세계사'를 읽으며 즐거웠는데 조금 아쉽던 차에 이 책을 읽게 되어 기뻤다.
기대하며 펼쳐든 책, 그러나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일상의 부엌을 철학과 연결시키고, 철학적 해석을 적용하고, 다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다각도로 해석해준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 책의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정신과 육체, 마음과 그리고 한마디로 영혼을 가진 완전한 주체로서 삶의 방법을 모색하자는 도전이다.(10쪽)'라고 밝힌다. '실용성을 지키기 위해 각 장의끝에 특별한 음식에 대한 생각을 레시피의 형태로 포함시켰다. 더 잘 생각하고 살고 먹는 게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 책은 서재나 침대맡, 거실은 물론 부엌에도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11쪽)' 역시 한 번 읽고 덮는 책은 아니다.
각 챕터의 마지막은 레시피로 마무리하는데 '마르미타코'의 설명을 독서실에서 읽다가 우리집 냉장고의 상태를 가늠해보며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려 했었다.
'배려 있는 도살( 연민)'에서는 고난과 고통을 구분하도록 일깨워준다. 고통은 괴롭지만 고난은 그보다 훨씬 더 괴롭다는 것, 고난은 기억에 의존하며 인간은 고통보다 고난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
야생동물들의 야생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더 이상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게 되었다.
'포용력을 갖추자(모호함)'에서는 늘상 매체의 화두가 되고, 대화의 빠지지 않는 관심사이기도 한 프렌차이즈를 다룬다.
지난 주에 '음식 문맹'을 아이들과 읽고는 다큐멘터리 영화 '슈퍼 사이즈 미'의 주요장면을 보며 마무리 했었다. 콜라를 보면 같은 양의 각설탕을 떠올리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다.
'한편 음식에 대해 가장 흔하면서도 게으른 도덕적 체득법은 작은 지역 독립 상점과 음식점은 좋고 프랜차이즈는 나쁘다는 것이다. (112쪽)' 저자는 맹목적 이분법의 논리를 차분히 설명한다.
생각지 못한 새로운 발견을 마주하고 맥도날드를 좋아하고,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을 찾으며 동시에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던 것에서 어느정도는 자유하게 된다.
물론 격렬히 프랜차이즈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수용할 부분도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침 뷔페에 저항하라(인격)'를 읽으며 철학자의 날카롭고 타협하지 않는 물음에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이들과 남편과 발췌독을 하며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책을 이끄는 등대라고 밝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려 깊은 일상의 습관을 기름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나은 삶을 산다고 보았다.(344쪽)'
마지막의 재료 목록에는 인터뷰, 참고도서, 인용된 영화를 실어서 특히, 영화는 찾아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
줄을 치며 읽다 보니 거의 전체에 줄을 치게도 되니 난처했다.
곱씹으며 몇 번이고 다시 펼쳐 읽어보게 될 것이다.
이런 멋진 책을 쓴 저자에게 감탄과 존경을 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