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별하지 않는다 -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 장편소설
한강 지음 / 문학동네 / 2021년 9월
평점 :



2013년 한국 영화 베스트로 이동진 평론가가 꼽은 1위 작품이 오멸 감독의 ‘지슬’이었다. 첨부된 20자평은 ‘어떤 영화는 그 자체로 숙연한 제의가 된다’ 였다. 엊그제처럼 생생하지만 어느덧 십 년이 지났다. 처음 보는 단어는 낯설었고, 진심을 눌러 실은 추천이 영화를 찾아보게 하였다. 떨어진 섬 제주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순간이다. ‘시대의 진실, 영화의 진실’이라는 부제를 단 『지슬에서 청야까지』는 2016년 출간된 윤중목 평론가의 영화평론집이다. 지슬이라는 낱말을 품고 있는 제목을 지나칠 수 없었다. 글로 다시 영화를, 섬과 사람들을 기억해야 했다.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 2021, 332면 분량)』는 노벨상 위원회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제 막 한강을 알게 된 독자가 가장 먼저 읽기를 바라는 작품”으로 꼽은 최근작이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p.9)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 생생한 꿈이 작품 전체를 견인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2014년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소년이 온다)을 낸 이후 악몽은 시작되었다. 작품에서도 소설가로 등장하는 경하는 작가의 분신으로, 자전적인 경험을 기록하며 탈고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고통을 쓴다. 직접 <작별>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마지막 인사일 수는 없다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고 구체화된다.
화자인 ‘나’는 프리랜서 사진가이자 다큐 영화를 찍고, 지금은 목공일을 하고 있는 이십년 지기 친구 인선과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로 했었다. 반복되던 꿈처럼 검은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경하는 중지하겠다고 하였지만 인선은 “어쨌든 난 계속하고 있을 거야.”(p.54)라고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인선의 부름이 도착한다.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는 인선은 당장 제주 집에 가달라고 부탁한다. 지금 당장. “오늘 안에 가면 살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내일은 죽어 반드시.”(p.66) 혼자 남은 작은 새 아마를 살리기 위해 그 길로 떠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간다. 대설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동시에 발효된 섬으로, 중산간 마을이 고립되기 전에 반드시. 여정을 통과하고 집에 도착하고 아마를 보내며 울고 묶고 묻고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후, 경하는 인선이 살아온 날들로 비로소 들어가게 된다. 인선과 인선의 어머니, 그때 그곳에서 사라지던 사람들의 참혹한 시간으로. 인선의 공방에서 촬영했을 인터뷰들, 이 섬의 동굴 이야기를 듣고 전기가 끊긴 집에서 공방과 안채를 오가고, 찾아온 경하와 대화하며 프로젝트 이름도 전한다. “작별하지 않는다”(p.192)라고.
소설은 1부 <새>, 2부 <밤>, 3부 <불꽃>으로 제주 4.3사건의 비극을 기록하고, 기록함으로 작별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실행한다. 작고 가벼운 새, 아미의 죽음에도 눈물이 흐르는데 어쩌자고 그 많은 죽음을 의도하고 저질렀는지 절망한다. 그래서 소설은 고통을 낱낱이 기록한다. 독자는 활자로 기록된 통증과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독한 편두통과 위경련, 잘려나가고 찔리고 얼어붙은 형상, 덤불에 긁혀 흐르는 피와 작고 가냘픈 죽음을 받아든 손, 언 땅 파기, 밀물에 쫓겨 달리기, 옮기기 등 앉은 자리에서 책을 붙든 채 고되고 고되야 한다. 동시에 이 아픈 이야기를 이토록 아름다운 문장으로 쓸 수 있나 놀란다.
작가는 서두르는 일 없이 도처에 일어났던 폭압을 증언하고 엇갈려 배치한다. 꿈과 현실과 영상과 인터뷰와 은유와 직설화법으로 말한다. 폭설과 폭우, 동굴과 구덩이, 삶과 죽음을 연달아 묶는다. 그때 그 눈은 지금 내가 맞는 눈으로 순환하고 그러므로 아픔은 무뎌지는 일 없는 예리함으로 서슬 퍼런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야하고 기꺼이 고통을 끌어안을 때에야 짧게 끊어 쉬는 호흡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가능성을 지닌다. 절단 부위를 바늘로 찌르는 행위, 3분마다 거듭 피를 내는 행위가 있어야, 통증을 느껴야만 잘린 신경 위쪽이 죽지 않는다는 것처럼.
인생들 위 허공에 모든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겹쳐서 내려다보는 듯하다. 과거라는 단어를, 역사라는 자못 젠체하는 얼개를 비웃듯이 응시한다. 지금은 어떤가, 나아졌는가, 나아가고 있는가 묻는다. 작가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연하고 연해서 결코 굳은 살 배기지 못하는 정신으로, 무뎌질 수 없는 감각으로 기억의 집을 견고히 하는구나. 차디찬 바다와 얼어붙는 눈을 통과해 일으키는 불꽃은 지극한 사랑이 아닐 수 없다. 계속 읽어 보겠다.
책 속에서>
두 개의 스웨터와 두 개의 코트로도 막을 수 없는 추위가 느껴진다. 바깥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시작된 것 같은 한기다. 몸이 떨리고, 내 손과 함께 흔들린 불꽃의 음영에 방안의 모든 것이 술렁인 순간 나는 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인선이 즉시 부인한 이유를.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질 거다. 악몽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거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 사 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대로에 선 비무장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쏘았던 화염방사기처럼. 수포들이 끓어오른 얼굴과 몸에 흰 페인트가 끼얹어진 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처럼.(p.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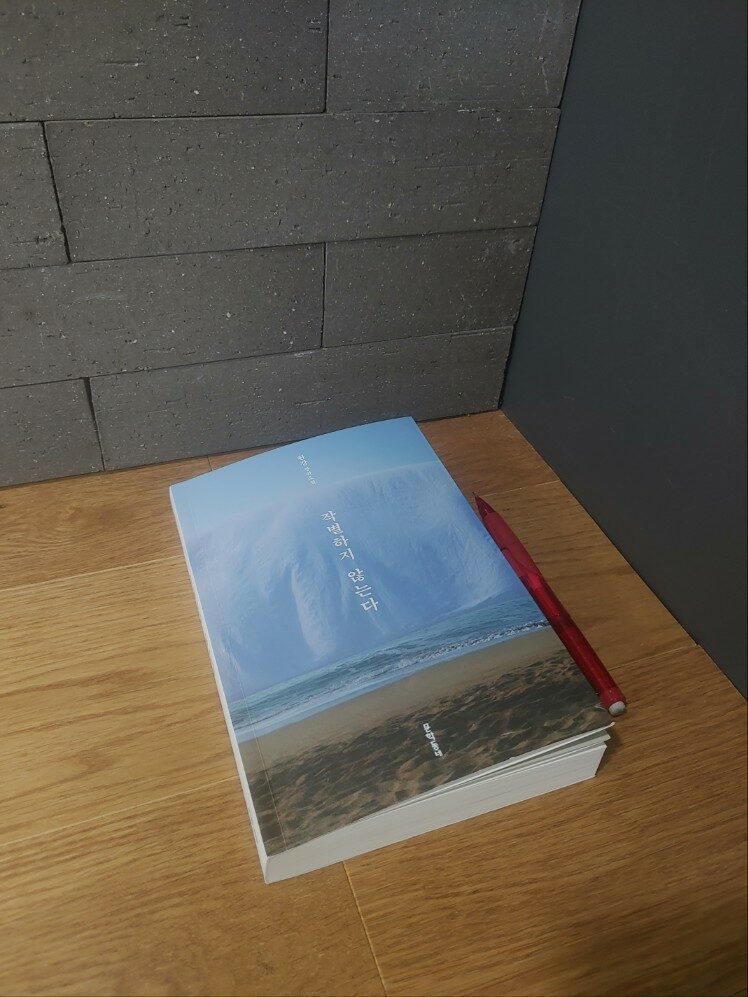
20241120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