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 -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도시디자인 산책
김철 지음 / 조이럭북스 / 2010년 8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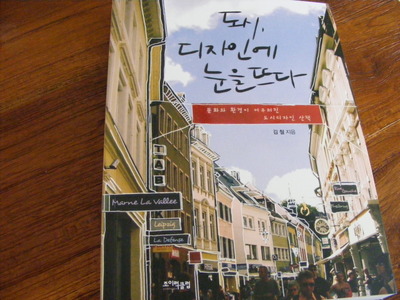
이 책을 소개하기 전 내가 사는곳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은 경상북도 꼬리에 해당하는 포항이다. 포항은 역시 공업도시라서 복잡한 시가지, 통일감없는 건물들이 즐비하다. 결혼 전까지 번화스러운 곳에서 살다가, 아이를 낳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가리라 마음먹은 뒤로 결혼 2년 만에 내집마련을 해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환경. 내가 사는 이곳은 산이 가까이 있고, 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바로 옆에는 스틸하우스 단지가 있고, 방범이 잘 되어 있는 곳. 거리에 나가보면 차는 골목에서는 대부분 서행하며, 사람이 건너갈려고 하면 거의 다 멈춰선다. 학군이 좋아서 20년 전부터 이곳은 환경적으로 우수한 곳이고, 포스코의 도움으로 환경조성이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문화공연이 있는 센터가 있어 영화와 뮤지컬 연극등을 자주 볼 수 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여기저기 잔디밭이다. 체육공원에 가서 노는 시간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집 아이들은 이곳에 이사온 이후로 한달에 한번 하던 감기도 이별했다. 잦은 감기로 몸과 마음이 힘들던 나도 공기좋은 이곳으로 이사온 후로 정신적으로도 맑은 나 스스로에 기분이 좋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된 습관으로 분리수거도 철저히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은 날짜에만 하고, 강아지 산책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는 건 필수. 마주치면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건 머리하얀 백발 노인부터 말 시작하는 아이까지 똑같다.
사람들은 서서히 녹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나 역시 시내가 바로 옆인 곳이 살기 좋은 곳이라더니, 아이 엄마가 되어 조금 거리감이 있어도 푸르름이 있고 깨끗한 곳으로 찾아들었다. 가끔 시내를 나간다고 걷다보면 빽빽하고 통일감 없는 집들이 안타깝다. 차라리 경주처럼 한옥이라도 늘어서있을 것이지......한국적이지 못한 이 모습은 도데체가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얼마전 남편의 독일 출장. 독일의 녹색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왔다. 천장 가까이 찍어온 사진으로 프라이부르크를 만나본 터였지만,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에서 찬찬히 소개해주는 글과 마주하니 더욱더 프라이부르크를 직접 한번 보고 싶어졌다. 오랜 시간동안 프라이부르크는 녹지와 함께하는 도시로 성장했다. 독일인에게 차를 팔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전거를 사랑하고 걷기를 좋아한단다. 골동품 자동차가 궁금하다면 독일로 가라. 자동차 옆문이 위로 뚜껑드는 형태라니...... 남편은 넋을 놓고 봤다고 한다. 여기저기 녹색. 숲속에 집들이 있는 것과 같단다.

이 페이지의 집! 남편 출장 후 사진을 보면서 설명들었던 그 집이다. 건축가가 직접 설계해서 지은 회전식 태양열건축물. 태양의 빛을 따라 집이 회전한단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곳곳에 태양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구조물들이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없이 되어있으며, 자전거도로에는 정말 사람이 걸어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주택들은 단열을 위해 서로의 담벽을 붙여서 지어놓고, 집의 지붕까지도 제한을 걸어놓는다. 게다가 주택가에 들어선 차들은 시속 30km이상은 절대 금물.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 시민의식에 또한번 감탄할 일이다. 어린 아이들부터 자연에 대한 교육과 관람을 아낌없이 지원하며, 환경연구단체가 스스로 수없이 생겨난다고 한다. 연구자와 시민간의 거리감은 점차 좁혀지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속에 프라이부르크는 세계 제일의 녹색도시가 되었다.
프랑스와 독일등의 유럽국가의 도시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도시디자인의 현주소를 찾아본다. 성급함은 금물. 늦었다고 생각될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우리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녹색성장에 발맞춰가야 할 것 같다. 국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자와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구상하며 그들의 계획에 우리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누가 먼저랄 것이 없는 함께하는 녹색성장이여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야 하는 곳은 도시다. 빌딩만 가득한 것이 도시라는 정의가 없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도시를 디자인해 보는 것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