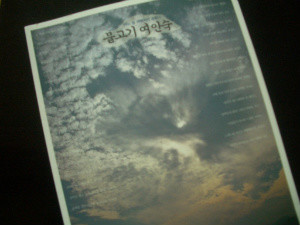
어릴적 서해안 가까이에 살고 있던 괸계로 여름휴가지는 무조건 인근 섬이였다. 그렇다고 바닷가에 살았던 것은 아니기에 버스타고 연안부두에서 출발하는 배편을 놓치지 않기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잠에서 덜깬 눈을 비벼가며 며칠 전부터 식구수 대로 바리바리 싸놓은 짐보따리를 하나씩 둘러메고 당최 줄어들 것같지 않은 줄의 끄트머리에 자리잡고 졸며 기다려야만 했다. 그렇게 극성을 떤 덕분에 왠만한 섬들은 모두 가보았다. 최근에 가본 섬은 어릴적 기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내 기억을 의심하게 만들엇다. 배를 대기조차 어려워 작은 낚시배에 옮겨타고 경운기로 한참을 털털거리며 비포장 도로를 달린 끝에 만난 청정 해역은 천상낙원과 다름 없엇거늘. 길에서 새벽잠 설치며 고생한 보상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기에 우리가족은 다신 섬에가지 말자고 다짐해 놓고선 중독처럼 다음헤에도 어김없이 섬을 향해 영어가 회귀하듯 꾸역꾸역 짐을 싼다.
14년간이나 국내외 오지를 떠돌던 이용한 시인이 섬에 매료되 매번 섬을 찾았던 감동을 고스란히 담은 그의 여행 에세이 <물고기 여인숙>을 읽으며 그의 마음을 알수 있음은 나 또한 몸은 여기 육지에 메여 있어도 섬이 그립기 때문이다.
오래 섬을 떠돈 자에게 바다 냄새는 환각과 같다. 때때로 끈적끈적하고 뭉개진 듯해서 만져질 것만 같은 이 냄새에 취해 나는 무던히도 배를 탔다. 생각해보면 바다 냄새는 단순히 바다에서 나는 것만이 아니었다. 갑판에 칠이 벗겨진 오래된 페인트 냄새며, 섬사람들의 살냄새와 차도선 바닥의 착 달라붙은 생선 비린내 따위가 적당히 버무려진 야릇한 냄새가 바로 바다 냄새였다. 그리고 이 냄새는 종종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골방까지 따라 들어와 불쑥불쑥 나의 후각을 자극하곤 했다. 어떤 날은 신발장에 고이 넣어둔 신발에서 그 냄새가 났고, 카메라 가방 속의 렌즈 후드에서도 그 냄새가 났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또 나는 섬으로 가기 위해 짐을 꾸리곤 했다.
(/ p.23)
청산도, 증도, 우도, 울릉도, 독도 등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섬들과 도초도니 낙월도, 추자도, 횡간도 등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일반인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포함한 엄연히 우리나라에 적을 둔 서른네 개의 섬들을 담고 있다. 마음은 그곳으로 가고 싶지만 푸른 바다를 담은 사진만으로도 가슴속이 다 시원해져 온다.
저자는 여느 관광객들과는 달리 섬의 숨겨진 속살을 들춰내 보이며 숨은 비경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뭍에서는 볼수 없는 섬만의 고유한 문화와 섬사람들의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와 그곳 사람들의 살가운 정이 전해져 온다.
저자는 특히 섬에서는 며칠씩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초분에 조상을 모셨다가, 상주가 돌아온 후에 정식으로 다시 장례를 치르는 초분이라는 섬 고유의 매장 풍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출어를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 부모의 주검을 볼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초분에 모신 주검은 3년 정도 두었다가 뼈만 가려 추려서 다시 이장을 했으나, 선산이 없거나 이장 비용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는 몇 십 년씩 초분을 유지하기도 했단다. 초분에 대한 저자의 남다른 애정으로 시작한 섬 여행이였다고 털어 놓는다. 자꾸만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소중한 우리나라 섬문화를 기록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는 달리 섬을 여행하면 할수록 기록에 대한 목적의식이나 강박감은 느리게만 가는 섬사람들의 시간을 닮아 그곳 시계를 따라 느리게 바뀌게 되었다. 섬만이 가진 느림의 미학과 때묻지 않은 풍광이 섬을 찿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그는 말한다.
금일도에서 처음 만난 잘피밭, 그게 금일도 사람을 먹여 살린단다. '진저리'라고도 불리는 잘피는 밀물에는 잠겨 있다가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며 펄 속에 뿌리를 내려 바닷속 모래의 침식과 씻겨나감을 막고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정화해 바다의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을 막아준단다. 금일도 주민들은 이 잘피밭에서 청각을 채취해 살아가니 잘피가 갯벌을 보살피고, 질 좋은 청각을 키워내니 분명 사람들은 질피 덕을 톡톡히 보는거다.
민퉁선 지역의 볼음도도 아직 못가본 곳중 하나다. 배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주민들이 갯벌에서 갯것을 채취해 생계를 연명한다. 볼음도 갯벌은 전 세계 1,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의 서식지로도 알려져 있다. 소금섬이라 불리는 증도에서 염전을 일구는 사람들의 모스을 볼 수 있고, 새우잡이가 한창인 임자도 전장포구와 아직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는 곳 하태도, 우도, 추자도 등을 소개하며 힘든 물질로 해녀들의 수는 감소하고 지금의 그녀들이 아마도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른다는 안타가운 마음에 울적해진다. 사람들의 손을 타고 자연이 훼손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선 여전히 자연에 의탁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삶이 있다
노란 유채게 흐드러지게 핀 청산도와 상조도 도리산전망대, 거문도 드대길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며 바람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아름다운 여서도 돌담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직접 그가 찍은 사진들은 그곳에 가고픈 마음의 불을 당기기에 충분하다, 굳이 푸르스트의 말이 아니여도 어린시절 추억이 비릿한 바다내음과 함께 떠올라 가슴이 아릿해져 온다. 지금은 함께 할 수 없지만 소중한 추억을 내게주신 돌아가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 섬의 풍경 한 귀퉁이를 적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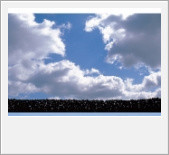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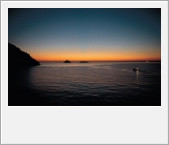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