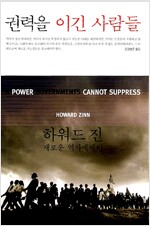 몇년동안 소설로 도배를 한 도서목록에서 올 한해는 인문서적과 과학서적이 꽤 자리를 많이 차지한 해였다. 생전 처음 나라걱정으로 몸살을 앓으며(아직도 골골골) 들여다 본, 지근지근 골머리를 썩게 한 인문학 서적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왼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책이다. 촘스키의 책을 읽다가 하워드 진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라는 이야기를 듣고 샀지만, 평상시 내 독서습관처럼 책만 사다만 놓고 읽지는 않고 있었다. 우연히 한참을 뭘 읽을까로 책장을 서성이다가 함, 이 책이나 읽어볼까하고 집어들었다가 단숨에 읽어내려간 책이었다. 하워드 진, 1922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왼편에 서서 기득권력과 맞서 싸운, 20세기 미국 투쟁의 산 증인이자 행동가이다.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인종 편견, 반전운동과 같은, 신념이 없다면 뒷걸음칠 수 밖에 없는 역사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그의 힘찬, 때론 지친 발걸음을 따라, 걸어간 지난 역사의 길을 쫓아오르다보면, 프레이저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권력자에 의한 역사가 아닌, 여러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 역사의 큰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의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역사 서술 방식이었고 , 그의 진솔하고 신념에 찬 그의 글귀 하나하나가 울림으로 다가왔다.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미국사회에서 그의 50여년간의 좌파적 행보가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그리고 가슴 벅찬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인지 이 한권의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
몇년동안 소설로 도배를 한 도서목록에서 올 한해는 인문서적과 과학서적이 꽤 자리를 많이 차지한 해였다. 생전 처음 나라걱정으로 몸살을 앓으며(아직도 골골골) 들여다 본, 지근지근 골머리를 썩게 한 인문학 서적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왼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한 책이다. 촘스키의 책을 읽다가 하워드 진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라는 이야기를 듣고 샀지만, 평상시 내 독서습관처럼 책만 사다만 놓고 읽지는 않고 있었다. 우연히 한참을 뭘 읽을까로 책장을 서성이다가 함, 이 책이나 읽어볼까하고 집어들었다가 단숨에 읽어내려간 책이었다. 하워드 진, 1922년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왼편에 서서 기득권력과 맞서 싸운, 20세기 미국 투쟁의 산 증인이자 행동가이다. 수백년 동안 이어져 내려 온 인종 편견, 반전운동과 같은, 신념이 없다면 뒷걸음칠 수 밖에 없는 역사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다. 그의 힘찬, 때론 지친 발걸음을 따라, 걸어간 지난 역사의 길을 쫓아오르다보면, 프레이저의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권력자에 의한 역사가 아닌, 여러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작은 변화를 만들어 역사의 큰 변혁을 가지고 올 수 있구나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의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역사 서술 방식이었고 , 그의 진솔하고 신념에 찬 그의 글귀 하나하나가 울림으로 다가왔다.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는 미국사회에서 그의 50여년간의 좌파적 행보가 얼마나 용감한 것인지 그리고 가슴 벅찬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인지 이 한권의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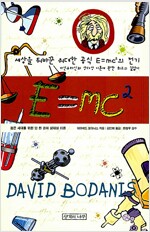 올해 적지 않는 과학서적을 읽었지만, 이 사람만한 입담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있다면 사이먼 싱정도.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정확하게 왜 그가 천재인지, 그리고 그의 이론이 어떻게 응용,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에너지와 질량을 연결시킨, 그의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라는 명제가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가 아주아주 재밌게 설명되어 있다. 초반에는 아인슈타인과 고전물리학자들 그리고 원자폭탄이 탄생하기까지 관여한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리 이론만 휜하게 꿰뚫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의 사생활(스캔들)까지 양념으로 언급하면 책에 손을 못 떼게한다. 이 책을 계기로 데이빗 보더니스의 나머지 책들도 읽었는데, 보더니스의 방대한 지식의 양과 수다스러운 그의 입담이 어우러져 과학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자 하나 나왔으면.... 과학서적을 읽으면서 참고할만한 글이 없나 해서 찾다가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최무영교수의 물리학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최무영교수는 보더니스의 입담만 못했다. 하지만 그의 책은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이해와 쉬운 설명으로 물리학 입문서로 최고!
올해 적지 않는 과학서적을 읽었지만, 이 사람만한 입담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있다면 사이먼 싱정도. 아인슈타인이 천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정확하게 왜 그가 천재인지, 그리고 그의 이론이 어떻게 응용, 적용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빛의 속도를 이용해서 에너지와 질량을 연결시킨, 그의 에너지는 질량과 같다라는 명제가 원자폭탄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이야기가 아주아주 재밌게 설명되어 있다. 초반에는 아인슈타인과 고전물리학자들 그리고 원자폭탄이 탄생하기까지 관여한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리 이론만 휜하게 꿰뚫고 있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의 사생활(스캔들)까지 양념으로 언급하면 책에 손을 못 떼게한다. 이 책을 계기로 데이빗 보더니스의 나머지 책들도 읽었는데, 보더니스의 방대한 지식의 양과 수다스러운 그의 입담이 어우러져 과학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과학자 하나 나왔으면.... 과학서적을 읽으면서 참고할만한 글이 없나 해서 찾다가 프레시안에 연재했던 최무영교수의 물리학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최무영교수는 보더니스의 입담만 못했다. 하지만 그의 책은 물리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이해와 쉬운 설명으로 물리학 입문서로 최고!
 다 큰 어른이 주책이지 무슨 만화책이야 하겠지만, 이 책 한번 읽으면 웃겨서 뒤집어지게 될 거다.(흠흠, 울 올케는 언니, 이 책 별로예요라고 말했지만!) 애아빠가 툭하면 아직도 니, 나이에 만화를 보니,하며 비웃더니만, 화장실 들고가서 읽고 나서는 이 만화책 열렬팬이 되더라. 지금은 투니버스에서 하지 않지만 몇 년전에는 아즈망가 대왕 방영했었다. 그 땐 이 만화의 진가를 몰라, 몇 번 보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애니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 정도로 난 그녀들의 왕팬이 되어버렸다. 아, 오사카 그녀의 생뚱맞은 띨띨함이 넘 좋아 좋아~~~
다 큰 어른이 주책이지 무슨 만화책이야 하겠지만, 이 책 한번 읽으면 웃겨서 뒤집어지게 될 거다.(흠흠, 울 올케는 언니, 이 책 별로예요라고 말했지만!) 애아빠가 툭하면 아직도 니, 나이에 만화를 보니,하며 비웃더니만, 화장실 들고가서 읽고 나서는 이 만화책 열렬팬이 되더라. 지금은 투니버스에서 하지 않지만 몇 년전에는 아즈망가 대왕 방영했었다. 그 땐 이 만화의 진가를 몰라, 몇 번 보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애니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할 정도로 난 그녀들의 왕팬이 되어버렸다. 아, 오사카 그녀의 생뚱맞은 띨띨함이 넘 좋아 좋아~~~
 이 그림책의 색감은 무지 촌스럽다. 하악하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촌티나서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책이었다. 하.지.만. 이 책 읽고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림책은 이야기가 재밌을 수도, 말이 재밌을 수도, 그리고 그림이 이쁠 수도, 글과 그림이 딱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조화로울 수도, 그림이 아름다워 글을 압도할 수도, 이것저것 다 평범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작가의 작품이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어주었지만. 이 책만큼 발화가 오케스트라적인 작품은 없었다. 중국의 대륙적인 기질을 그대로 물려 받아서 그런가. 읽으면서 웅장하고 비장미 넘치는 작품이었다. 아이들도 처음엔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읽어주면 분위기가 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이 멋지니깐 나중에 그림도 이뻐보이더라는. 그림에 속지 마시길, 이 작품만큼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다 가슴이 미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그림책의 색감은 무지 촌스럽다. 하악하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촌티나서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책이었다. 하.지.만. 이 책 읽고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림책은 이야기가 재밌을 수도, 말이 재밌을 수도, 그리고 그림이 이쁠 수도, 글과 그림이 딱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조화로울 수도, 그림이 아름다워 글을 압도할 수도, 이것저것 다 평범할 수도 있다. 이 책은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작가의 작품이다. 지금까지 많은 책을 읽어주었지만. 이 책만큼 발화가 오케스트라적인 작품은 없었다. 중국의 대륙적인 기질을 그대로 물려 받아서 그런가. 읽으면서 웅장하고 비장미 넘치는 작품이었다. 아이들도 처음엔 반응을 안 보이다가 읽어주면 분위기가 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글이 멋지니깐 나중에 그림도 이뻐보이더라는. 그림에 속지 마시길, 이 작품만큼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소리내어 읽어주다 가슴이 미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나도 오기가 있어 찌라시 관련 출판사책들은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책은 너무 잘 나와서 사 버렸다. 갠적으로 교육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는 나지만, 나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정도는 있다. 난 아이들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신론자와 좌파로 자랐으면 좋겠다. 한때나마 천주교 신자였지만 신의 존재에 많이 망설였었고 흔들이고 있던 차에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난 신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다. 지구위에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핏빛 자오선을 보면서, 신의 이름이란 권력자들이 실컷 우려먹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짓거리도 이제 싫증날만한데....참 잘도 지금까지 써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진화의 흔적을 발견하고 발표한 논문을 따라, 아이들 7명이 다윈의 행적을 쫓아가는 논픽션 글이다. 아주 짜임새 있고 글도 재미나다. 울 아들 이 책마자 읽어달라고 해서...하루에 못 끝내고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주고 있는데, 읽으면 이래서 하느님은 없는거야를 후렴구처럼 쇄뇌시키고 있다. 나중엔 지들이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사실 나도 오기가 있어 찌라시 관련 출판사책들은 안 사려고 했는데, 이 책은 너무 잘 나와서 사 버렸다. 갠적으로 교육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는 나지만, 나도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주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정도는 있다. 난 아이들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신론자와 좌파로 자랐으면 좋겠다. 한때나마 천주교 신자였지만 신의 존재에 많이 망설였었고 흔들이고 있던 차에 리처드 도킨스의 책들을 몇 권 읽으면서, 난 신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다. 지구위에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핏빛 자오선을 보면서, 신의 이름이란 권력자들이 실컷 우려먹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짓거리도 이제 싫증날만한데....참 잘도 지금까지 써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다윈이 갈라파고스에서 진화의 흔적을 발견하고 발표한 논문을 따라, 아이들 7명이 다윈의 행적을 쫓아가는 논픽션 글이다. 아주 짜임새 있고 글도 재미나다. 울 아들 이 책마자 읽어달라고 해서...하루에 못 끝내고 하루에 한 챕터씩 읽어주고 있는데, 읽으면 이래서 하느님은 없는거야를 후렴구처럼 쇄뇌시키고 있다. 나중엔 지들이 믿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나 한다.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왜 이거밖에 못 쓰지,하는 생각은 이런 짧은 글을 쓸 때조차한다. 머리 속에 많은 단어들이, 문장들이 오가지만 막상 글을 쓰면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는다. 뒤죽박죽, 왜 난 요거 밖에 안되는 거야라는 열등의식이 수십번도 더 나를 옥죄이곤 했는데, 올 초 이 책 읽고 그런 생각 관두기로 했다. 존 어빙은 이야기의 층이 많은 작가이다. 이 가아프도 여러 층의 이야기가 쌓이고 겹쳐 있는데, 이 책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었다. 여기 등장하는 세명의 사람 주요 인물들은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독서 형태나 책 읽는 방식을 서술한 대목은 살짝 들뜨게 할 정도로. 특히 가아프의 母와 아내 헬렌의 집요한 독서 행위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누구나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글을 잘 써 작가가 되지만 어떤 이는 작품의 진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집인이 되거나 어떤 이는 문학과 관련된 직업인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는다라는 길은 한 길이지만 결국 자신이 나아갈 길은 여러 형태의 길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고, 책을 읽고 나서 후의 재능은 각자의 몫인 것이다.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 존 어빙의 이 책은 나의 글쓰기에 열등 의식을 어느 정도 가시게 한 책이었다.
나는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나 한다.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왜 이거밖에 못 쓰지,하는 생각은 이런 짧은 글을 쓸 때조차한다. 머리 속에 많은 단어들이, 문장들이 오가지만 막상 글을 쓰면 논리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는다. 뒤죽박죽, 왜 난 요거 밖에 안되는 거야라는 열등의식이 수십번도 더 나를 옥죄이곤 했는데, 올 초 이 책 읽고 그런 생각 관두기로 했다. 존 어빙은 이야기의 층이 많은 작가이다. 이 가아프도 여러 층의 이야기가 쌓이고 겹쳐 있는데, 이 책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었다. 여기 등장하는 세명의 사람 주요 인물들은 많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독서 형태나 책 읽는 방식을 서술한 대목은 살짝 들뜨게 할 정도로. 특히 가아프의 母와 아내 헬렌의 집요한 독서 행위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누구나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글을 잘 써 작가가 되지만 어떤 이는 작품의 진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편집인이 되거나 어떤 이는 문학과 관련된 직업인 교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책을 읽는다라는 길은 한 길이지만 결국 자신이 나아갈 길은 여러 형태의 길이 갈라져 있다는 말이고, 책을 읽고 나서 후의 재능은 각자의 몫인 것이다. 이런 작은 깨달음에서 존 어빙의 이 책은 나의 글쓰기에 열등 의식을 어느 정도 가시게 한 책이었다.
 베스트셀러 책은 소설이든 그림책이든 쟝르불문하고 관심없어 윔피키드 무시하려고 하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만화스탈이어서 읽은 책인데, 베스트셀러에 대한 푸대접으로 한버텨면, 좋은 작품을 놓칠 뻔 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그레그가 많은 아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이너 인생의 버티기라고 해야하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그레그같이 약하고 기운없고 어리버리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세상살기에 묘안을 가지고 있고 그 묘안이 어떤 경우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다. 불평등한 시상에 태어난 오발탄이기는 해도, 다른 누구가에는 소중한 사람이므로.
베스트셀러 책은 소설이든 그림책이든 쟝르불문하고 관심없어 윔피키드 무시하려고 하다 일단 내가 좋아하는 만화스탈이어서 읽은 책인데, 베스트셀러에 대한 푸대접으로 한버텨면, 좋은 작품을 놓칠 뻔 했다.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그레그가 많은 아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마이너 인생의 버티기라고 해야하나.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그레그같이 약하고 기운없고 어리버리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세상살기에 묘안을 가지고 있고 그 묘안이 어떤 경우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일 것이다. 불평등한 시상에 태어난 오발탄이기는 해도, 다른 누구가에는 소중한 사람이므로.
 여전히 2008년에도 일본 소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줄기는 쭉쭉 잘 뻗어나가지만 캐릭터에 대한 구체화는 언제나 실망스러워, 이젠 일본소설은 그만 읽어야지 했더랬다. 피츠제럴드의 캐츠비같은...... 한 시대를 꿰뚫고 대변하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 일본소설의 약점이다. 이야기의 아이디어 재밌고 시간 떼우기에 그만이어서 읽긴 하는데, 비슷비슷한 성격의 인물들뿐이어서 언제나 읽고 나면 묘한 공허감만 남는다. 일본 소설의 엔테테이먼트 기능을 중요시한 여타 다른 일본소설가들과 가네시로 가즈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편 이야기는 재밌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작가는 한 편의 소설이, 한 편의 영화가 일상에 절망적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때론 구원투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 읽었을 무렵, 일상에 지치고 많이 힘들어했던 나를 토닥여주고 위안을 해 주었던 책이다. 하루에 지친 나를, 신경이 곧두선 나를,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어디에서부터 테입이 엉켰는지 점검해보라고,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게 한 책이었고, 따스한 이야기가 전해주는 기운으로 맘이 좀 넉넉해진 고마운 책이었다.(여우님 감솨~~~)
여전히 2008년에도 일본 소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소설을 읽으면서 이야기의 줄기는 쭉쭉 잘 뻗어나가지만 캐릭터에 대한 구체화는 언제나 실망스러워, 이젠 일본소설은 그만 읽어야지 했더랬다. 피츠제럴드의 캐츠비같은...... 한 시대를 꿰뚫고 대변하는 캐릭터가 없다는 것이 일본소설의 약점이다. 이야기의 아이디어 재밌고 시간 떼우기에 그만이어서 읽긴 하는데, 비슷비슷한 성격의 인물들뿐이어서 언제나 읽고 나면 묘한 공허감만 남는다. 일본 소설의 엔테테이먼트 기능을 중요시한 여타 다른 일본소설가들과 가네시로 가즈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영화 <로마의 휴일>로 이어지는 각각의 단편 이야기는 재밌고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작가는 한 편의 소설이, 한 편의 영화가 일상에 절망적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때론 구원투수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 읽었을 무렵, 일상에 지치고 많이 힘들어했던 나를 토닥여주고 위안을 해 주었던 책이다. 하루에 지친 나를, 신경이 곧두선 나를,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어디에서부터 테입이 엉켰는지 점검해보라고,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게 한 책이었고, 따스한 이야기가 전해주는 기운으로 맘이 좀 넉넉해진 고마운 책이었다.(여우님 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