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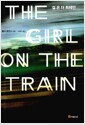
-
걸 온 더 트레인
폴라 호킨스 지음, 이영아 옮김 / 북폴리오 / 2015년 8월
평점 :

구판절판

기차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풍경들 중 유독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삶을 지나칠 정도로 들여다보며 상상하길 좋아하는 레이첼의 이야기는 분명 신선하다. 특히나 그 여성이 갑작스럽게 실종이 되었고, 그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느껴지는 레이첼의 모호한 기억들과 집착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킨다. 서로 전혀 알지 못 하는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 어떤 삶의 접점이 만들어질지, 이야기는 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흥미진진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이야기가 중반으로 다가갈수록 다소 지루하게 느껴졌다. 세 여인의 독백이 제각각 전개되다 보니 어느 순간 몰입이 잘 되지 않았다. 세 연인들이 들어놓는 이야기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나를 찾아줘' 와 같은 긴장감이나 스릴을 느끼기는 어렵다.
이 책은 확실히 뒷심을 제대로 발휘하는 작품이다. 초반과 중반에 종잡을 수 없게 어지러이 퍼져있던 단서들의 실체가 드러나며 무심하게 깔려 있던 복선들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후의 반전을 위한 장치들이 꽤나 조심스럽게, 아주 약간씩만 드러내며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전개상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레이첼의 조각조각난 기억들이 하나씩 큰 그림을 그려나갈 때의 짜릿함이란. 알코올 중독으로 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그녀가 진실에 근접해나갈 때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 이성은 멈추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소리치지만 결국 충동과 욕망에 지고 마는 나와 어딘가 닮아있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을 잃어버렸다는 상황 자체가 당황스럽고 찝찝한 일이지만 설상가상 다른 사람의 말들을 통해 맞춰 본 본인의 행적이 전혀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의심스럽지만 부정할 수 없다는 것, 묘한 죄책감과 함께 자기 혐오가 극에 달할 수 밖에 없다. 끝을 향해 갈수록 그녀의 아픔과 상실감, 두려움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면서 망각의 공포감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살인 사건 자체보다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본인 자신을- 심리적으로 고립된 공포가 극대화되어 다가온다.
인생이란 너무나 얄궃고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인연이 닿기도 하고 일상에서 는 가당치도 않았던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이 책 속에는 이러한 묘미가 아주 사실적으로 담겨져 있다. 우리의 지루하고 평범한 삶이 끔찍하지만 특별한(?) 사건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책 속에 빠져있는 동안 지하철, 혹은 버스로 같은 길을 오가며 마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 가닿을지도 모른다는 두근거림, 생경함 같은 것이 자라나게 된다. 이것이 매일 시계추같이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