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고 슬퍼서 아름다운 것들 - 한 글자로 시작된 사유, 서정, 문장
고향갑 지음 / 파람북 / 2022년 1월
평점 :




[작고 슬퍼서 아름다운 것들]은 한 글자에 담긴 ‘나’와 ‘너’였고, ‘너’를 포함한 ‘수만 글자’를 품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신문에 연재하는 칼럼이 대부분이라 길게 쓸 수도 없었다고 했다. 글자 한 조각으로 문장의 깊은 맛을 우려낸 삶과 서정의 에세이다. 예순아홉 꼭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저자는 글을 쓰며 노동현장을 전전했다. 사건과 배경의 주인공은 늘 당신이라고 한다. 한글자로 시작된 사유, 서정, 문장들은 가슴에 울림을 준다.
이웃집 강아지인 일순이와 숲길을 걸었다. 똥, 오줌도 가리지 않는 일순이가 예쁜 것은 ‘개냥이’ 때문이다. 개냥이는 고양이인데 새끼를 낳다 죽었다. 한 번도 새끼를 밴 적 없는 일순이의 젖이 불었다. 죽은 개냥이를 대신해서 새끼 고양이들에게 젖을 물렸다. 하나와 둘을 애써 가를 필요는 없다. 둘이 모여 하나를 품고, 품은 하나 속에 둘이 있다.
한 글자로 이름 붙여진 것 가운데서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나는 ‘숨’을 꼽는다. 숨은 인간의 삶과 직결되어있다. 숨을 쉼으로 삶이 시작되고 숨을 멈춤으로 삶이 마감된다. 숨은 숲을 닮아서 끝없이 호흡해야 한다. 인간이 말과 글을 통해 소통하는 것도 엄밀한 의미에선 호흡이다. 숨 쉬지 않는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글을 쓸 수 있겠는가.p64

눈앞에 툭 던져졌을 때, 만남이 시작된다. 그래야 진짜다. 처음을 낱말 앞에 붙이는 것도 그래서다. 처음여행, 처음생각, 처음사람, 처음이별, 하는 것처럼. 그래야 온전하다. 처음을 ‘첫’이라 부르는 것은 씁쓸하다. 첫은 문법이라는 감옥에 갇힌 처음이다. 갇힌 첫에는 처음이 품고 있는 차분함이 없다. 첫사랑이 온전하지 못함도 그래서일지 모르겠다. 첫에는 시옷이라는 발이 달려서 늘 종종거린다.
아이의 꿈이 또 무너졌다. 삼 년째다. 어깨동무하면서 술을 마셨지만 위로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방을 이루는 네 개의 벽이 있어 무너지는 마음을 맡길 수 있다. 가족이라는 네 개의 벽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방안에 앉아서, 나를 보듬은 네 개의 벽을 바라본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가족이라는 벽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하철 무임승차 단속반이 아내와 저자를 가로막았다. 아내가 사용하는 장애인 교통카드 문제였다. 발가벗겨지기라도 하듯 아내는 장갑을 벗어야만 했고 엄지를 잃은 손은 어미를 잃은 아이 같았다. 모멸감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떨지 마라, 아내야.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대학을 중퇴했던 당신이 아니더냐. 돈벌이도 없는 글쟁이에게 인생을 걸어준 당신이 아니더냐. 내게 있어 당신의 아홉 개의 손가락은 세 개의 계절을 잉태하는 꽉 찬 충만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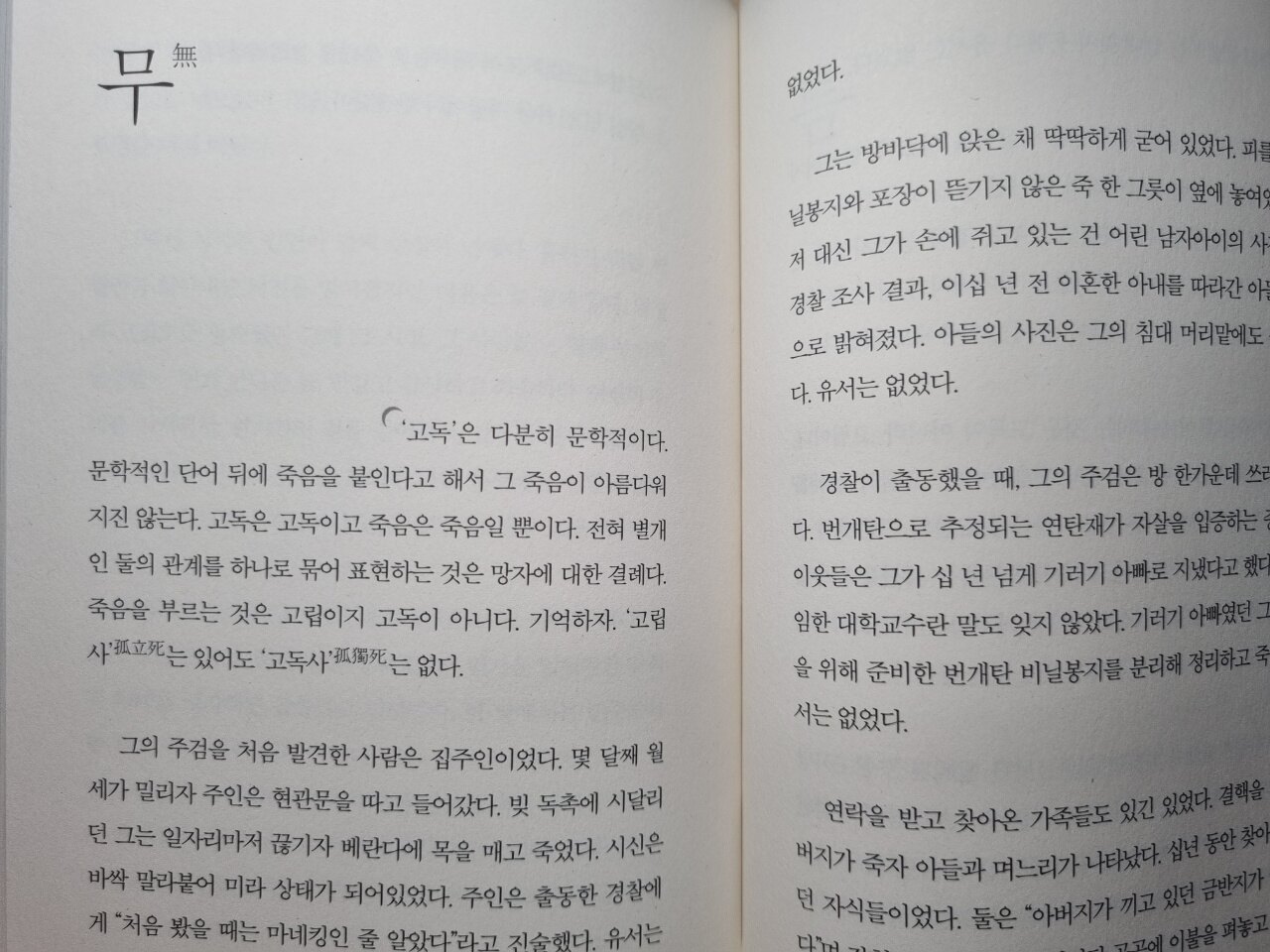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이다. 고립은 단절의 옆모습이고 절망의 뒷모습이다. 고립의 실체를 고립시켜야 한다. 고립사는 있어도 고독사는 없다고 했다. 주검을 발견한 사람은 집주인이었고 손에 쥐고 있는 건 어린 아들 사진이었다. 정년퇴임한 대학교수가 자살을 했다. 유서는 없었다. 연락을 받고 찾아온 가족들은 아버지가 끼고 있던 금반지가 안 보인다면서 방바닥 곳곳을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씁쓸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면은 가난한 것들이 도시에 뿌린 땀 냄새를 닮았다. 꿈을 머금고 단칸 셋방에 둥지를 튼 어린 것들을 닮았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가여운 것들을 닮아서, 라면은 누구에게나 기꺼이 가슴을 연다. 굴곡지고 비틀린 속살을 뜨거운 불길에 데워 굶주린 하루를 달랜다. 지금도, 어디선가 물이 끓고 있다.
휴전협정이 막바지로 치닫던 그해 정월 새댁은 우물로 도망쳐 빠져 죽었다. 딸의 어미는 잡혀가지 않은 사내들은 똥통 밑에 기어들어가 숨을 참았다. 대나무밭에 땅굴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었고. 사내들이 요강에 싼 똥을 받아 땅에 묻고, 주먹밥을 받아먹었다. 어미가 피를 토하며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어미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그렇게 내 할머니는 죽었다. 고모와 할머니의 사연을 어머니에게서 전해 들었다. 칠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빨갱이타령은 여전하다. ‘휴전’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아, 우리는 아직도 휴전상태였지.
죽어야 피는 꽃이 있다. 수직으로 아찔한 벼랑 끝에 처절하게 부서지는 꽃이 있다. 부서지고 죽어야 피는 그 꽃은 일터에 핀다.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굴착기에 무너진 흙더미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 십층 높이에서 일하던 인부가 발을 헛디딜 때, 추락하는 꽃들에게는 날개가 없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