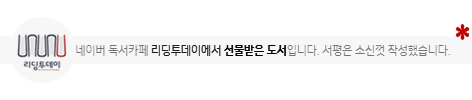-

-
당신을 막내딸처럼 돌봐줘요
심선혜 지음 / 판미동 / 2021년 6월
평점 :




잔병치레가 없던 저자가 서른두 살에 암에 걸렸다. 악성 림프종, 혈액암 1기라고 했다. 2년 반 동안 치료를 마치고 암세포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시들어 갔다. 이 책은 암 치료과정을 다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아닌 제목처럼 나를 먼저 돌봐주고 부디 우리가 더 ‘건강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글이다.
저자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긴 뒤 전업 엄마로 지냈고, 아이를 3년 만 키워 놓고 내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밖으로 나가려 했던 문 앞에서 좌절했다. 쉽지 않았지만 내 몸에 생긴 변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먼저였다고 했다. 암이 축복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비극이라고 푸념하지도 않는다. 암은 그저 암일 뿐이라고.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 닫혀 좌절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안에서 보낸 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를 줬다고 했다.
2년 전, 정기검진에 갔던 날 진료를 기다리던 중 자원봉사 할머니를 만난다. 할머니는 완치 판정을 받고 7년이 지난 유방암 환우였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로 이어지는 위로를 들으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됐다. 할머니는 저자의 손을 쓰다듬어 주시며 몇 번이나 “너를 위해 살라”고 하셨다. 나를 막내딸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보다 나를 더 먼저 돌봐주라고 하셨다. 나를 막내딸처럼 돌보자.
저자는 암에 걸리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서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깍쟁이었다. 자신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고, 혼자서 버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주변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었다. 곁을 내주는 것이었다.
겪어보지 않은 아픔을 위로로 건네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면 좋은 말도 곱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요즘에 암은 병도 아니라더라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 위로를 하고 싶을 땐 차라리 ‘점이라도 찍을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면 어떨까? 라는 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양귀자 소설 [모순] 속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나의 불행에 위로가 되는 것은 타인의 불행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 구절이 오랫동안 나를 안아 줬다. 남의 불행을 보고 행복해지려 했던 못난 나를 토닥여 줬다.p122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낸 게 글쓰기였다. 혼자 울고 불고 아무 말이나 쏟아낼 수 있는 곳. ‘대나무 숲’으로 블로그가 딱이었다. 이제는 억지로 눈물을 참지 않는다고 했다. 슬프고 힘들면 글을 쓴다. 하소연할 누군가를 찾는 대신 마음을 담아 쓴다. 몸과 마음이 힘든 나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방법은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글을 썼을 저자가 대단하다.
저자는 신문에 부고를 읽는 습관이 생겼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낯선 산을 혼자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만, 이미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보여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 누군가 살아가는 흔적들이 나를 일으켜 준다고 하였고, 아이를 끌어안을 때 순간의 행복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아프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무 앞선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나 자신을 사랑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