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 인생에 미안하지 않도록 - 이제는 엄마나 딸이 아닌 오롯한 나로
최문희 지음 / 다산책방 / 2020년 3월
평점 :




이제는 엄마나 딸이 아닌 오롯한 나로 부제목에 더 끌린 책이다. 이 땅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자님의 이력에 놀라웠다. 예순한 살의 나이에 [서로가 침묵할 때]로 등단하여 2011년 [난설헌]으로 제1회 혼불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소설보다 산문을 쓸 연륜인데 마음이 흔들렸다는 저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야기를 써야 하니 발가벗는 느낌,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인가 하면서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보태고 빼는 글은 쓸 수 없다는 생각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엄마와 딸은 저마다 옹이를 안고 산다. 소화되지 않은 멍울이다. 나 역시 누구네 집 딸이었고, 어머니가 아흔 중반 고비에 타계할 때까지 불효라는 딱지를 달고 뻔뻔스럽게 살았다. 독신을 고수하는 딸과의 대화는 어느집에나 장성한 딸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일 같지 않다고 여긴다.
저자가 10대 중반쯤 생리를 시작하고 “네 몸의 것, 그 속옷은 네 손으로 해라”는 어머니의 한마디가 손을 물에 담그게 시작해서 맨손으로 그릇을 씻고 걸레를 빨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손을 보고 “손 관리 좀 하지”라고 했다. 두꺼비를 닮은 내 친정 엄마의 손을 생각했다. 엄마가 김장을 맨손으로 담그시기에 손이 안 매우세요. 왜 장갑을 안끼냐는 물음에 버릇이 들었고 갑갑해서 그냥 한다고 하셨다. 그 시대 여인들은 맨손으로 빨래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었다.
다섯 살 된 손자 아이에게 “할머니 손잡아줄래?” 말에 “할머닌 아빠 손잡아” 아이의 아비 되는 아들을 손을 맞잡아 온기를 느끼지만 아무리 귀여운 손자라도 세 시간 지나면 힘들어진다는 말이 공감이 될 듯 말 듯 다가온다. 아들이 맡기고 간 강아지 루비가 13년 살다가 유방암에 걸려 죽자 힘든 마음을 이기려고 작업에 매달린 결과가 소설[난설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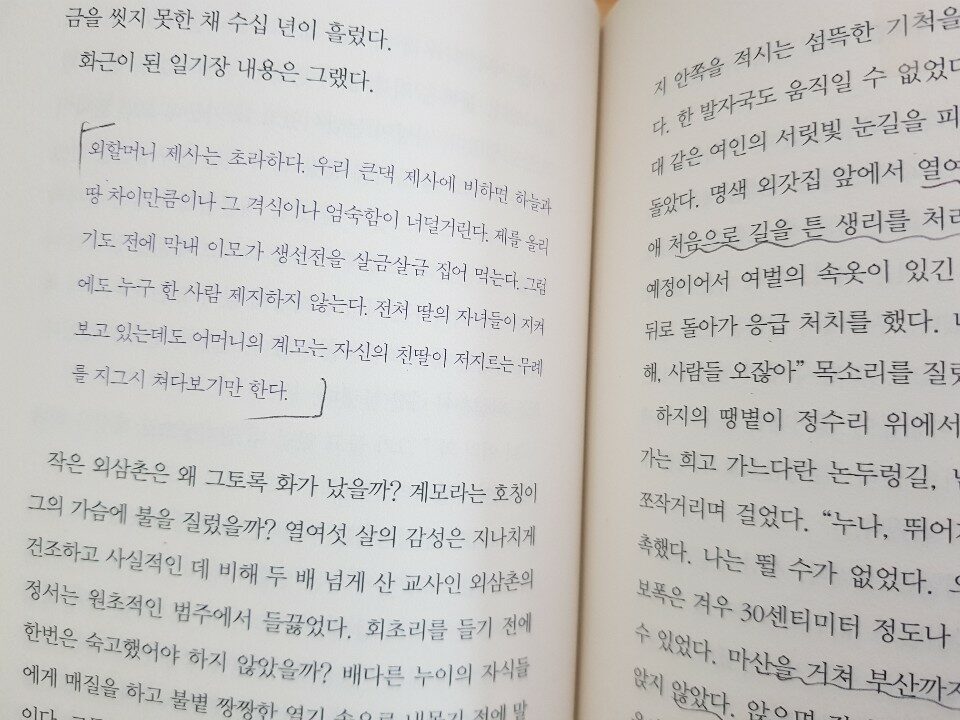
일기장 소동으로 외갓집에 간지 사흘만에 남매가 쫒겨난 일은 웃프다. 문학상을 받았을 때 상금의 한쪽을 떼어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어쩌자고 네가 긴 치마를 입고 설레발을 치는 게냐 네 동생 사업이 어려운 마당에 ...”조금 울컥하여 봉투에 넣은 돈 절반을 덜어냈다. 자신감은 유년기 부모가 건네는 한두 마디 칭찬에서 비롯되는 지렛대 아닐까? 그래서인지 나는 늘 한구석 아이로 자랐다.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중일 때 반장이던 친구가 딸을 잘 봐달라고 나타났다. 반장이 모교 <숙란화보>에 기사를 실어주겠다며 후배 편집장을 대동하고 왔는데 대단한 선심이고 파격적인 대우였다. 가난해서 아버지 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다니던 바보 머저리, 공부도 못하던 오종종한 애가 작가라는 이름을 달고 일어선 것이 반장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지긋이 반듯하게 살면 된다는 고모님의 말씀과 네 입술을 바늘로 꿰매야 할 것이야 네 속으로 힘을 키워. 아무도 널 만만하게 안 볼거라는 엄마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거 같다.
유년에 겪어야 했던 공복과 칼 찬 순사의 구둣발 소리가 흘리는 전율의 잔해로 집에서도 문을 잠그는 버릇이 있어 남편이 혀를 찬다. 아침은 에스프레소 한잔에 우유 60퍼센트, 사과 반쪽에 달걀 반숙, 바싹 구운 잡곡 토스트 반쪽, 점심은 밥에 밑반찬으로 하다 성가시면 냉동만두나 감자를 삶아 먹거나 팥을 삶아 설탕을 팥죽을 먹는다. 저녁은 우유 한 잔에 고구마 반쪽으로 하고 주말에 종종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먹지만 입에 당기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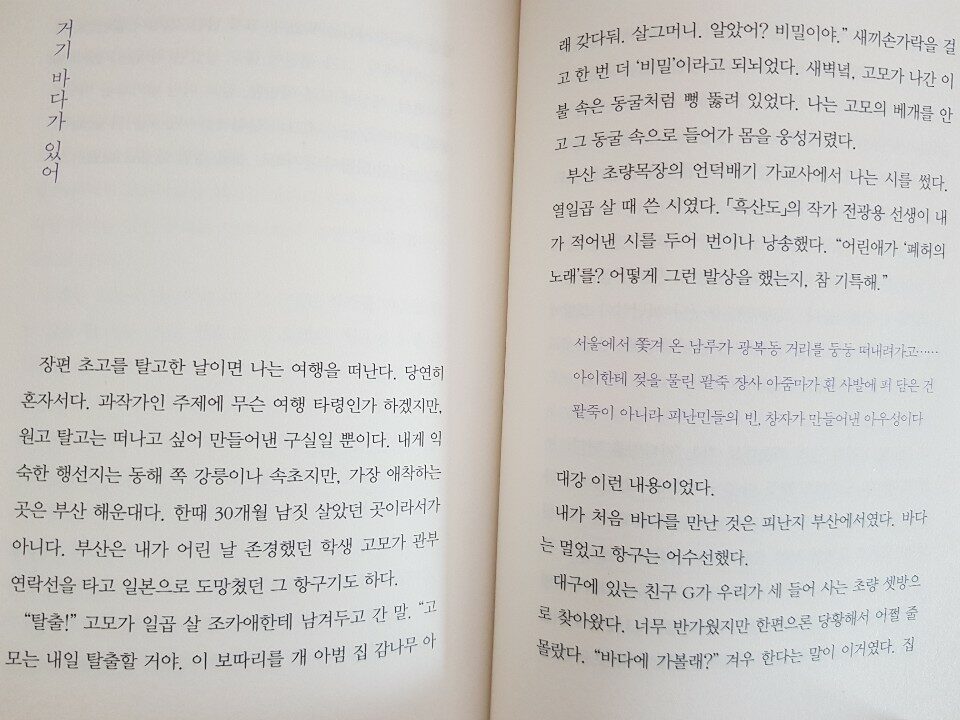
가볍게, 단순하게, 하나만 더 보태면, 감정의 쓰레기를 씻어낼 것. 저자가 다짐하는 말이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부모 자식 사이, ‘미움과 사랑이 버무려진’ 복잡한 관계를 가식 없이 진솔하게 포착해냈다. 오래된 기억의 일들을 진솔하고 생생하게 기록한 노작가의 글들이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