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허은실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9년 2월
평점 :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

《저자 허은실》
1975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서울시립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했다. 라디오 오락·시사 프로그램의 작가로 10년 넘게 활동했으며 2010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현재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책방]의 작가를 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대학 3학년 무렵, 선물 받은 최승자의 시집 『내 무덤, 푸르고』를 읽고 시에 눈뜨게 되었다. 백석, 김수영, 파블로 네루다, 최승자를 시적 스승으로 생각한다. 청각, 후각, 미각이 예민하고,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동음이의어 개그를 자주 구사한다. 청각은 예민하지만 귀가 나빠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에세이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과 시집 『나는 잠깐 설웁다』를 펴냈다. 방송 원고가 바깥을 향한 소통이라면, 시를 쓸 때 좀 더 비일상적인 사람이 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시를 쓰고 있다. 쭈그리고 앉아, 자꾸만 여위어가며, 누군가의 몸에 세 들어서, 한밤중에 무릎 위에 턱을 올려놓고 발톱을 깎으며, 뺨 대신 이마를 가리고 웃으며, 꽃잎을 손톱으로 꾹꾹 누르거나, 볼을 타고 내려오는 뜨듯한 것을 핥으며, 살에 와 녹는 눈송이에 기대, 그림자에 끌려서, 장어탕을 먹고 유리벽에 이마를 찧으며 지금도 시를 쓰고 있다.
《 차 례 》
1부 사랑 사랑은 언어를 발명한다
2부 관계 당신이 있어 가능한
3부 태도 살아가면서 몸에 배었으면 하는
4부 발견 기울이면 말을 걸어오는
5부 시간 지금 붉지 않다 하여도

-말을 걸다 : 떨리는 마음을 수줍게 건네보는 것
이렇게 말을 걸어도 될까. 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한다. 시인이라서 글이 예쁘다. 단어의 목소리 말들의 울림을 들으러 가볼까 한다.
설렘이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도 좋다. 어릴 때 소풍 갈 때 마음일까 도시락을 싸 갈 수 없는데 어디를 간다는 것에 마음이 들 떠 있을때가 있었다.
햇살은 무뚝뚝한 창문에게 말을 걸고, 사랑도 말을 거는 것이라고 한다. 지금 나는 책에게 말을 걸고 있다. 책이 나에게 말을 걸 수도 있다. 언젠가 책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지금껏 같이 지내는 것인가보다.

-마중과 배웅 : 먼 길 외로움을 덜어주는, 환대와 동행의 형식
마중과 배웅 우리가 태어날 때 설레며 기다리던 가족들은 나를 마중하고 있던 것 어느 집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그 상여를 따르던 건 먼길을 함께 배웅하던 이별 의식이었죠. 남자 친구와 헤어짐이 싫어 저만큼 데려다 주고 다시 오고 했던 날을 생각하며 웃음 지어 진다. 어린 딸이 시골 생활을 하다가 부산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의 기다림은 마중이다. ㅋ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는 삶이란 또 얼마나 가난한 것일까 싶습니다. 그 가난만은 모면해 보려고 타인의 모카신을 신어보는 것, 그게 문학을 읽는 일이 아닐까요. 책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의 삶을 상상하고 거기에 자신을 대입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p81

-연결 : 별자리와 무늬와 시와 우리가 되는 낯선 것들의 만남
연결이라는 글을 읽으며 지금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것도 연결이라고 생각한다. 낯선 타인들과 소통을 한다. 글 속에서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 좋은 말이다.
지금도 내 손은 약손이다. 배가 아프면 손을 가만히 갖다 대기만 해도 통증이 덜하거나 아예 안 아프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이 트라우마 치유에서 강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 가까운 이들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거라고 한다. 그건 손을 빌어 마음을 쓰다듬기 때문일 것이다. 촉각이 인간에게 먼저 발달한 감각인 것도 그런 이유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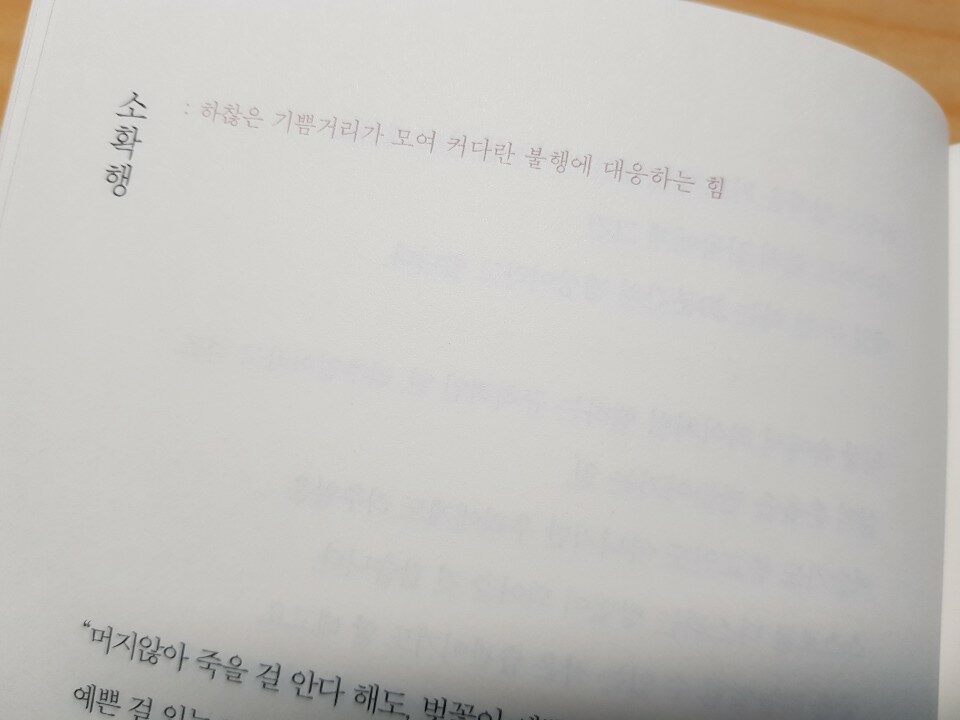
-소확행 : 하찮은 기쁨거리가 모여 커다란 불행에 대응하는 힘
“나는 아주 하찮은 일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좋아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원천과도 같은 존재이다.” 오스카 와일드
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 나쁜 일, 하찮은 기쁨, 이런 소소한 일들이 일상을 지탱하고 인생을 지속하게 해준다. 이게 바로 소확행이다. 일상이 매번 같지만 하루 하루 즐거움을 찾아야겠다.
쓰다. 글을 쓰다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을 쓰다도 있다.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마음도 쓰라고 있는 것, 그렇다면 아끼지 말고 다 쓰고 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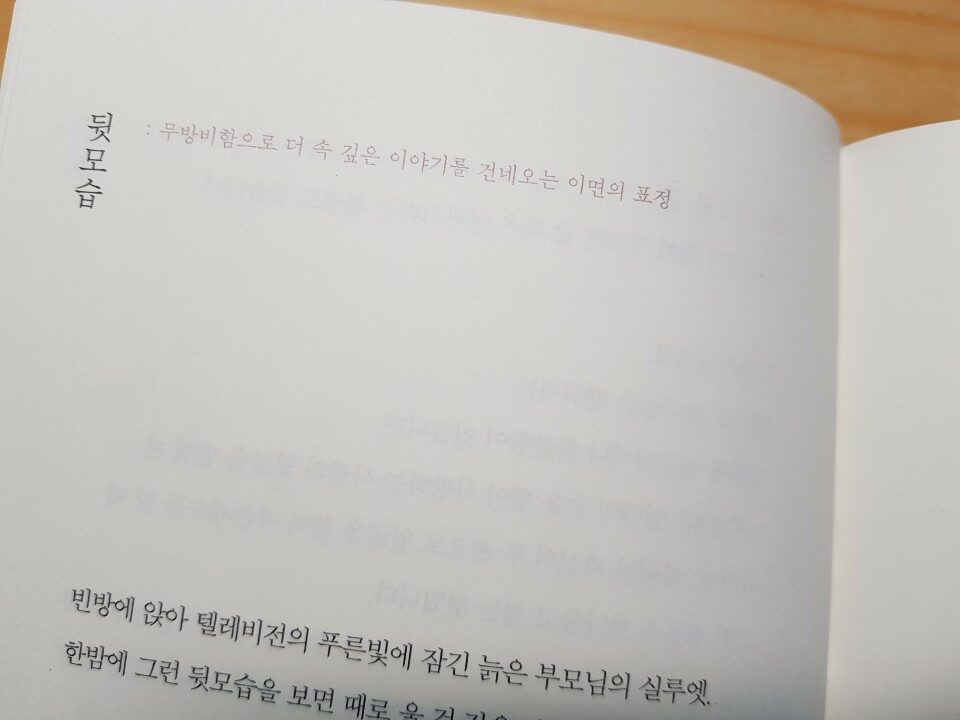
- 뒷모습 : 무방비함으로 더 속 깊은 이야기를 건네오는 이면의 표정
뒷 모습 하면 뭐가 떠오를까. 연로하신 부모님이다.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가을 날 딸이 진료하는 병원으로 오신 친정 아버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셨다. 퇴원하고 딸을 보러 온다고 오셨는데, 부축해주는 팔이 뼈만 앙상하고 돌아가는 뒷 모습이 왜 그리 작아 보이든지 지금도 자주 입원을 하시는데 마음이 안쓰럽다.
낯설게 하기 이런 말은 시나 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이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말이었다. 한 달 병원 생활하고 집을 들어서는 데 휠체어로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 방문하는 집 같고 많이 낯설었다. 고작 한 달인데 일년 이었으면 어쩔뻔했나. 택시를 타고 동네를 스쳐 지날 때 간판을 보게 되었다. 없던 게 생겼네 있던게 없어졌나. 한 장면이라도 안 놓치려고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눈을 떼지 못한 때도 있다.
봄 한 음절의 말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때문에 외롭다. 와 멋진 말이다. 시인의 감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간절한 것은 짧다고? 그걸 호명 해보면 물,피, 숨,잠,약, 술, 시, 책, 누군가에겐 '너'라는 말이 그럴 거라고 한다. 봄! 그래서 봄이 오나 봄
[그날 당신이 내게 말을 걸어서]를 읽으며 시인이 따라간 발자취를 나는 어땠나 생각하며 읽으면 감성이 충만해지고 힐링이 된다. 이 봄에 힐링 에세이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