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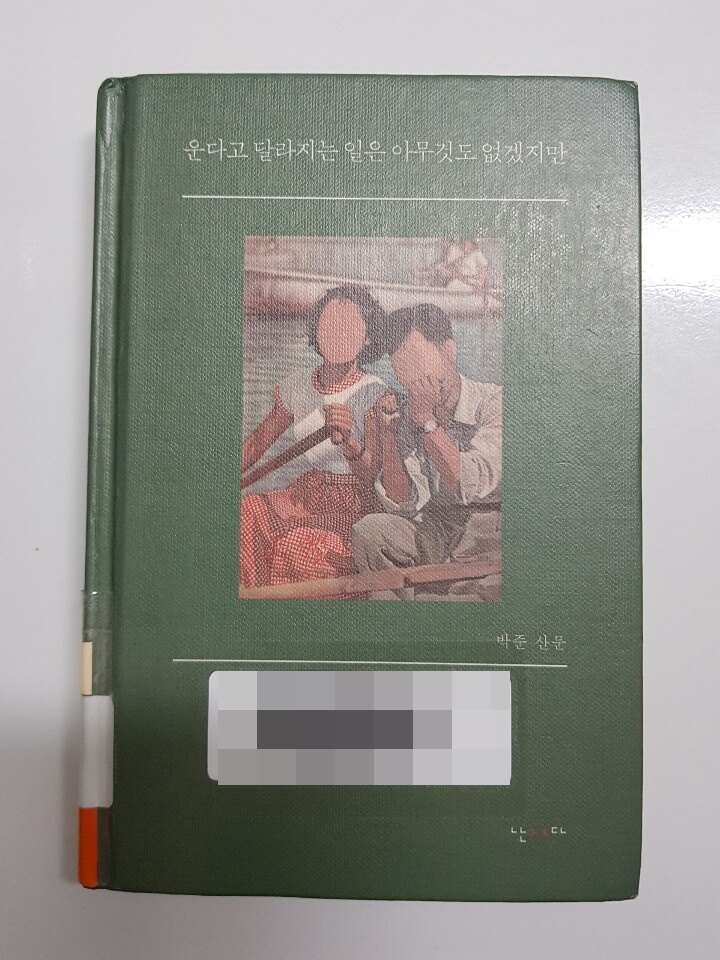
《저자:박 준》
시인,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8년 『실천문학』 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가 있다.
이 책은 산문집이지만 시집처럼 산문처럼 읽힌다. 젊은 시인인데 세심하게 묘사한 글들이 마음에 든다. 웬지 팬이 될 거 같은 기분이랄까. 제목이 마음에 들어 고른 책이다. 마음이 찡한 대목은 시인이 아버지와 통화했던 대목이다.
"한번은 미아리 극장에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최무룡씨가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어. 너 최무룡씨 알지? 몰라? 그때 극장들은 로비에 벤처스류의 경음악을 크게 틀어놓았거든. 아, 신나지. (중략) 그때가 양복점 일하기 전에 창동으로 고물 주우러 다닐 때니까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울먹이시다 끝내 오열. 겨우 그치고) 그 영화 줄거리가 꼭 내 이야기 같았어. 주인공이 고아인데 나랑 처지가 비슷하더라고. 영화가 끝나고도 집에 갈 때까지 울었어. 당시 홀아비로 살던 네 할아버지가 나보고 왜 우냐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푸른 하늘 은하수>보고 오는 길이라고 하니, 할아버지는 먼저 그 영화를 봤나봐, 그러더니 나더러 더 울라고 … (다시 오열)"
"아이참. 슬픈데 웃기네."
"그런데 너는 어떤 영화로 글을 쓸 건데?"
편지
몇 해 전 누나를 사고로 잃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을 쫓기듯이 며칠 만에 서둘러 정리했다. '키타로'라는 이름의 러시안블루 고양이는 누나의 친구가 데리고 갔고 가방과 옷은 태웠으며 책은 버렸다. 하지만 단 하나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녀가 이제껏 받은 편지였다.
나는 편지들이 궁금해 손에 잡히는대로 펼쳐보았다. 한참을 읽어보다 조금 엉뚱한 대목에서 눈물이 터졌다.1998년 가을, 여고 시절 그녀가 친구와 릴레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편지였는데 "오늘 점심은 급식이 빨리 떨어져서 밥을 먹지 못했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10여 년 전 느낀 어느 점심의 허기를 나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것으로 편지 훔쳐보는 일을 그만두었다.
울음과 숨
통곡, 사람, 곁, 울음소리, 구슬프다, 끊어질 듯, 다시 이어지는, 울음, 그사이, 들리는, 숨소리, 울음에 쫓기듯, 급히 들이마시는, 숨의 소리, 울음, 울음 보다 더 슬픈, 소리.
시인이라는 직업이 녹록지 않다는것이 마음이 쓰이는 구절이다.
시가 돈이 되지 않듯, 시인이 직업이 될 수 없으니 내가 한 일들은 그동안 빈번하게 바뀌었다. 두 해 가까이 오류동의 마트에서 배달을 했고, 강서구의 청과물 경매장에서 지게차를 몰았고, 교정지와 함께 눈을 뜨고 교정지 위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야 하는 출판사의 편집 일도 했다. 관람객들이 잘 찾지 않는 문학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며 허허로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꽤나 좋은 조건으로 홍보직 공무원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시인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통영을 사랑한다고 한다. 나도 통영에 두 명의 친구가있고 통영을 좋아하는 데 지금은 갈 수가 없다.
통영을 사랑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마음으로 한 철을 함께 보낸 애인도 통영을 사랑했다. 시인 백석과 도종환과 청마 유치환도 통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미인들이 통영을 사랑했을 것이다. 백석은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 이라 말했고 도종환은 "섬 사이로 또 섬이 있었다 굳이 외롭다고 말하는 섬은 없었다" 고 이야기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청마 유치환의 사랑 이야기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한다.
1947년 마흔 살의 유치환은 통영여중 교사로 갓 부임한 한 교사에게 반해 하루도 빠짐없이 통영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보냈다. 1967년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그가 보낸 편지는 약 5천 통에 달했다. 그 수많은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이영도 시조시인이었고 유치환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동안 받은 편지를 엮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고아
아버지는 서울 태생입니다. 그림을 그렸던 친할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자하문 근처 살던 가난한 아버지의 유년이 며칠씩 생으로 굶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촌에 살던 가난한 어머니의 유년에는 그래도 수제비나 옥수수, 감자가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자랑이라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았다' 정도이니까 역시 서울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아버지의 세발자전거 이야기 그때가 1953년이나 1954년 즈음입니다. 당시 며칠씩 생으로 굶던 처지의 어린 아버지가 갖기에는 값비싼 물건입니다. 그 자전거는 사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한 물건이었습니다. 며칠씩 울기만 하는 아들이 불쌍했는지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것이지요. 분명 자전거도 좋았겠지만 '엄마'라는 것이 무엇으로 대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모두 고아가 되고 있거나 이미 고아입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면 덜 창피하고 조금 힘도 되고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