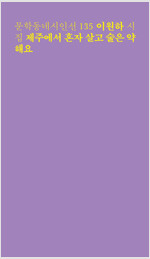처음에 제목보고 ˝뭐야 이거 작업멘트아냐?˝ 라고 생각했다. 이게 시집 제목이라고? 뭔가 제목이 확 끈건 사실이다. 그렇게 시집을 읽어나갔다.
시집은 그 두께와 글밥 (한 페이지에 적힌 활자의 밀도) 에 비해 의외로 빨리 완독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다. 왜냐면 그 한자한자가, 행과 행 사이가 어떤 산문, 소설보다도 더 많은 뜻과 메세지를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은 매우 쉬운사람(?) 얘기일 줄 알았으나 시 속 화자는 이해하는데 오래걸렸다.
주량이 약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수국을 꺾어먹는다질 않나, 관광객을 보다 물그릇이 엎어진다질 않나
자꾸 웃는데 약간 제국의 아이들 노래처럼 해맑게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 라 하는것처럼 앞뒤가 안맞질않나.
시는 아직은 내게 쉽지않은 장르다. 그 이유는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인과관계와 말이되는 주어-술어의 배열을 시인의 깊은 뜻을 담기위해 의도적으로 비틀기 때문이다.
이 시집을 이해하고 소화하는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난해해서 빨리 치우고싶지않은, 묘한 매력이 있었다. 설명이 불가한데, 제주도의 자연의 언어와 화자가 동일시된 많은 문장들이 이성적으론 이해안되지만 그냥 참 이뻤다. 그리고 뜻모를 그 미로에 기꺼이 함께 헤매고 싶었다.
그리고 한참 헤매다가 뒤에 나온 신형철 평론가님의 해설을 읽으니 안개가 걷히는듯 해 좋았다.
절대 헤픈 여자 얘기 아니다.
재밌는 시집이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