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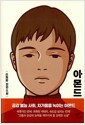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하루, 이틀 아니 실은 단숨에 다 읽었다. 국내 청소년 성장소설이 주는 아릿한 느낌.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속에는 마음 속을 깊숙히 저미며 추억을 새기게 하는 묵직함이 자리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내가 예전보다 '사회적 시간'을 많이 체감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짧디 짧은 독서량에도 아직 어린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다는 방증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래서 결코 소녀로서의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구나. 아파하면서도 자신의 낭만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이구나...하고 생각한다. 실은 이제 다 지난 일이다. 단지 내 선택만이 남았을 뿐이다. 역시 추억만을 곱씹기엔 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말았다.
짧디 짧은 독서량에 어디 책 깨나 읽었겠냐만은 과거(아마도 10년이 더 지난 어릴 적) 읽었던 청소년 성장소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혜진의 '프루스트 클럽'이라는 작품이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실은 제목도 줄거리도 가물가물하다가 얼마 전에 검색을 통해 알았다. 그 잠깐 읽었던 작품이 뇌리에 남을 정도라면....) 당시로서는 대단히 어린 나이에(그것도 중,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 무렵의 나이에) 접했던 주제의식, 예컨대 성장통이라던가 사춘기 같은 부분에서 어딘가 괴리감이 들었던 부분도 없지 않다. 이제는 그 시기를 훌쩍 지나버린 어른이 되었지만, 오늘 '아몬드'를 읽으면서 과거에 읽었던 그 책 생각이 많이 났다. (분류하자면) 똑같은 청소년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단숨에 읽었으나, 그 여운은 결코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말이다. 분열하고 방황하는 소년들, 기시감에 가까울 정도로 붕 떠있는 풋풋한 느낌. 어머니의 품 안, 정확히는 과거 짝사랑하던 소녀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 평화로운 한때의 무위(無爲). 대충 그러한 향수인데, 나는 각박한 현실에 그런 구원을 좇은 인간 전형이었는지도 모른다.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저마다의 다양한 구원의 길을 향해 손을 뻗쳤었다. 어떤 이들은 열심히 연애에 탐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술에 탐닉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향수' 역시 그렇다. 내가 괜히 입시 때 청소년학과나 상담학과를 썼겠냐만은 (...) 이번 독서를 계기로 '프루스트 클럽'을 한 번 다시 읽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라딘 중고가로는 단돈 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잡스러운 느낌의 책이지만, 뭐 어때. 내가 보고싶다는데.
요즈음은 애써 표현력을 재고하고 자판을 두들기며 글을 쓰는 게 가식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현학적 수사로 수놓인 비평 따위의 글들을 읽을 때 구태여 억지스러운 기분이 드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그녀석은 비평마저도 작품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글쎄, 나는 그런 사랑이라면 싫다. 각종 재단과 분석. 교양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고나리질, 꼰대질... 작품을 깎아 먹는 하등 영혼 없는 짓거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역시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아비투스가 따로 있는 것이겠지. 아무튼 참으로 이런 생각에 경도될 때면 마침내 나만의 독서 취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 이번 달은 네 권의 책만 주문하려 한다. 실은 이번에 사 놓은 것도 다 읽지 않고 있으니까 사둔 책을 열심히 읽기나 해야겠지. '안녕 나의 피아니스트'같은 거라던가...
청소년기의 치기 어린 방황도, 형언되기에는 꽤나 명료하지 않은 사랑과 아픔과 숱한 인간관계에서의 고뇌도, 실은 그것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간이다. 나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투루 살았나. 텅 빈 방 안에는 술 냄새만 가득했지. 열렬히 사랑이나 했겠냐만은 그에 비해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을 낭비하기나 하고.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다 결국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괴테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떠올려 봤다. 사랑이 변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학대를 가한다는 뉴스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한 이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한 사랑이란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었다.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신히 단어 안에 가둬 놓은 것. 그런데 그 단어가 너무 자주 쓰이고 있었다. 그저 기분이 좀 좋다거나 고맙다는 뜻으로 아무렇지 않게들 사랑을 입 밖에 냈다. (p.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