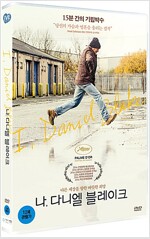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제69회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다. 영화 감독 켄 로치는 영국 사람이며 노동계를 대변하는 작품을 주로 만든다고 한다. 이 영화는 주인공 '다니엘'(영화 포스터 인물)이 영국의 복지 제도가 형식적, 관료적인 나머지 위험한 심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영화는 다니엘이 심장병이 심해져 일을 그만두고 관공서에서 질병 수당의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형식적인 물음만 반복하는 직원. 결국 다니엘은 질병 수당 대상에서 탈락된다.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인 다니엘은 항소를 하지만 시간이 걸리기에 어쩔 수 없이 실업수당을 받으려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모두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다니엘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저 방법만을 알려주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직원들. 그 때문에 분노가 점점 더 쌓여가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관공서에서 우연히 어려움에 처한 케이티를 도와 주게 된다. 홀로 아이 두명을 기르다 영국으로 이사하게 된 케이티는 지독한 생활고를 겪는다. 힘든 사정에 있는 다니엘은 케이티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그녀를 힘껏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다니엘이 스스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력서를 넣었다가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가하겠다는 직원의 말에 다니엘은 무언가 다짐을 하게 된다. 관공서의 벽면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 굶어 죽기전에 항고 배정을 요구한다.'라고 적는 다니엘. 영화는 항고 심판일 당일, 항고에서 승리할 거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며 화장실에 가던 다니엘이 쓰러져 사망하는 것을 끝나게 된다.
영화는 시종일관 내내 불편함을 그려내고 있다. 복지 수당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은 비인격적으로, 사물로 대하는 직원들의 모습. 관료제 안에서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절차만이 있을 뿐이며 휴머니즘은 사라진지 오래다. 앞에선 설명을 안했지만 홀로 아이 두명을 키우는 여성 '케이티'는 가난을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매춘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택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도 영화는 그려내고 있다. 또한, 디지털로 모든 시스템이 이동하지만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제공하지 않는 허점 또한 존재한다.
영화에 대한 반론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관료제의 폐해는 그려내고 있지만 복지 국가를 '선'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재원은 어디서 오는가? 영화는 보수당을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은 어디서 오는가? 급진적 정책은 결국 혼란과 부패만을 가져오지 않는가?
현재 세계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패러다임은 사라지지 않을 듯 하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생산수준이 계속 증가하면서 의식주, 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감당할 재원은 충분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관료제를 A.I 시스템으로 전환.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면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 나오는 억울한 사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맥없이 죽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주장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이야기다. 이런 기본권의 보장과 재원과 세금 부담 사이의 갈등은 사라지니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시사하는 점은 우리는 인간이며, 휴머니즘을 잊어선 안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