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라진 아내가 차려 준 밥상 ㅣ 매드앤미러 2
구한나리.신진오 지음 / 텍스티(TXTY) / 2024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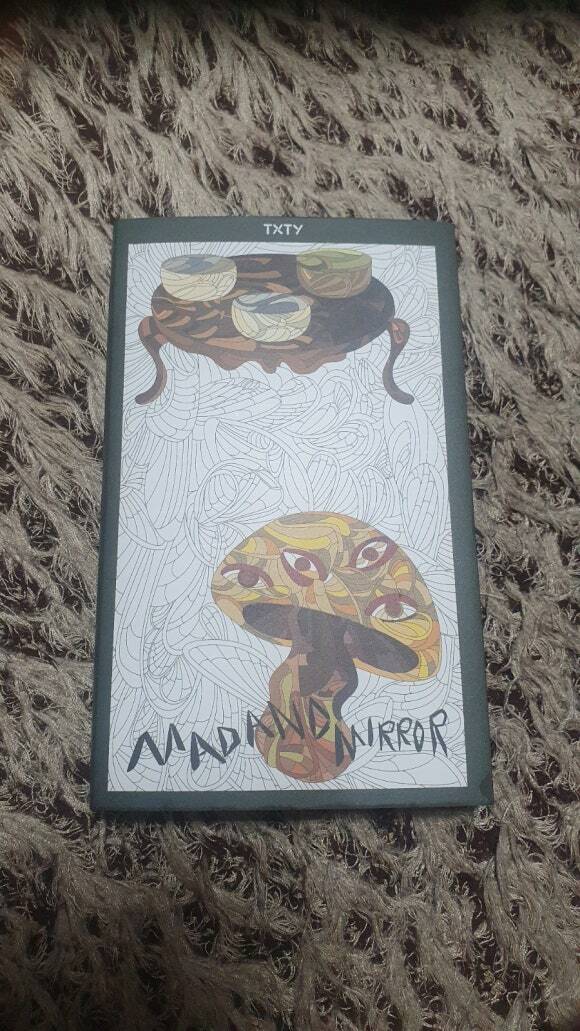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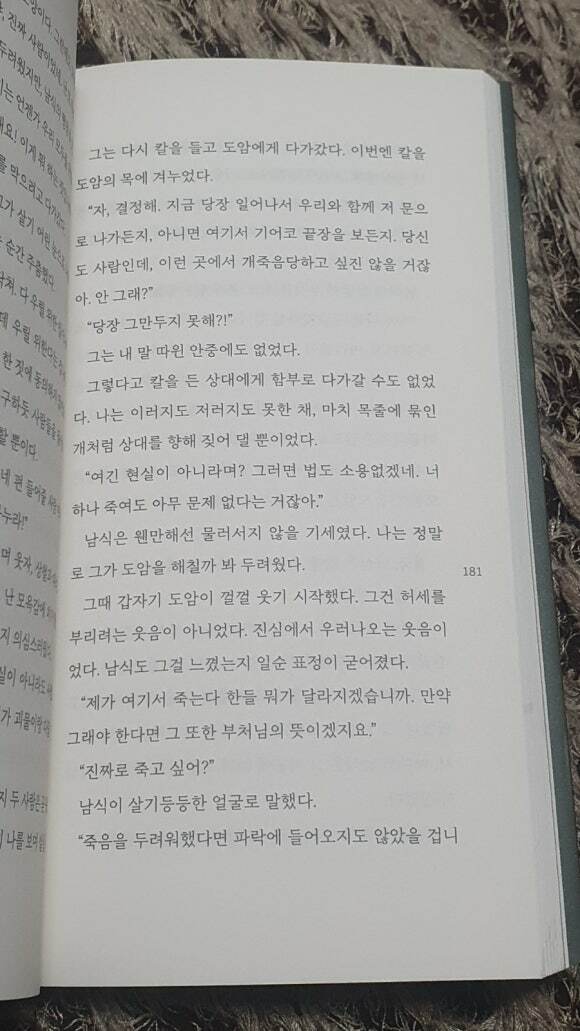
"새끼 밴 짐승은 흉작 때도 안 잡는데, 애 밴 아낙을 어떻게 내칩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말을 나눌 때, 닫혔던 사당 문이 열렸다. 태주에 현이 있을 때라, 바깥어른이 제례를 마친 당골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리 소란스럽지도 않았는데 ,당골 어른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다. 당골 어른이 사람들 모인 곳으로 향하자, 당황한 바깥 어른이 그 뒤를 따라 뛰어왔다.
(-22-)
"나루 아재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영사 나리가 그랬다니까요.네가 월국 사람이면서도 역을 피해 이 고장으로 숨어든 걸 안다고.사실, 나루 아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사 나리가 어떻게 아셨겠어요." (-109-)
곧바로 손이 날아왔다. 힘을 주고 때렸는지 선해의 몸이 옆으로 크게 휘청거릴 정도였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나도 당황해서 순간 입을 떼지 못했다.
남식은 손쉽게 선해를 제압한 뒤, 그녀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이미 뺨을 얻어 맞은 순간 선해는 저항할 의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179-)
대석은 절망에 사로잡혀 자기 머리카락을 거칠게 쥐어 뜯기 시작했다. 그가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혔고, 심지어 두피가 벗겨지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허옇게 뒤집힌 눈에서는 실핏줄이 터져 피눈물이 흘렀고, 그의 육중한 몸은 활처럼 뒤로 꺾이더니 결국엔 척추가 부러지고 말았다. (-240-)
"날 구원해 줬잖아.이곳에서 네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어.그러니까 돌아가.내가 미처 못 이룬 것까지, 가서 모두 이루렴.그럼 내가 멀리서 칭찬해 줄게.그리고 , 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지 마." (-288-)
매드 앤 미러 시리즈 두 번재 이야기, 소설 『사라진 아내가 차려 준 밥상』은 작가 구한나리, 신진오 가 두 편의 중편 소설 「삼인상」, 「매미가 울 때」 를 써내려 가고 있었다. 이 두 편의 소설에는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었으니, 책 제목과 같은 '사라진 아내가 차려 준 밥상' 이 두 편에 공통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삼인상」 가 흥미로웠다. 지금은 대한민국 인구 대부분이 도시에 나와 살고 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인구보다, 도시에 나와서,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더 많은 세상이다. 하지만,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동네는 1차 산업, 농사가 중심이 되는 시골이면서, 화척이 존재했던 마을 고을이다. 이 곳에 정착해 사는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전쟁을 피헤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살아가고 있으며, 당골 어른과 상달고사가 해마다 열리곤 하였다. 이 묏맡골의 삼인상에 예고하지 않은 외지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두 컴컴한 곳에 산짐승,들짐승을 피해 , 배가 불룩한 아낙네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 외지인을 쉽게 들이지 않았다. 역병이 창궐할 수 있으며, 서로 숟가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듦끼리 지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다. 하지만 배가 불룩한 아낙네가 들어오고 마는데, 묏맡골의 당산 어른의 말에 따라서, 그 여인을 묏맡골에 들이게 된다. 그리고 현이가 나왔다. 이 소설의 이야기 전개도 중요하지만, 묏맡골 사람들의 정서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이 소섫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였다. 화척이라는 단어가 소설에 나오는데,그 말은 외지인,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추방된 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처럼 개개인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 세상과 달리, 각 고을마다 수호신 역할을 하는 당산나무를 모시고 있고, 당산나무 제례를 관장하는 당산어른이 존재했다. 물론 근거 없는 미신이 있었으며, 동네에 역병이 돌게 되면, 무당을 불러서, 역병을 무찌르는 무속신앙도 존재한다 삼인상이란 결국 혼자서 밥을 먹지 않으며, 둘이 먹더라도 삼인에 해당하는 밥상을 차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눈길을 끌었던 요소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