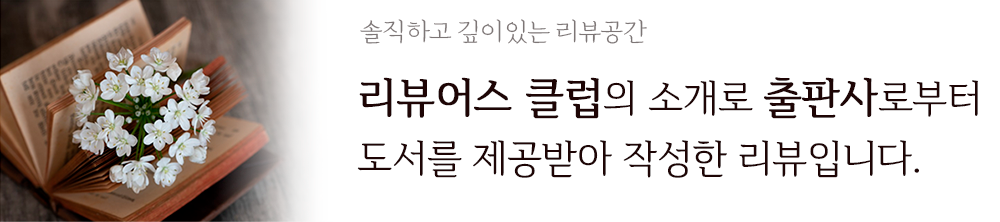-

-
함께여서 다행이야 - 엄마와 나, 둘이 사는 집에 고양이가 찾아왔습니다
모리시타 노리코 지음, 박귀영 옮김 / 티라미수 더북 / 2021년 10월
평점 :

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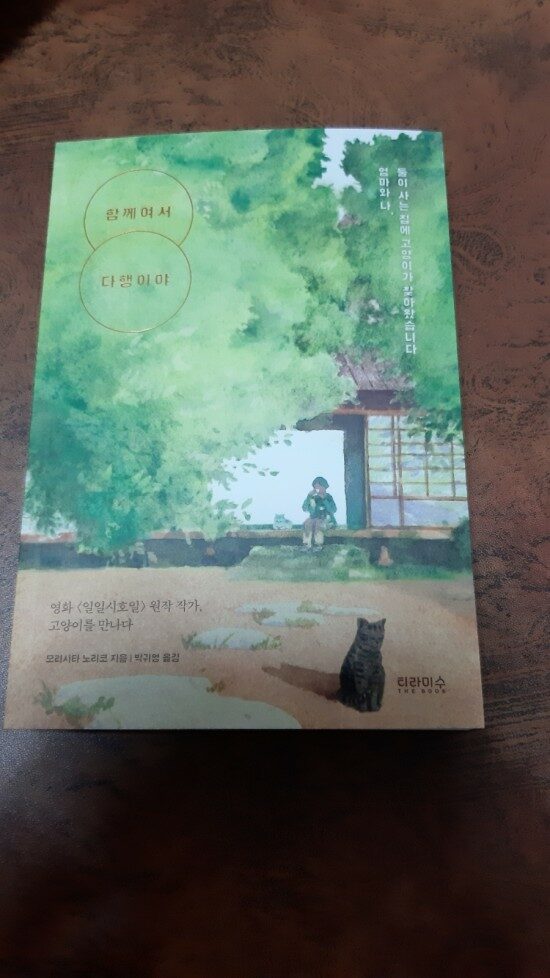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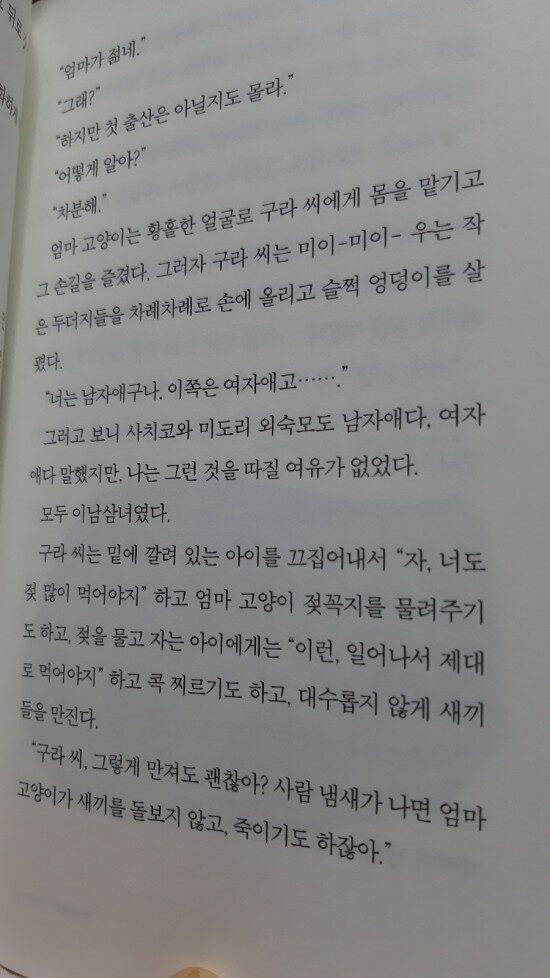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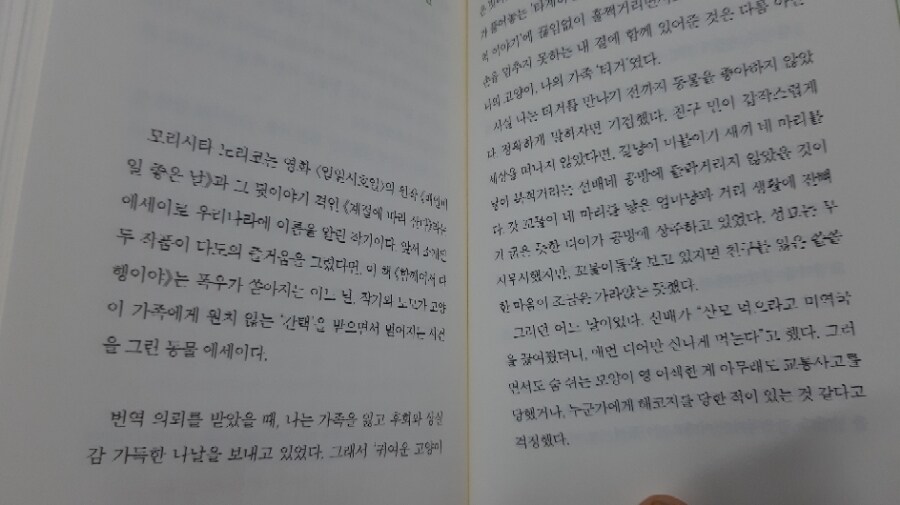
일흔 다섯인 엄마가 샌들을 끌며 옹벽을 따라 난 계단을 한 칸 한 칸 무겁게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리고, 우편함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절그럭 났다.
그 직후였다.
"엄머!"
엄마가 계단을 급히 내려와 현관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뛰어 들어와 외쳤다.
"큰일 났어!"
"무슨일이야?"
"길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13-)
"혼자 사는 여자가 고양이를 키우면, 솔로를 각오했다는 의미야."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말한다. 결혼 안 한 여자의 인생은 쓸쓸하다고 단정 짓는 듯한 심술궂은 말투에 여러 번 상처받으며 고집스럽게 살아온 탓인지, 어쩐지 세상이 말하는데로 되는 것만 같아 솔직해질 수가 없었다.,... 아니,이건 한낱 변명인지도 모른다. (-66-)
분명 전에는 나도 시즈짱이 가여웠다. 눈곱이 심했던 시절의 시즈짱은 아래 눈꺼풀을 뒤집어 메롱을 하는 것 같은 상태여서 불쌍했다. 새끼 고야이를 보러 온 사람들은 다로와 지로를 보고 귀엽다고 하다가 시즈짱의 얼룩투서이 얼굴에 시선이 닿으면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다.
"어머,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다로는 형제가 떠난 뒤에도 혼자 새끼 고야이 기분을 만끽했다. 사료는 이미 미미와 똑같은 것을, 때로는 미미 몫까지 먹는다. 체격도 미미에 육박할 기세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미미의 배 아래로 머리를 들이밀어 억지로 젖을 먹는다. 미미는 싫어하며 히스테릭하게 새된 소리를 지르고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친다. 그렇게 하는데도 달려들어 떨어지지 않으면 아들의 머리르 맹렬하게 '뒷발 팡팡' 하고 ,그대로 맞붙어 모자간 싸움이 벌어졌다. 어느새 몽글 부풀었던 미미의 유방도 작아져 있다. 전에는 그르르르, 그르르르 하도 비둘기 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새끼 고양이들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162-)
"붉은귀거북도 사람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요. 탁탁 바닥을 두드려서 사람을 부르고, 같이 탕에 들어가 씻겨주면 첨벙첨벙 기버합니다.오랫동안 함께 지내서 붉은귀거북의 희노애락이 느껴져요." (-214-)
선배가 "산모 먹으라고 미역국을 끓여줬더니,애먼 디어만 신나게 먹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숨 쉬는 모양이 어색한게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해꼬지를 당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255-)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라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든 소중하다. 길고양이 미미가 낳은 다섯 새끼고양이 다로,지로, 구로 ,시즈짱,나나, 각자 다른 개성있는 외모와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씩씩하게 하악질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어맘 미미 몸에서 동시에 테어난 다섯 고양이를 품어주는 주인공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여섯 고야이를 통해서 터득하게 되었다.
그런거다.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이기적이며 교만하다. 그런 모습이 서서히 깨지고, 그안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주섬주섬 담아가고 있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새끼고양이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기 고양이 다섯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긷자려주고, 참아줄 줄 아는 어미 고양이 미미,때로는 성인냥이가 되어, 덩치가 미미와 동급이지만, 여전히 미미의 젖을 찾아다니고, 미미의 품속으로 찾아들어가고 있었다.
생명이란 그런 것이다. 인간만이 느낀다고 생각해왔던 그 샘명의 오묘함,그것이 만물의 모든 생명체에게 통용되고 있었다.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것, 서로 따스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존의 기술을 터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었으며, 삶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둘 얻어나가고 있었다. 살아가고, 삶을 도모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삶의 코드들, 그것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고, 때로는 서로를 걱정하면서, 생명과 생명을 연대할 수 있도록 삶을 영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