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은 가을도 봄
이순원 지음 / 자음과모음(이룸) / 2020년 7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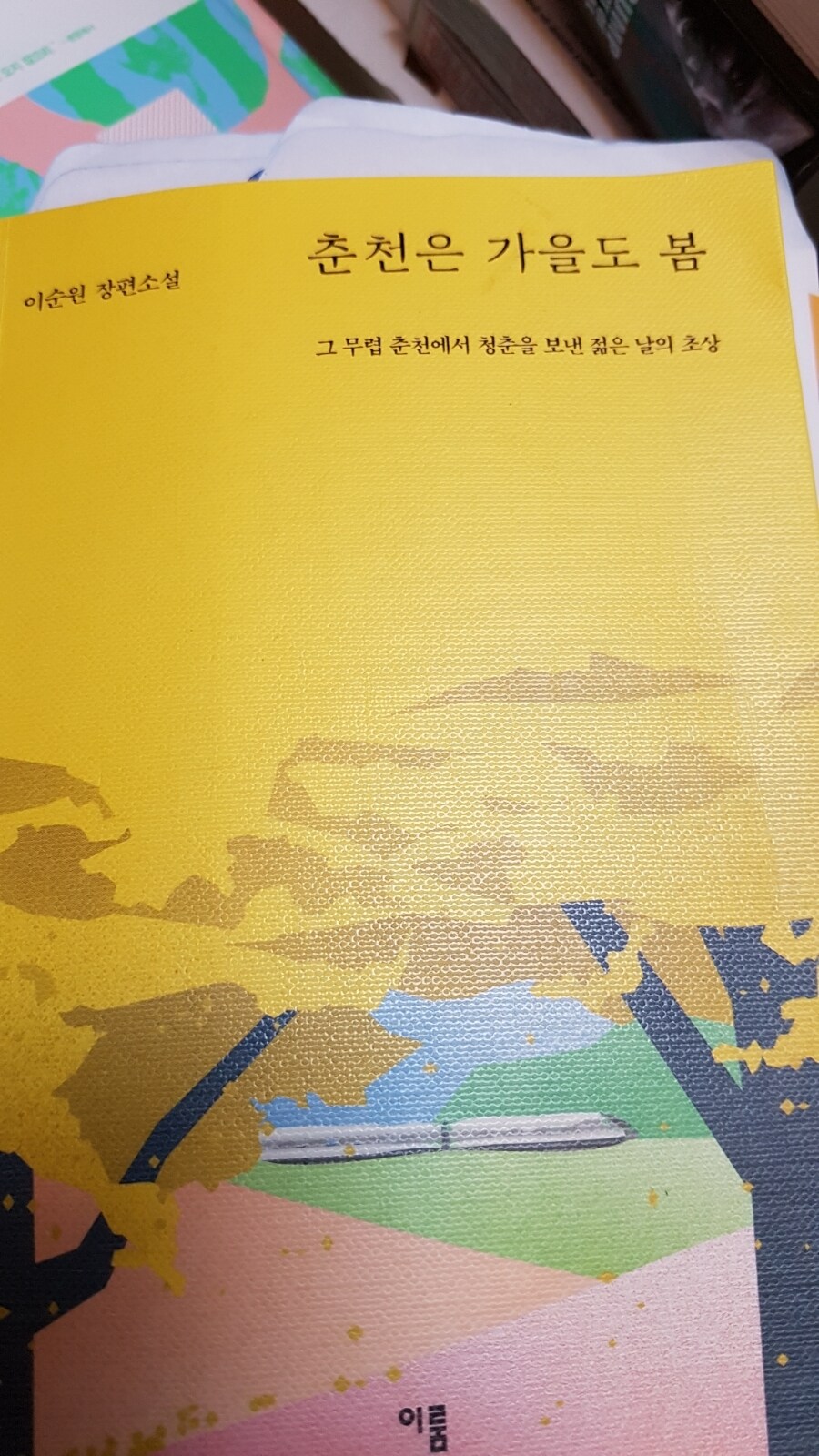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뒤늦게 돌아온 할매의 성화에 못 이겨 닭갈비집의 뜨거운 화덕 앞으로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다.지금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춘천에서 가장 싼 음식이 닭갈비였다.한여름에도 절대 불을 끌 수 없는 연탄 화덕 서너 대를 찜통같은 술ㄹ청에 놓고 일 인분, 이 인분으로 팔지 않고 닭의 뼈를 바르지 않은 채 한 대 두 대 단위로 잘라 팔았다. (-61-)
그리고 채주희
그녀를 만난 건 새 학기가 막 시작된 3월 아침의 일이었다.그날 나는 얼굴도 모르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입학식장으로 갔다.식이 시작되자마자 축복처럼 함박눈이 내렸던 기억이 난다.신입생 입학 소감은 수석합격자의 글을 미리 받아 학보에 실어 입학식장에서 나누어 주었다.그녀에게 부탁할 원고는 앞으로 한 달 후인 4월 첫 주 신문에 나갈 '나의 대학 생활'에 대한 글이었다. (-161-)
박정희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박정희는 물러가라 훌라훌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훌라훌라
독재정권 물러가라 훌라훌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훌라훌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훌라훌라. (-221-)
"괜한 짓 하지 마라.네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다만 나는 명진보다 여기가 편하다.네가 날 생각한다면 그냥 이대로 있게 놔둬라.더 어둡기 전에 둥지를 떠나야 할 새가 있고, 둥지에 불러들여야 할 새가 있다.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내게 이제 부족한 건 술뿐이니까.네가 꿈꾸는 일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296-)
'나'는 남들을 거울로 삼으며 자라난다. 하지만 거울이 깨지면서 진정한 자신을 아프게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나'가 주희를 사랑한 건 그녀와 자신이 닮았다고 생각해서였다.외롭고 남다른 그녀에게서 자신을 본 것이다.아웃사이더란 처지, 어디에도 자리를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영혼이란 점에서 둘은 닮은 꼴이다.그런 의미에서 '나'가 주희에게 품은 연민은 자기 연민에 가깝다. (-352-)
소설 속 김진호는 있는 집 자식이었다.1970년대 유신철폐,5공 의 서슬퍼런 그 시대에 서울대를 입학하였던 진호는 양조집 아들로서 승승장구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금수저집 아들이었다.문중이 있었고, 정치에 입문하였던 아버지가 있었으며,집안을 일으킬 사냄매중 둘째 였던 진호는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대학에서 사고를 치고 말았다.데모를 하였고,유신철폐를 외치면서,. 그 시대에 반기를 들게 된다.온전히 이십대 청춘, 장발을 길렀던 그 시대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던 진호는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주연이 된다.
그리고 진호는 채주희를 만나게 된다.서로가 뜻이 맞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동지로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통행금지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사랑이 있었고,연애가 있었고,남녀가 서로 섞여 살았다.소설 속에서 하숫집,여관방이라는 단어나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 시대에 대한 향수의 발자취 때문일 것이다.
괜한 짓 하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이 두가지 단순한 문장은 그 시대의 표상이 되었다.그리고 우리는 알게 된다.괜한 짓 하다가는 시대적인 폭련에 맞서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고,공권력에 의해서 저지되었다.계엄령이 선포되었고,대학생들이 서로 연대하여서,시대의 권력에 맞서게 된 것도 그무렵이었다.지금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보가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였다면, 그 시대에 출판되는 학보사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숨쉴 수 있는 소통구였다. 소설은 그렇게 대학 학보를 매게체로 삼아서 진호와 주희의 서로 다른 삶을 고찰하게 된다.나와 너의 삶,남자와 여자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그 삶의 기준점이나 추구하는 바는 서로 흡사하였다.
소설은 고무적이었다.해마다 가을철이면 춘천에는 메이저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대회가 끝나면, 사람들은 모여서, 춘천닭갈비를 단골처럼 먹곤 하였다.춘천 닭갈비는 뼈없는 닭을 넣고 비벼서 먹는 맛이 제격이었다.소설 속에서 닭갈비는 지극히 서민적인 음식이었고,닭을 통째로, 연탄불에 올려놓은 또다른 향수였다.이 소설 속에서 느껴졌던 다양한 기분들이 독특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나와 너의 섦이 비록 다르지만, 그 안에 공존하는 삶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