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죽음 앞에 매번 우는 의사입니다 - 작고 여린 생의 반짝임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스텔라 황 지음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24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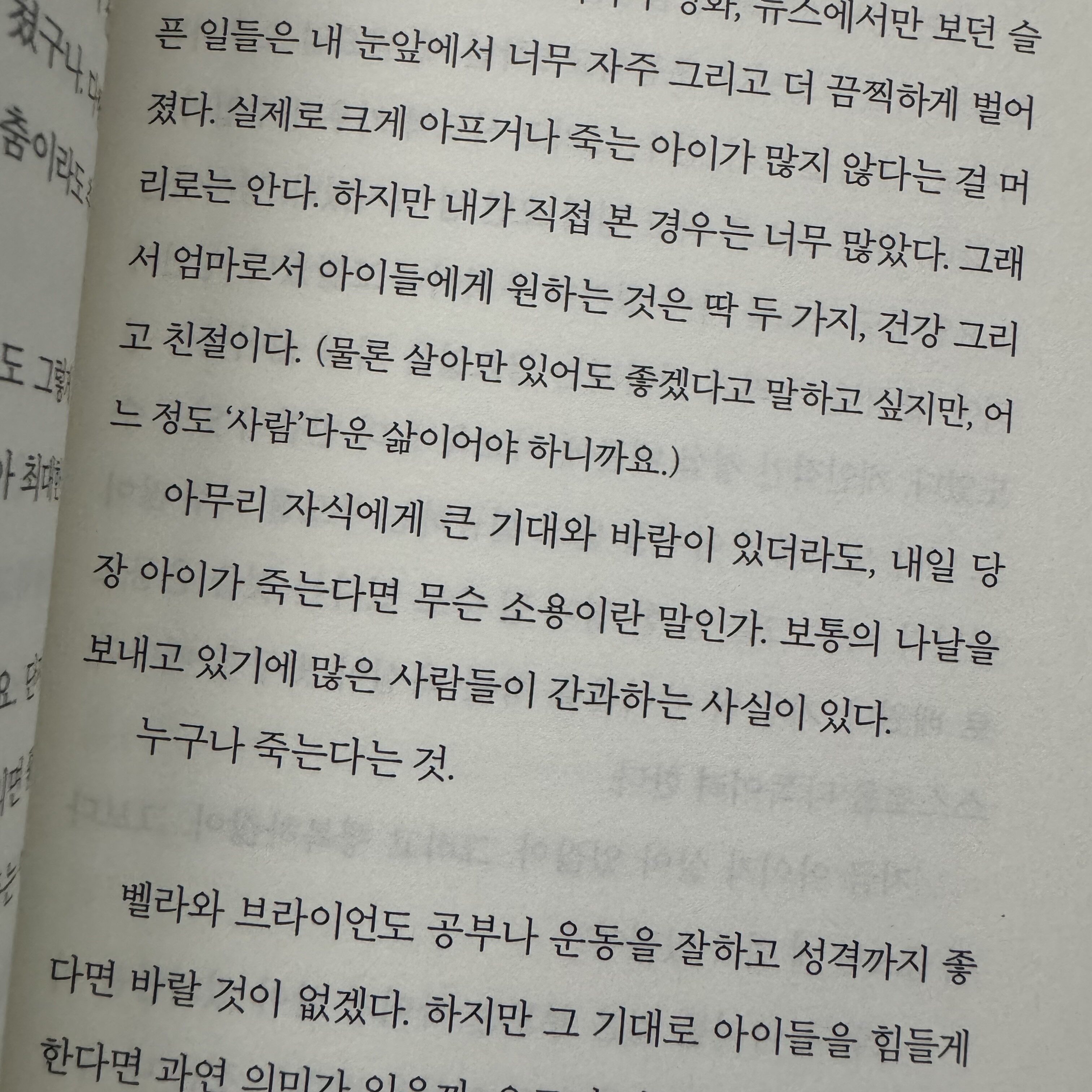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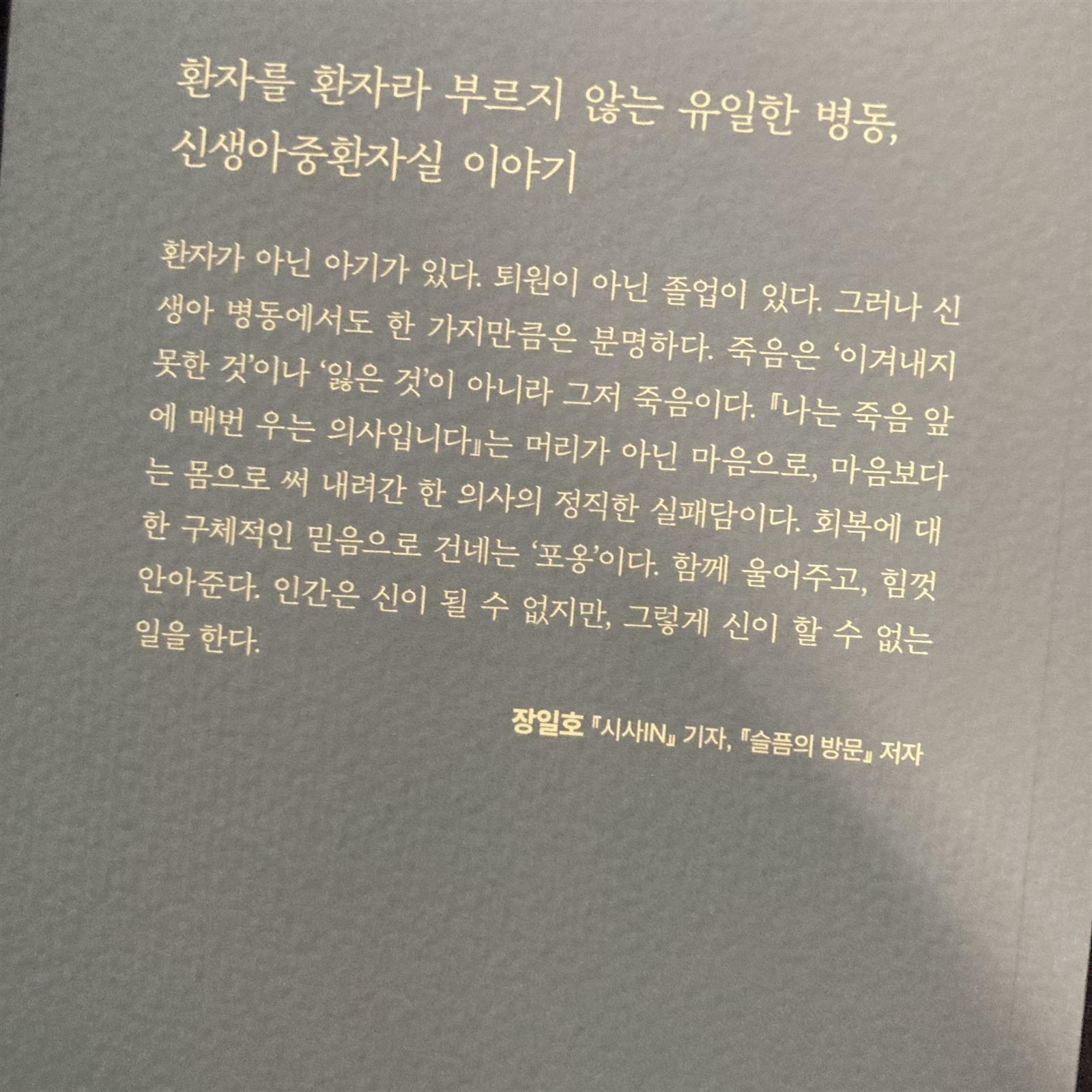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아기의 생명을 구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 p.7
요즈음 집에 환자가 있다 보니 본의 아니게 대학 병원을 자주 방문하게 되는 편이다. 병원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새삼스럽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목격한다.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렇게까지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아리는 모습 중 하나인데 인간 자체가 왜 이렇게 아프게 태어난 존재인지 신이나 다른 조물주에 원망스러움도 섞인다.
이 책은 스텔라 황이라는 미국 의사의 에세이다. 아무래도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환자를 간병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될 것 같아 선택하게 되었다. 평소 소설이나 직업에 대한 에세이를 자주 읽는 편이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픈 사람의 이야기, 그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일상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읽을 거리를 찾던 중 발견했다. 나름 기대를 가지고 페이지를 넘겼다.
저자는 아버지의 암 투병 이후 호스피스 병원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고 한다. 열아홉 살에 미국으로 건너가 신생아 중환자실 의사가 되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저자의 직업을 인지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유, 생과 사가 넘나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의사로서 느끼는 감정들, 더 나아가 미국의 의료 환경 등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에세이여서 술술 읽혀졌다. 기대를 가진 만큼 걱정이 되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의사라는 전문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또는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과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의료 문화나 개념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부분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걱정은 쓸데없었다. 상황을 설명하는 문체가 아닌 의사로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정리한 이야기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읽혀졌다.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지점이 인상적이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다. 저자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의 암 투병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처음 듣는다. 임종 면회에서 아버지께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막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무뚝뚝한 K-장녀였던 저자가 미국에서 동료 의사의 한마디를 들으면서 놀랐다는 이야기인데 읽는 내내 감정이 교차했다. 하나는 저자의 모습에서 보였던 동질감, 또 하나의 감정은 부끄러움이다. 불과 며칠 전, 가족의 면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건넸던 동생과 달리 그저 모습을 눈에 담기만 했던 자신이 다시 떠올랐다.
두 번째는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아무래도 전공 자체가 사회복지여서 대학교 시절부터 미국의 건강보험을 자주 듣고 또 배웠다. 특히, '식코'라는 미국의 다큐멘터리는 매년마다 보게 될 정도로 익숙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만큼 건강보험 시스템이 복지적 측면에서는 약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하는 건강보험 이야기는 생각을 깨기에 충분했다. 공공 의료보험으로 억 단위의 치료비가 나왔지만 환자 가족들은 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알고 있었던 게 무너진 느낌이다. 이 또한 이야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완전히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겠지만 새로운 내용이어서 흥미로웠다.
생과 사가 오가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누구보다 나의 자녀처럼 사명감을 가진 저자의 태도에 많은 교훈을 얻었다. 나 또한 직업인으로서 매일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읽는 내내 병상에 누워 있는 가족, 얼굴도 모르지만 중환자실에서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입원해 세상을 떠난 십 대의 어린 친구 생각이 사무치게 들었던 에세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