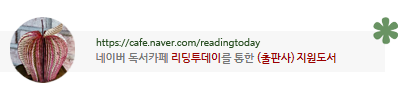-

-
삼켜진 자들을 위한 노래
브라이언 에븐슨 지음, 이유림 옮김 / 하빌리스 / 2024년 2월
평점 :




마치 이곳에 오랜 시간, 어쩌면 영원히 머물렀던 것처럼. / p.26
이 책은 브라이언 에븐슨이라는 미국 작가의 소설집이다. 신비로운 느낌을 받아 선택하게 된 책이다. 종종 언급했던 것처럼 호러 장르가 취향과 거리가 멀고, 영미권 소설을 그렇게 즐겨 읽지 않는 편이었다. 거기에 요즈음 철학 또는 에세이 등 소설이 아닌 장르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보니 소설에 다시 맛을 들일 때가 왔다는 생각으로 고르던 중 눈에 보였던 책이다. 사실 기대보다는 절반만 이해하자 라는 생각으로 책장을 넘겼다.
소설집에는 총 스물두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두 장 정도로 가볍게 끝나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책장을 넘겨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작품도 있었다. 인간의 어두운 면 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분위기를 주었던 작품들이 많다.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호러 픽션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읽는 내내 공포감을 주었다.
짧은 흐름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 술술 읽히기는 했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 현실성은 크게 보이지 않았는데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읽어야 했기 때문이다. 평소에 공상이나 망상을 자주하는 스타일이었다면 나름 창의성을 발휘해 마치 영상 매체처럼 스토리를 그려냈을 텐데 두세 번 읽어도 어떤 존재인지 그려지지 않으니 문장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읽어야 했다. 그러나 분위기만큼은 압도적이었던 작품집이었다.
개인적으로 두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룸 톤>이라는 이름의 작품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다. 잠깐 주인이 비어 있는 집에서 촬영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배우들과 여러 제작진들이 모여, 그 집에서 촬영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집을 더 빌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중개자는 이후 이사 올 사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다. 급하게 영화 촬영을 마무리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라고 불리는 '룸 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사 올 사람에게 재요청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인공의 부탁을 거절한다.
작품들 중에서 가장 현실감 있게 와닿았던 작품이었다. 좋게 말하면 직업 정신이자 나쁘게 말하면 광기를 다룬 작품이었다. 결말을 읽은 상황에서 후자에 더 가깝기는 하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몰입하는 것도 모자라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는 게 과연 직업 정신이나 열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사를 올 사람이었다면 주인공의 요청에 수락했을 테지만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었는데 결론적으로 주인공의 그 끔찍한 광기가 읽는 내내 소름을 돋게 했던 작품이었다.
두 번째는 <안경>이라는 작품이다. 시력이 안 좋은 한 여성의 이야기다. 평소에 안경을 쓸 일이 없었던 게이르는 마흔이 넘어 노안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안경을 새로 맞췄다. 남편은 누진 다초점 렌즈를 권유했지만 이미 안경을 구입했기에 다음에 제작하게 된다면 누진 다초점 렌즈로 구매하겠다고 했다. 집회가 있어 기차를 타고 나갔던 게이르가 일이 생겨 집회에 늦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난 것이다. 근처 안경집에 들어가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을 구매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안경집의 주인은 없다고 말한다. 이중 초점 렌즈인 바이포컬스를 맞추겠다 했는데 안경집 주인은 이상하게 그 렌즈로 된 안경을 구입할 것인지 여러 번 되묻는다.
평소 안경을 착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신비로우면서도 살짝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게이르가 겪었던 일들이 어쩌면 주변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몰입이 되었다. 누진 다초점 렌즈라든지, 이중 초점 렌즈라든지 용어들이 노안 시기로 접어든 부모님의 안경을 맞추면서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터라 반갑게 읽혔다. 그러면서 노화라는 시간의 흐름이 너무나 잘 느껴져서 마음이 묘하게 아팠던 작품이기도 했다.
호러 장르의 작품집이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하나의 환상 소설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으로는 상황이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에 홀려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던 작품집이었다. 그만큼 알 수 없이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작품들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에 읽는다고 해도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물음표를 달면서 재독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작품집이어서 흥미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