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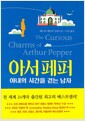
-
아서 페퍼 - 아내의 시간을 걷는 남자
패드라 패트릭 지음, 이진 옮김 / 다산책방 / 2017년 12월
평점 :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69세 홀아비 아서 페퍼, 아내의 숨겨진 과거를 찾아 여행을 떠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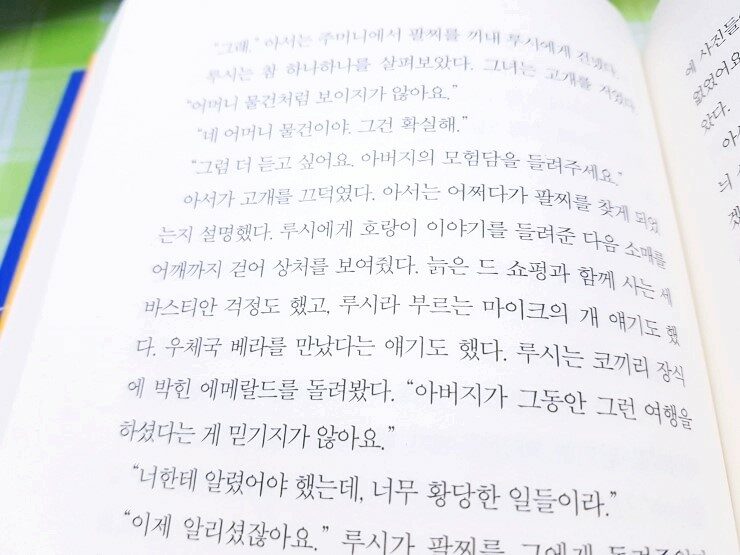
꼭 1년 전 오늘, 그의 아내가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죽었다라는 말이 욕이라도 된다는 듯이. 아서는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증오했다.
그 말은 잔물결이 일렁이는 운하를 가르며 지나가는 보트처럼, 혹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떠다니는 비눗방울처럼 온화하게 들렸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그렇지가 않았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제 이 집엔 그 혼자만 덩그라니 남았다. 침실이 세 개인 이 집엔, 장성한 딸 루시와 아들 댄이 연금으로 시공하라고 했던 침실에 딸린 샤워 룸도 있었다. 새로 시공한 주방은 너도밤나무 원목에 나사 우주 관제 센터에나 있을 법한 레인지가 달려 있었다. 혹시라도 로켓처럼 집이 발사될까봐 아서는 그 레인지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집에서 울려 퍼지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립던지. 계단을 뛰어다니는 발자국 소리, 심지어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마저도 너무나 듣고 싶었다. 층계참에서 떨어져 뒹구는 빨래 한 무더기가 그리웠고 현관에서 진흙 묻은 장화에 걸려 넘어지고 싶었다. 아이들은 그 장화를 웰리밥이라 부르곤 했다. 혼자 사는 삶의 정적은 그가 불평했던 그 어떤 생활 소음보다도 그의 귀를 먹먹하게 했다. (p.10-11)
주인공 아서 페퍼는 매일 아침 아내 미리엄이 살아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7시 30분에 침대에서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전날 밤 꺼내둔 옷을 입고, 면도를 하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침식사를 하고 8시 30분이 되면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매일 꾸역꾸역 견뎌내는 일상의 반복. 꼭 1년 전 오늘 그의 아내가 폐렴으로 그의 곁을 떠났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 끝에 이제 이 집엔 그 혼자만 덩그라니 남았다. 그와 아내 미리엄은 서로 너무나 사랑했고, 모든 걸 함께 했다. 그래서 그 상실감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이 깊었다.
몇 주 전 마지막으로 딸 루시와 통화했을때 그녀는 유품을 정리하라고 말했다. 정리하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꺼라면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살고 있는 아들 댄은 집 안을 박물관으로 만들지 말고 다 내다 버리라고 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대체 어디로 나아가란 말인가. 그의 나이는 예순아홉이었다. 10대 청년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라니. 물론 그도 알고 있다. 언제까지고 그녀를 붙잡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걸 이제 그는 그녀를 그의 삶에서 걷어내야 했다.
그는 천천히 거울 달린 옷장 문을 열었다. 아내의 옷장을 정리하는 건 그녀에게 다시 한번 이별을 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옷장에서 장미와 은방울꽃이 섞인 그녀의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는 이 모든 게 악몽이고 그녀가 아랫층에 있길 바랬지만 다 부질없는 꿈일 뿐이다. 이 일을 미루고 싶지만 해야만 했다. 신속하고도 조용히 일을 처리하며 정리를 반쯤 끝내고 신발을 정리하는데 부츠속에서 하트모양의 상자를 발견했다. 그 속에는 묵직하고 둥근 고리들과 하트 모양의 잠금장치가 달려 있는 화려한 금팔찌가 담겨 있었다. 독특한 건, 코끼리, 꽃, 책, 팔레트, 호랑이, 골무, 하트, 그리고 반지 모두 여덟개의 참들이 달려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아내를 위해 이런 선물을 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좋아했다. 아무리 기억하려 애써봐도 미리엄이 그 팔찌를 끼고 있는 걸 본 기억도, 참을 그에게 보여준 기억도 없었다.
미리엄의 옷을 처분하는 건 하나의 의식이었고, 그녀의 물건들, 그녀의 신발들, 그녀의 세면도구로부터 이 집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다. 상실감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한 걸음이었다. 그러나 새로 발견한 참 팔찌는 그런 그의 의지를 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 팔찌는 의문이 없던 곳에 의문을 제기했다. 팔찌가 하나의 문을 열었고 그는 그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코끼리 참을 시작으로 참 하나하나에 담긴 그녀의 추억들을 추적해나가기 시작한다.
책을 읽다보면 정말 이처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서가 미리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곳곳에서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녀는 비록 그의 곁에 없지만, 그녀가 떠나고 나서도 그녀는 언제나 그와 함께였다. 보이는 곳마다 그녀와 함께 한 추억들이 고스란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상실감이 컸던 만큼 아내의 옷을 정리하다 발견한 팔찌에 그가 받았을 충격과 분노는 아무도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충동적으로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뭔가에 이끌리듯 코끼리 참에 새겨진 번호를 눌렀고 전화를 받은 메라씨를 통해 그가 한번도 그녀에게 듣지 못한 아내의 과거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의 미리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참에 담긴 사연들을 추적하기에 이른다.
아마 그가 거기에서 멈추었다면 살아가는 내내 그는 나쁜 상상으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과거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이 여행은 그의 내면에 있는 무언가를 휘저어 놓았다. 이건 더 이상 미리엄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다. 아서가 발견한 건 결국 그 자신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속에서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령 드 쇼펑이라는 작자에 대해 아서가 느끼는 감정이 불안과 질투라고 해도, 그 감정으로 인해 그는 살아 있음을 느꼈다. 미리엄이 죽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하루종일 우울한 표정으로 서성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여행은 그가 그녀에 대해 알지 못했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아내의 행적을 쫒으며 그를 만나기 전에 미리엄이 이토록 충만하고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된 지금 그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혹시나 그녀를 숨막히게 했던 것은 아닌지 후회를 하기도 하지만 이내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다.
아내가 남겨놓은 팔찌가 가져다준 파장은 실로 엄청났다. 규칙적인 일상을 좋아해 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웬만해선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던 그가, 일상의 조화가 깨어진다는 생각 만으로 이마에 진땀이 나던 그였지만 아내의 과거를 쫓으며 자신이 평소라면 절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다. 왜 새로운 것들에 좀 더 마음을 열고 살지 못했는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후회를 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기 시작한다.
그냥 생각만하고 그대로 있기만 했다면 모든 것이 그대로였겠지만 아서는 아내의 발자취를 따라 과거를 쫒으며 낯선 환경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하고 받기도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며 보다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변화하며 성장해 나간다. 아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 때문에 크게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역경을 딛고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삶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