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 유년의 기억, 박완서 타계 10주기 헌정 개정판 ㅣ 소설로 그린 자화상 (개정판) 1
박완서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1년 1월
평점 :

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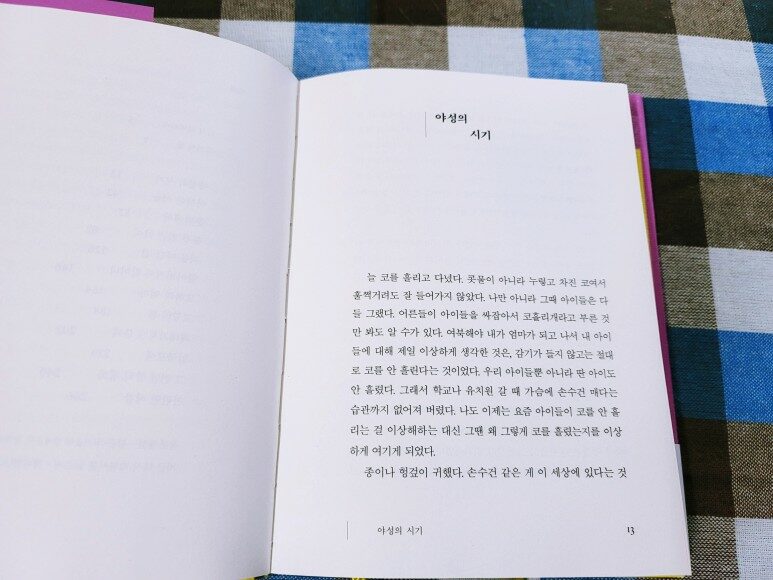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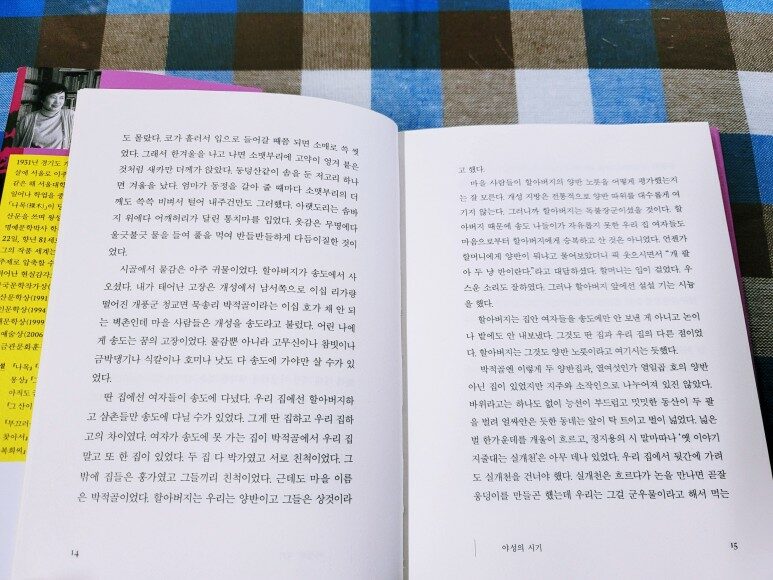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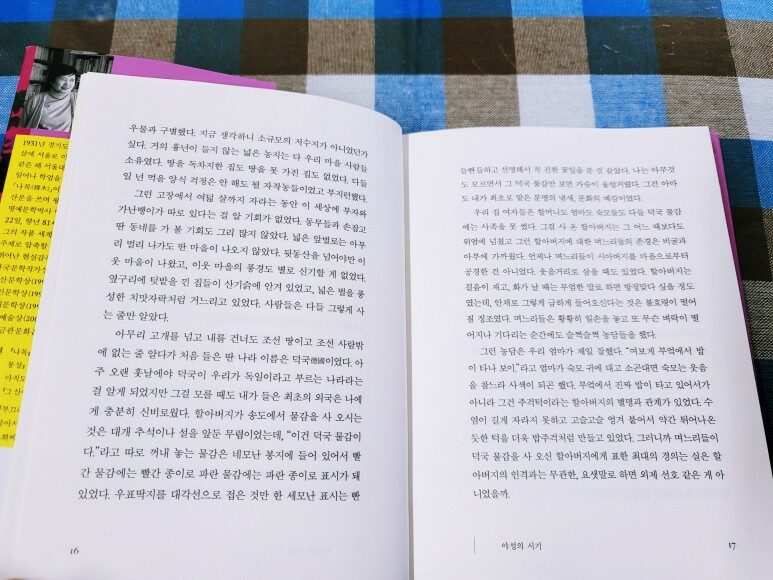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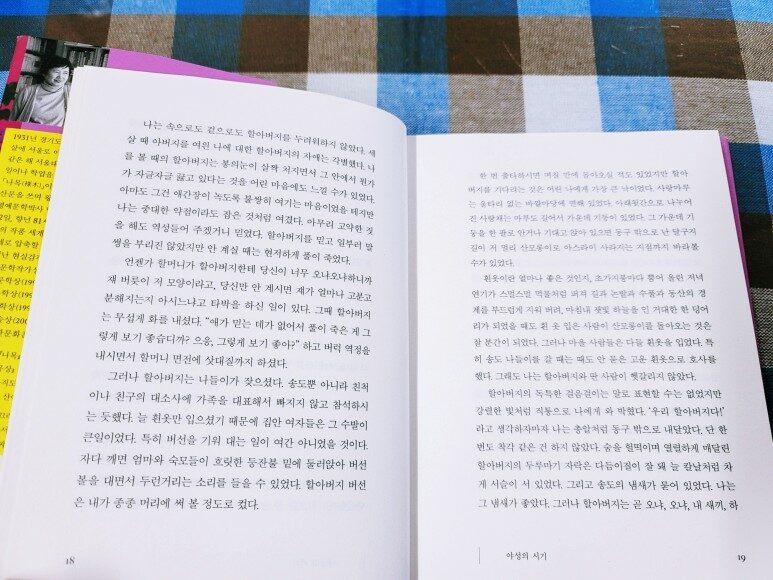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다. 자연이 한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니까 우리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귀를 씨 뿌리고, 싹트고 줄기 뻗고 꽃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 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부산함을 앞지르지 못한다. (p.30)
나는 불현듯 싱아 생각이 났다. 우리 시골에선 싱아도 달개비만큼이나 흔한 풀이었다. 산기슭이나 길가 아무 데나 있었다. 그 줄기에는 마디가 있고, 찔레꽃 필 무렵 줄기가 가장 살이 오르고 연했다. 발그스름한 줄기를 꺾어서 겉껍질을 길이로 벗겨 내고 속살을 먹으면 새콤달콤했다. 입 안에 군침이 돌게 신맛이, 아카시아꽃으로 상한 비위를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일 것 같았다. 나는 마치 상처 난 몸에 붙일 약초를 찾는 짐승처럼 조급하고도 간절하게 산속을 찾아 헤맸지만 싱아는 한 포기도 없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나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헛구역질을 하느라 그곳과 우리 고향 뒷동산을 헷갈리고 있었다. (p.89)
내 꿈의 세계 창밖엔 미루나무들이 어린이 열람실의 단층 건물보다 훨씬 크게 자라 여름이면 그 잎이 무수한 은화가 매달린 것처럼 강렬하게 빛났고, 겨울이면 차가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힘찬 가지가 감화력을 지닌 위대한 의지처럼 보였다. 책을 읽는 재미는 어쩌면 책 속에 있지 않고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창 봐 온 범상한 그것들하곤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낯섦에 황홀한 희열을 느꼈다. (p.158)
한국 문학의 거목, 박완서 선생님 타계 10주기 헌정 개정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출간된 지 20여 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한국 소설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이자 중·고등학생 필독서로 남녀노소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으로 오롯이 본인의 경험만을 써내려간 자전적 소설이다. 1930년대 개풍 박적골에서 보낸 꿈같은 어린 시절과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 산동네로 이사하여 겪은 문화적 충격, 1940년 일제강점기 국민학생으로서의 기억, 창씨개명 경험, 세계 2차대전의 종결, 서울대 입학, 그리고 1950년 6·25전쟁과 함께 스무 살을 맞이한 작가의 유년 시절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강한 생활력과 유별난 자존심을 지닌 어머니와 이에 버금가는 기질의 소유자인 작가 자신, 이와 대조적으로 여리고 섬세한 기질의 오빠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1930년대 개풍 지방의 풍속과 훼손되지 않은 산천의 모습, 생활상, 인심 등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1930년대부터 1950년까지 그녀가 삶의 여정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 현대사의 변화가 눈앞으로 생생하게 펼쳐진다. 작가 본인에게는 고통스러웠을 법한 기억일지도 모르나, 고향에 지천으로 자라던 싱아처럼 그 시절 순수했던 작가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을 함께 보낸 독자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자신이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새롭고 신선한 경험의 시간이다. 정말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함이 없다. 매번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다. 정말 좋은 작품. 이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을 듯하다. 모두 꼭 읽어 봐야 하는 필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