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 33가지 죽음 수업
데이비드 재럿 지음, 김율희 옮김 / 윌북 / 2020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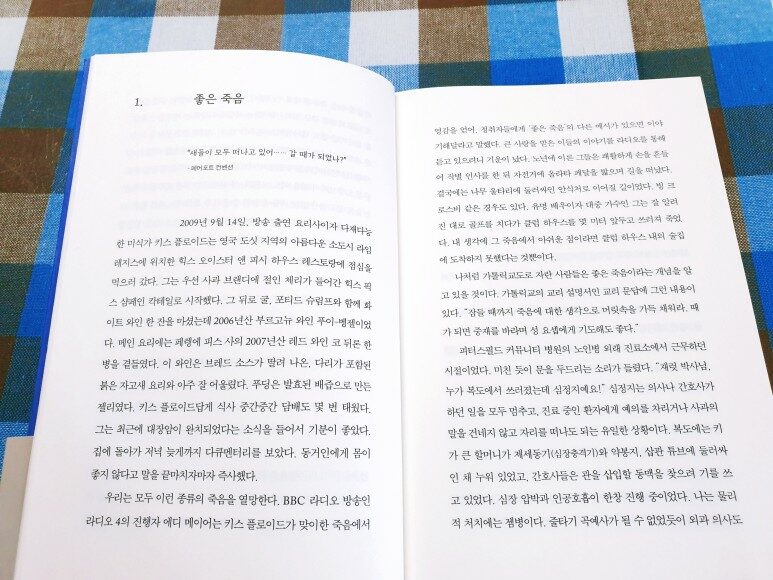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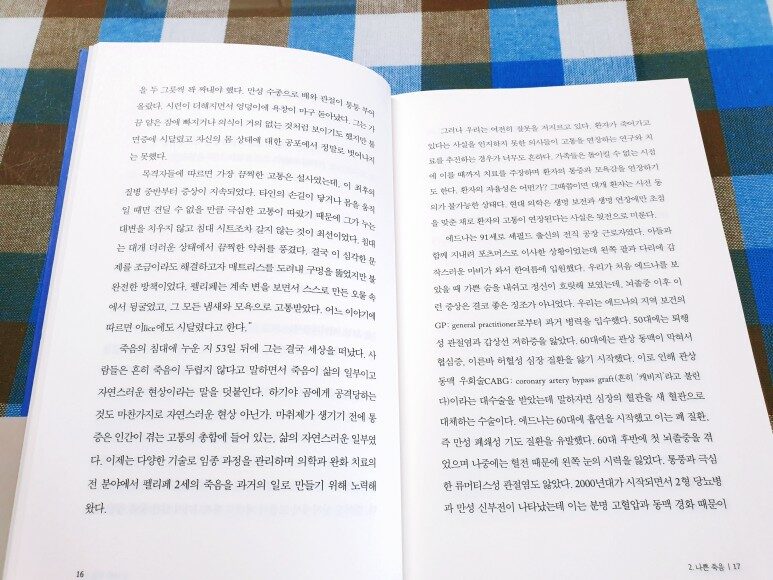

지침은 지침일 뿐, 규약이 아니다. 환자는 로봇이 아니라 개별적 인간이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한 개인이 살아온 삶의 맥락이 무시될 때가 많다. 의사에 대해 옛날식의 존경심을 품은 노인들은 현대 의학의 월권행위에 특히 취약하다. 의학적 조언에 도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건강에 거의 혹은 아예 도움이 되지 않고, 어쩌면 무척 해로울 수 있는데도, 걸핏하면 그들은 자신이 대체로 이해할 수 없는 기술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나는 병원이 모두를 위한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p.132)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양자택일로 생각한다. 살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일종의 스펙트럼이다. 나이를 먹으며 이 연속체의 한쪽 끝에 있는 죽음을 향해 서서히 이동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호흡이 그치면 죽음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주인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루 정도 계속 자라기도 한다. 우리의 장기는 점진적으로 쇠약해지지만 그 장기도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모든 기억과 통찰력과 감정과 더불어 서서히 죽어간다.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망자란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주로 보이지 않게 장기 보호시설에 앉아 있는, 기억에서 지워져간 사람들을 뜻한다. (p.144)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위해 최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로 친구들과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아니면 각자의 ‘아드벡 해법’이나 다른 기발한 계획을 내세우며 죽음을 업신여겼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기운을 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이런 집단적 기억 상실은 이제 그만! 우리에게는 21세기를 위한 ‘죽음의 기술’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자. (p.280)
자신만의 괜찮은 죽음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유쾌한 죽음 수업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 이 책은 40년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수많은 죽음을 지켜본 의사의 기록이다. 조용한 죽음, 시끄러운 죽음, 좋은 죽음, 나쁜 죽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리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죽음 안내서. 저자가 그동안 지켜봐 온 여러 죽음에 대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낸 책이다. 돌연사, 치매, 노쇠,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대면하게 되는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질병, 노화, 치매, 자살, 돌연사···.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 수많은 형태의 죽음을 만나온 저자가 전하는 삶 그리고 죽음. 괜찮은 죽음을 말하는 슬프고도 유쾌한 문장들. 과연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란 게 존재할까? 좋은 죽음이란 어떤 걸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이란 게 있을까? 늘 죽음을 생각한다면 이상한 걸까?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질문들. 하지만 막상 저자가 쓴 글을 읽다 보면 그 기세에 눌러 마음이 숙연해진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오늘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우리가 쉬쉬하는 죽음, 그 죽음의 순간들을 두고 저자는 말한다. 금기시되는 죽음에 대한 논의를 정부가, 사회가, 개인이 이제 더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죽음을 많이 말하는 사회가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죽음을 겪으며 그가 배운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진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자주 죽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아이러니하지만, 더 많이 생각할수록 좋은 것이 바로 죽음이다.
현직 의사가 말하는 후회 없이 죽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통의 책에서 다루지 않는 우리가 궁금했던 진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슬픈데 미소가 지어진다. 죽음이란 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구나 싶어서. 솔직히 우리가 아는 죽음처럼 암울하지만은 않아서 좋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기분이랄까. 검은색으로 가득한 장례식장에 알록달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밝은 색을 덧입힌 것만 같다. 수많은 형태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까. 죽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로울까. 나를 위한 죽음, 내가 선택하는 후회 없는 죽음. 한 번쯤 우리가 스스로 곱씹어 봐야 할 문제. 모두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다.